야, 너 몇 살이야? 내가 형이네. 그러니까 까불지 마, 꺼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때, 가장 착잡하달지 꼴 보기 싫은 순간이 이런 순간이다. 아직 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이 벌써부터 ‘나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서열을 나누고 동생이나 다른 아이를 함부로 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사뭇 아쉽다. 축적된 문화라는 건 무서울 정도로 사라지지 않아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서열을 나누고 권력을 휘두르며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무례함을 너무 일찍부터 배운다.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저 ‘서열 문화’는 아이들의 인생에 너무 일찍 스며든다. 얼마 전에는 편의점 앞에서 아이랑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초등학생들의 대화를 들었던 적이 있다. 아이들은 누구 집 평수가 큰지, 어떤 단지가 좋은지,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너무 어릴 때부터 누가 우월하고 열등한지를 눈치채고 나눈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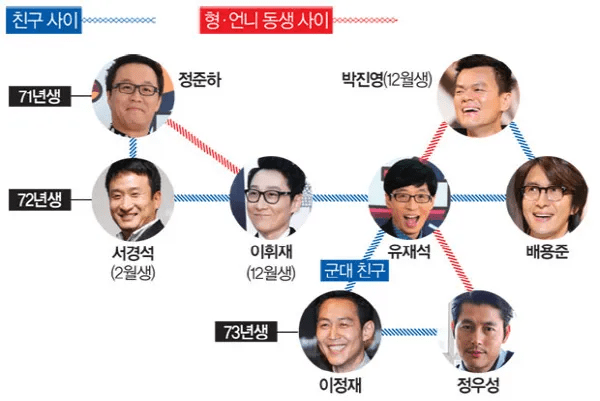

그런데 이런 문화는 결국 다 어른들이 대물림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자동차도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한다고 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내릴 때 타인들의 ‘시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한다. 어떤 차를 타는지는 서열을 의미하고, 특히, 타인들의 시선, 질투나 부러움의 시선을 갈망하는 일과 핵심적으로 이어져 있다. 아마 아이들은 이미 자기 부모가 어떤 차를 타느냐를 가지고 또 서로 서열을 나누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즘에는 어디에 사는지 묻는 것도 일종의 실례라고 한다. 단순히 강북이냐 강남이냐 정도가 아니라, 구에 따라 동에 따라 서열이 아주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서열 확인’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사실, 대학생 때 서울에 와서 처음 살던 때부터 동네 구별도 잘하지 못했던 나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세밀하게 나누어진 서열이 상당히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어느 동네가 서열이 높고 낮은지를 내가 왜 굳이 알아야 하나 싶은 것이다. 루비똥이 더 좋은 것인지 에르메스가 더 좋은 것인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아무튼, 나는 아이에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서열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늦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특히나 네가 형이고 누구는 동생이니, 네 말을 들어야 하고, 네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식의 태도는 정말이지 필사적으로 막고 싶기도 하다. 나이와 관계없이 어울리고, 또 미숙한 누군가가 있다면 다가가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우월한 위치에서 무언가를 휘둘러도 된다는 태도는 정말이지 물려주고 싶은 무언가가 아니다.
모르면 몰라도, 우리 사회의 이 서열 문화는 사회를 안쪽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기생충이나 연가시처럼 작동하고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든다. 타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게 하고,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며, 사회 전반에 서로 간의 신뢰나 이웃이라는 느낌, 공동체 의식도 상당히 갉아먹고 있지 않을까 싶다.
서열을 나누는 병, 이 병은 일종의 우리 사회 불치병이자 난치병이고, 한 사회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원문: 문화평론가 정지우의 페이스북
이 필자의 다른 글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