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려고 시작한 마케팅, 순식간에 천직이 되다
올해로 뷰티 마케팅을 진행한 지 어언 10여 년이 다 돼 간다. 페이스북 1세대로 산다는 건 내게 엄청난 행운이었다. 1,000만 페이지를 키우며 소비자들이 어떤 콘텐츠에 반응하는지, 즉 어떤 콘텐츠가 먹히는지 즉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수의 기업들이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난 콘텐츠를 생산하는 쪽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다. 미국 유학 도중 집이 어려워져 무조건 ‘팔아야만’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물건을 ‘팔기 위한’ 페이스북 콘텐츠 마케팅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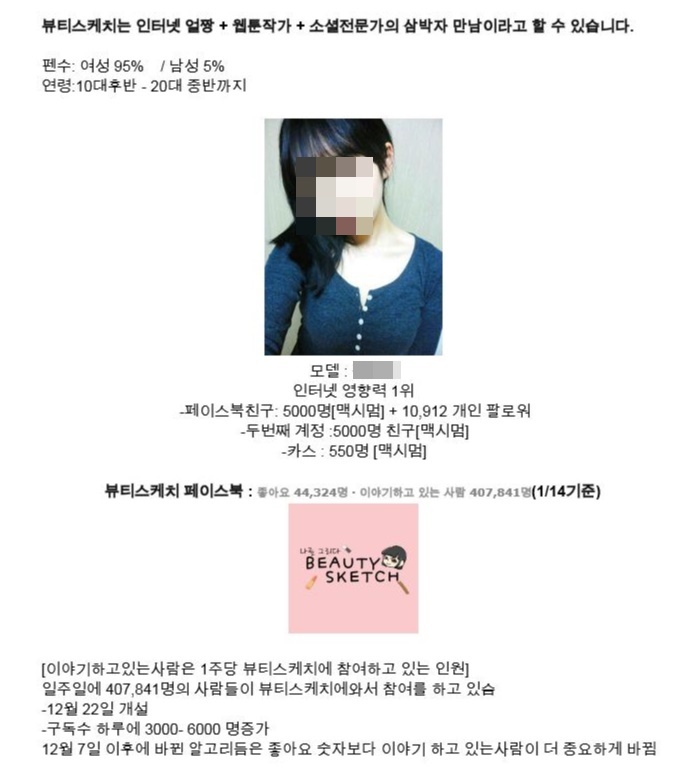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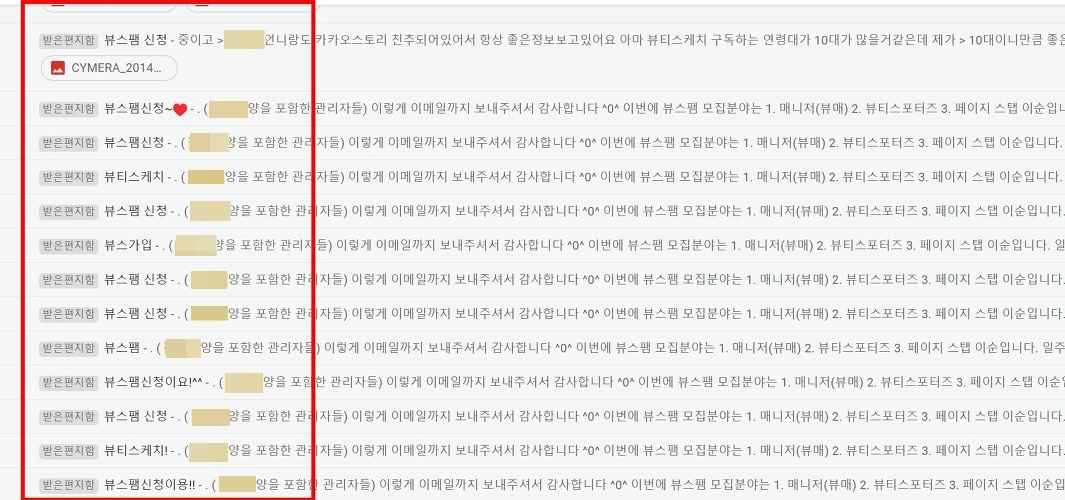
초반에는 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얼짱으로 유명했던 모델을 기용한 후 그 밑에 운영자를 포함해 총 2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았다. 일명 ‘뷰티스케치 팸’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그들이 스스로 재미를 붙여 키울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팬을 조금씩 모아가며 콘텐츠를 올리면 스노우볼 효과를 일으켜 페이지를 키우는 데 가속도가 붙는다.

페이스북 마케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극’이다. 3초 안에 소비자의 반응을 잡아내야 하며, 그 리액션 수치에 맞게 알고리즘이 작동해 게시물의 노출량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좀 더 자극적이고 눈에 띄어야만 했다. 그 단적인 예가 페이스북 마케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Before & After 콘텐츠다. 첫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 제품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최대한 과장했다.
1,000만 페이지가 있으면 다음 날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들 수 있었다. 입소문을 내는 건 결국 10대에서 20대 초반 친구들인데, 그들에게 정확히 타겟팅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었다. 당연히 내가 가진 페이지의 파급력은 어마무시했고, 난 마케팅이 너무 쉽다고 생각했다.
마케팅을 잘하시면 직접 제조해서 브랜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이런 말을 했다. 나도 2014년도에 ‘노우즈시크릿’이라는 제품을 만든 적이 있다. 소위 코를 세워주는 ‘코뽕’ 제품이었고, 국내 시장이 떠들썩해질 정도로 큰 반응을 얻었다. 비투링크 초대로 쥬메이 대한민국 TOP10 브랜드 안에 들어갈 정도였다.


코뽕이 잘 된 후에는 브랜드를 하는 친구와 아이돌 이름을 본따 만든 크림을 만들어 불티나게 팔았다. 눈부시게 하얀 피부를 자랑하는 아이돌이었다. 이름부터가 ‘모 아이돌 크림’이었다.
크림은 문지르면 하얘지는 글루타치온 미백 크림이었기 때문에, 해당 아이돌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마케팅이 아주 잘 먹혔다. 이때도 내가 대표로 있는 뷰스컴퍼니에서 마케팅을 진행했고, 결과는 성공이었다.
‘모 아이돌 크림’ 키워드를 검색하면 네이버 조회량으로 월 20만 건이 넘어갔고, 하루 매출 1억 원이 나오는 기염을 토했다. 게다가 전체 품절로 품귀현상이 일어나 중고나라에서 고가로 거래되기 일쑤였고, 모두가 이 제품을 구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난 신남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게 사업이구나‘하면서 아우디부터 질렀다.
외부, 내부에서 동시에 시작된 붕괴
그러나 단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작 그 아이돌은 이 화이트닝 크림을 쓰지 않는다는 이슈가 나왔고, 이 내용은 대형 여성 커뮤니티에 삽시간에 퍼졌다. 사이트가 마비되고 기업 SNS가 욕으로 도배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실제로도 아이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돌 소속사에서 이름 사용에 대한 경고장이 넘어왔다. 무서웠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동업자 친구와 트러블이 생겼다. 단순히 일에만 집중해 성과를 일궜는데, 알고 보니 수익 분배와 투자 방식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너무도 달랐던 것이다.
당시 엄청난 흑자를 내던 크림 브랜드와 달리, 마케팅을 담당하던 뷰스컴퍼니는 재정적인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뷰스컴퍼니는 나와 친동생이 공동창업자이기에 월, 수요일은 뷰스로 출근하고 화, 목, 금요일은 아이돌 크림으로 출근하던 나였다. 두 집 살림을 하면 이런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이돌 크림 브랜드의 경영권과 재무 권한을 가지고 있던 친구는 지금까지도 통장에 대해 오픈하지 않고 있다. 월 매출 20~30억 원이었던 것으로 예상한다. 뷰스컴퍼니가 없었다면 그런 성과는 불가능했다. 결국, 난 모든 걸 버리고 5천만 원만 받은 채 그 회사를 나오게 됐다. 이마저도 뷰스컴퍼니의 적자를 메우고 나니 마이너스였다.

현재 그 브랜드는 없어진 상태다. 어린 나이에 사업도 시작해봤고, 동업도 했고, 대박을 터뜨려 싸워도 봤다. 과연 브랜드란 무엇일까?
그렇게 잘 되던 아이돌 크림이 망하는 걸 지켜보며 느꼈다. 매출,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브랜드의 로열티고 그 로열티에 따른 재구매다.
그 이후로 난 브랜드를 정의할 때 디자인이나 미적인 요소보다는 재구매율이 어느 정도로 올라오는지를 가지고 브랜드의 성장성을 판단한다. 월 20억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었지만 결국은 재구매가 없었고, 브랜드 로열티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잘 되면 그대로 카피하는 카피캣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이 이 제품인지도 구별 못 한다. 자극적인 마케팅의 한계다.
마케팅 대상으로서 10대의 한계
10대가 반응이 좋고 소문을 쉽게 내줄 수 있다고 10대를 위한 브랜드를 만드는 게 과연 정답일까? 그들은 장단점이 너무도 뚜렷하다.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크지만, 아직 자아가 덜 형성됐기 때문에 자신보다 살짝 높은 연령대의 롤모델을 모방하며 소비를 이어나간다. 그만큼 트렌드가 빠르고 유행에 민감하기에 10대들에게 재구매와 로열티를 요구하는 건 쉽지 않다.
난 20억짜리 사업을 날렸지만 돈 주고도 못 사는 교훈을 얻었다. 브랜드를 키운다는 건 아이를 낳아 성인까지 잘 키워내는 일과 같다. 그렇기에 온전히 외부 마케팅 회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 결국은 부모가 잘 케어해야 한다. 뷰스컴퍼니의 역할은 아이가 더 잘 클 수 있도록 배양분을 공급하고 가이드를 잡아주는 것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함이 생기고 나니 함부로 브랜드를 내거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이 우리 뷰스컴퍼니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의 열쇠를 만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원문: 박진호의 브런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