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구의 채식주의자 선언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 그는 육류는 물론이고, 달걀이나 우유처럼 동물에서 비롯된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엄격한 비건이 된 지 5개월째라고 했다.
어떻게 시작한 거야?
회사에서 회식도 자주 하는데 안 힘들어?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야?
친구에게 질문하는 내 모습은 흡사 채식주의자를 검거하려고 취조하는 형사 꼴이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아차렸다. 그건 육식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자기방어였다.

몇 년 전 나도 채식을 시도한 적이 있다. 『육식의 종말』과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읽고 나서부터였다. 자본주의 소비 풍조로 인해 1950년대보다 고기 섭취량이 두 배 많아지고, 이로 인해 10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매년 공장에서 비윤리적으로 도축되는 것을 알게 된 나는 곧바로 채식을 시작했다.
나도 처음엔 엄격한 비건이었다. 그러다 유제품을 먹는 비건으로 노선을 바꾸고, 그것마저 힘들어 생선을 먹었다. 초기의 열정과 다르게 번번이 채식에 실패한 나는 육식으로 돌아갔다. 그때 나는 ‘완벽한 채식’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비거니즘에는 궁극의 목표가 있고, 이를 완벽하게 수행할수록 도덕적인 사람이란 사고는 나에게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야말로 비거니즘의 가치관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지구는 인간의 것이라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 지구에서 살아가는 존재 간의 위계보다 차이에 집중하는 ‘비(非)위계성’은 동물권의 바탕이다. 그러니 비거니즘에 위계를 두고 도덕에 등급을 매기는 내 채식의 종말은 예정되어 있었다.
내 좁은 시야를 깨닫게 된 건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을 읽은 후부터였다. 그는 완벽한 ‘비건’ 몇 명이 존재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이 좀 더 ‘비건적’으로 살아가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비건은 명사가 아닌 형용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을 ‘주말 채식주의자’라고 소개하는 그래험 힐의 TED 영상을 본 적도 있다. 그는 주중에는 채식을 하지만 주말에는 고기를 섭취한다고 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가 ‘진정한 비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보다는 확실히 나았다. 주중 채식만으로 고기 섭취의 70%나 줄이는 데 성공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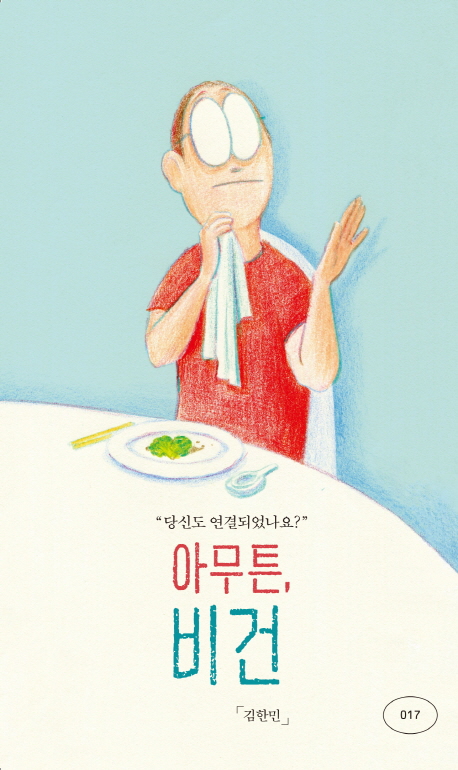
세상의 모든 문제도 비슷하지 않을까. 세상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세계의 불의와 고통에 우리는 얼마간의 책임이 있다. 완벽한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보단, 페미니즘적 사고로 살아가는 것. 한 명의 그레타 툰베리가 존재하는 것보단, 다수의 사람이 ‘툰베리적’으로 환경문제에 동참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적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시도하고, 그 ‘하나’를 ‘둘, 셋’으로 늘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이 세상도 어설픈 사람들의 사소한 시도로 조금씩 확장된 결과일지 모른다.
그래서 나도 다시 채식을 시작했다. 적어도 삼시 세끼 중 한 끼만이라도 채식을 하기로 한 것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내 비거니즘은 이미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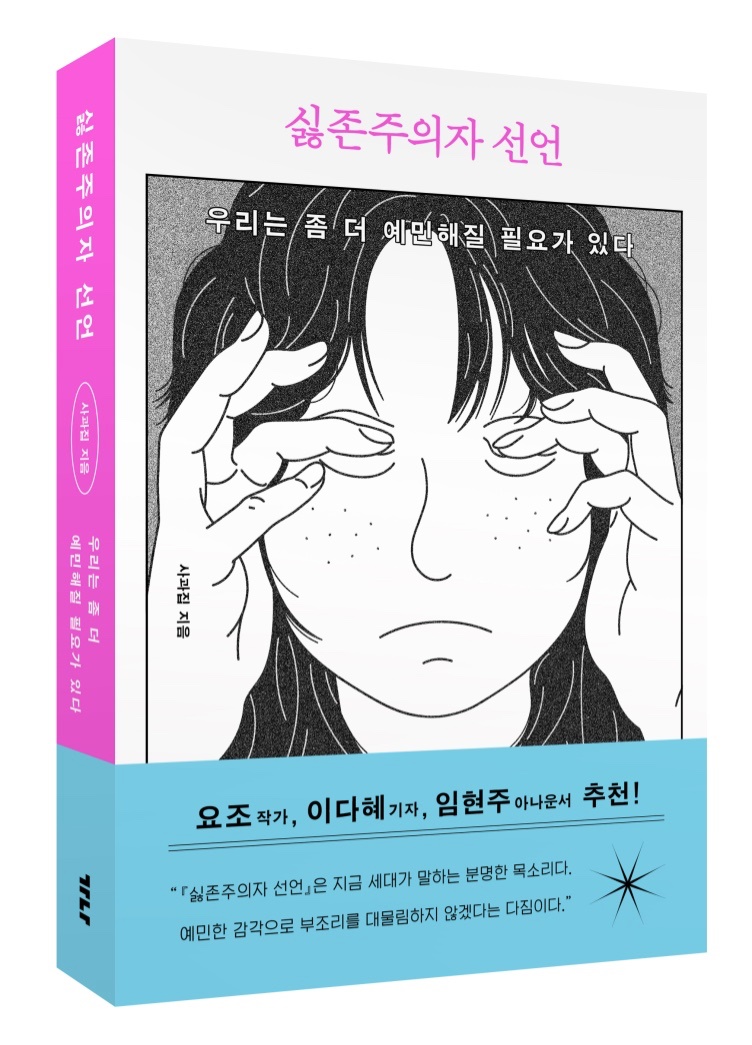
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