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날생선. 운동. 찜통더위. 놀이기구. 사진 찍히기. 초콜릿 맛 음료. 교통체증.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인공 과일 향 나는 모든 것. 옷 입은 채 물에 들어가기. 높은 곳에 올라가기. 갑작스러운 큰소리.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 싸움. 악플. 무례한 사람 등등.
싫어하는 걸 쓰자면 2박 3일도 모자란 사람.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많았던 사람. 그게 바로 나다. 사회인이 된 후 극복한 척 종종 두터운 가면을 써보기도 했지만, 금세 들키고 만다.
백설기에 박힌 검은콩처럼 툭툭 내 삶에 박혀 있는 ‘싫은 것들’을 피하느라 몸도 마음도 잔뜩 웅크리고 살았다. 고슴도치처럼 바짝 가시를 세우고 다가오지 말라고 경계했다. 싫어하는 그것들이 내 살갗에, 내 마음에 닿을까 봐. 그래서 내가 가진 한 줌의 에너지마저 빼앗길까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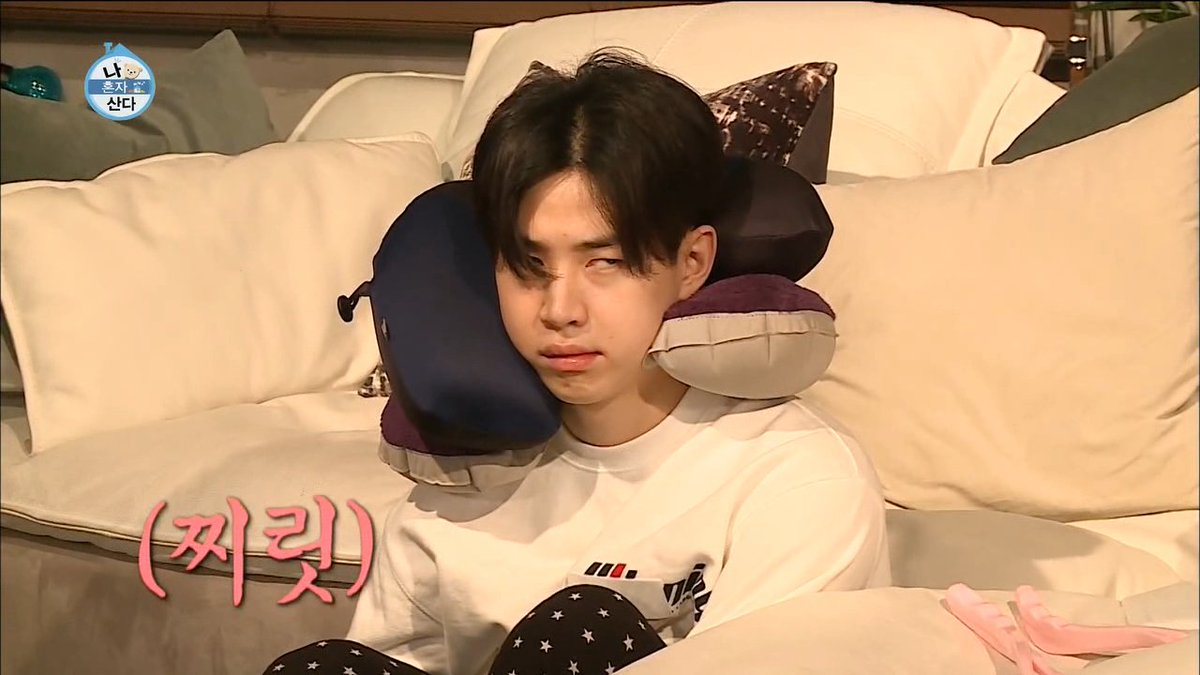
마음의 저울이 호(好) 보다 불호(不好) 쪽으로 기울어지면 칼같이 잘라냈다. 내 취향이 아니면 밀어내기 바빴다. 그러고 나니 내게 남은 게 없었다. 나라는 사람의 세계가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졌다.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은 예민하다고, 까칠하다고 했다.
그렇다. 나는 예민하고, 까칠하다. 자극에 민감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일에 서툴다. 그게 난 편했지만 동시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편협하고 폐쇄적인 인간이 될수록 여기저기 벽에 부딪혔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예쁜 구석을 찾아보기로 했다. 밥에 들어간 콩은 그 설컹한 느낌이 싫지만 콩국수나 콩비지, 두부 같은 콩 가공식품은 먹을 수 있다. 날생선은 못 먹지만 꾸덕꾸덕하게 말려 굽거나 조린 생선 요리는 입에 맞는다. 찜통더위에 맥을 못 추지만, 습기와 더위에 찌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선풍기로 머릴 때만의 희열이 있다. 놀이기구 타는 건 별로지만 놀이기구를 타서 괴성을 지르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건 재미있다. 교통체증은 싫어하지만, 멈춘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상상하는 건 즐겁다.
어떤 대상을 싫어하는 데에도 분명 에너지가 쓰인다. 아득바득 싫어하느라 썼던 에너지를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데 썼다. 싫어하는 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 없다. 그래도 꾸준히 보다 보면 나름 예쁜 구석, 나랑 맞는 취향이 닿는 부분을 찾게 된다. 버릇처럼 내뱉던 ‘싫어’를 지우니 어두컴컴했던 일상에 탁하고 환한 조명이 켜졌다.

‘긍정의 마법’ 같은 자기 계발서에나 나올 단어까지 소환할 필요도 없다. 좋아하는 게 생기면 삶의 밀도가 생긴다. 그전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 문이 서서히 열린다. 싫음이 흐릿해지면 그 자리에 희미한 기쁨이 자라난다. 관심이란 물을 꾸준히 주니 팍팍하게 메말랐던 일상에 선명한 즐거움이 피어난다.
내 안의 사소한 변화를 깨닫는 순간, 드디어 불안의 마침표가 찍힌다. 남들은 쾌속 질주하는데, 나만 전진은커녕 후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답답했던 날들의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간다.
싫어하는데 쓰는 에너지를 아껴 나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데 썼다. 까칠한 고슴도치 시절이나 지금이나 겉으로 보기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하지만 이만하면 괜찮은 날들이 시작됐다. 내 인생의 기본값인 줄 알았던 ‘예민’을 털어내고 나니 제법 나쁘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원문: 호사의 브런치
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