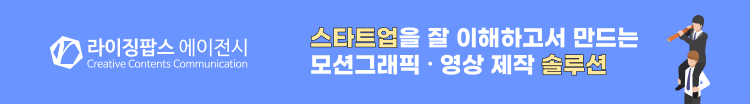솔직히 새벽 7시부터 누가 스타벅스에 갈까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가 내가 됐다.
몇 해 전, 나는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던 사람이었다. 출근 전에 글을 써보겠다고 새벽 6시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 강남 언저리 스타벅스 문을 첫 손님처럼 열곤 했다. 작고 귀여운 내 체력은 퇴근하고 나면 탈탈 털려, 손 하나 까딱 못 하고 침대에 쓰러지는 게 일상이었다. 글은커녕 겉옷도 못 벗은 채 눈을 감았고, 자정 무렵 찜찜함에 간신히 일어나 씻고 다시 잠드는 날이 반복됐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새벽 7시, 스타벅스로 향했다.
온전한 정신으로 글을 쓰려면 새벽밖에 없었다. 출근 전, 나를 위한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냈다. 대한민국에서 새벽 7시부터 노트북을 펼치고 글을 쓸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커피믹스와 현미녹차가 무제한인 사무실도 있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하루를 회사에서 보내고 싶진 않았다. 덕분에 매일 사이렌 오더 1, 2등을 다투며 스타벅스에 별 도장을 찍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매일 마주하는 풍경에도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늘 그 시간에 있던 사람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침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보였다.
경제신문을 읽으며 토론하듯 대화하는 사업가들, 노트북을 열고 논문을 쓰는 만학도,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한 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땀을 식히는 러너, 고객과 상담하는 보험 설계사, 외국어 공부에 몰입한 직장인, 아이와 함께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부모님. 출근 전 구석 자리에서 애틋하게 눈을 맞추던 중년의 커플, 커피를 홀짝이며 게임 방송을 보며 졸음을 털어내던 청년, 지구 반대편과 화상 면접 중인 이직 준비자, 스타벅스 굿즈를 사기 위해 일찍부터 줄 선 덕후들, 다이어리에 하루를 정리하는 메모광, 화장을 마무리하는 ‘퀵 메이크업’ 고수. 그리고 전날 과음의 흔적을 커피로 씻어내는 파티피플, 오늘 출발할 여행 계획을 점검하던 여행자까지. 그 시간, 그 공간은 조용한 활기로 가득했다.

출근과 퇴근, 두 단어만으로 채워진 날들이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전철을 타고 나와 같은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며 같은 일을 반복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이 그렇다지만, 나는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리듬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만원 지하철 안의 내가 깡통 안의 스팸이 된 것처럼 숨이 막혔고, 답답했다.
그래서 러시아워에 비해 비교적 한적한 지하철을 타고 나와 여유롭게 새벽 7시, 스타벅스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글을 쓰다가 중간중간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 덕분에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그들을 글감 삼아 글을 쓰기도 했고, 나태해진 나를 다시 조이기도 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나는 조금씩 나를 단련하고 있었다.
활동 시간이 달라지면 마주치는 풍경도, 사람도 달라진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졌을 때 활동 시간대를 바꾸는 게 효과적이었다. 매일 제자리만 맴돌면서 로또 당첨처럼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하길 바라는 건 꽤 염치없는 짓이었다. 닮고 싶은 삶이 있다면,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닮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이 머무는 시간과 공간을 먼저 따라가 본다. 신기하게도, 내가 조금만 반응하고 움직이면 세상도 SNS의 알고리즘처럼 반응한다. 연결되고, 보여지고, 닿는다.
그 시절, 새벽 7시의 스타벅스는 내게 작은 도피처이자 훈련장이었다. 세상이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전, 나를 먼저 깨우던 시간. 누군가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 다채로운 풍경 속에서 나는 ‘나답게 사는 법’을 조금씩 익혀갔다.
지금도 가끔 막막할 때면 떠오른다. 그 새벽, 그 공간,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대체로 고요했지만, 그 시간 속 우리는 분명히 각자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원문: 호사의 브런치
이 필자의 다른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