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까지 평생 한 가지 직업으로만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전 세대는 대다수가 가능했을지 모를 그 ‘흔한 일’이 지금 세대에게는 축복에 가까운 어려운 일이 됐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자의든 타의든 지키고 있던 자리를 내줘야 하는 순간이 온다. 특히 ‘멀티‘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제2, 제3의 직업을 가지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사람들을 만날 때면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꿈을 묻는 게 내 요즘 최대의 관심사다. 흙탕물 속에서 헤매는 작은 피라미 같은 상태인 내가 뿌연 시야를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지인의 지인이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다. 일상의 무료함을 타파할 취미이기도 했고, 때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발판이기도 했다. 개인 계정으로 시작해 알고리즘신의 간택으로 조회수가 떡상하고 구독자가 급증하며 대박이 났다는 소식이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실체를 본 적 없고 소문만 무성한 도시 전설처럼 느껴졌다. 남들과 나는 다를 거라는 기대에 차 시작하지만, 대부분 미약한 반응에 지쳐 중도 하차하거나 본업으로 돌아갔다. 꾸준히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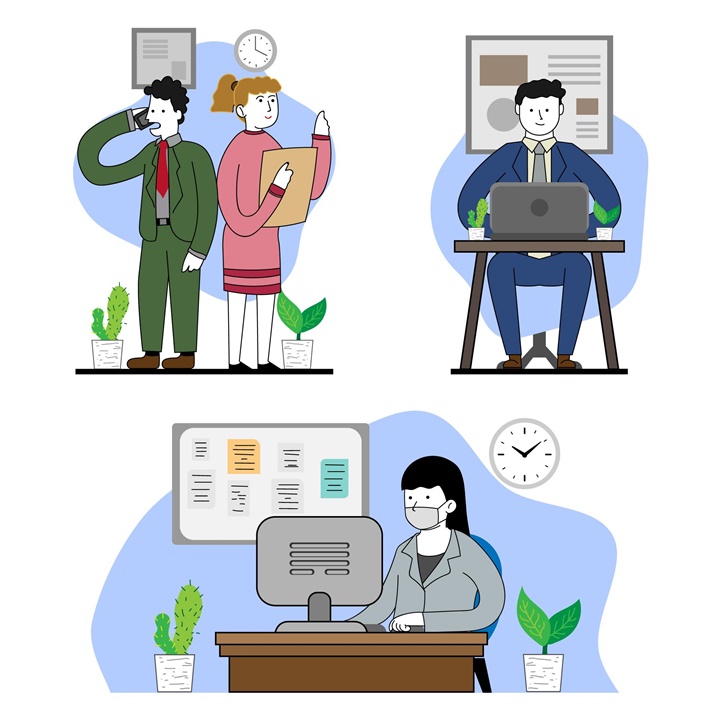
얼마 전, 로또 같은 대박을 노리며 또 한 명의 어린양이 이 세계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너 건너 지인인 A의 꿈은 ‘공구하는 사람 되기’라고 했다. A의 목표는 차은우 이목구비보다 또렷했다. 공. 구. 하. 는. 사. 람. 이라니. 처음 이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인중에 딱밤을 맞은 듯 머리 전체가 띵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셀럽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고, 구독자 몇백만의 인플루언서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다. 간결하고 현실적이게 ‘꿈은 공구하는 사람’이라는 게 놀라웠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없는 시간을 쪼개 직접 출연한 영상을 편집하고 자막을 달아 올렸다.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꿈인 ‘공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중이었다.
그전까지 나는 어느 정도의 구독자 즉 팬덤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공구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봐왔던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만화 캐릭터처럼 표정이 많은 고양이 영상을 올리던 계정주는 언제부턴가 고양이가 잘 먹던 북어 트릿과 고양이의 혼을 쏙 빼놓던 최신 장난감 공구를 시작했다. 야무진 살림 솜씨를 뽐내던 라이프 분야 인플루언서는 수저 불림 통의 편리함을 찬양하는 피드를 몇 번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의 DM이 쏟아져 담당자를 귀찮게 한 끝에 여러분을 위해 어렵게 얻은 기회라며 공구 링크를 내 걸었다.
(하루에 한 번 설거지를 하는 내 눈에는 수저 불림통이 없어도 텀블러나 머그 컵에 담가도 충분히 수저를 불릴 수 있을 거 같았다. 하지만 하루에 3번 이상 설거지하는 프로 살림꾼들 눈에는 수저 불림 통의 가치와 효용이 더 와닿았던 걸까? 어디서 이런 꿀템을 찾았냐며 칭찬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공구하는 ‘팔이 피플’의 세계는 달라도 확실히 달랐다.)
결론적으로 공구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최종 결괏값은 같다. 하지만 실존하는지 의심스러운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가진 유명인이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그저 ‘공구하는 사람’이라는 선명한 목표를 잡은 A의 선택은 눈앞이 캄캄해 방황하는 피라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내 머릿속 ‘꿈’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물으면 과학자, 경찰, 선생님이라고 장래 희망을 답하는 초등학교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 꿈은 크고 거창해야 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희망 직업과 의미를 혼동하고 있었다.

꿈 없이 살았던 내가 딱 두 번 꿈을 품은 적이 있다. 방송을 만들고 싶어서 방송계 언저리를 기웃거리며 일했고, 마흔 전에 내 이름 박힌 책 한 권 갖고 싶어서 호사라는 부캐로 글을 썼다. 미련스러운 시간과 운이 더해지니 어느새 두 가지 꿈을 이뤘다. 그러고 나니 다음은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기다렸다는 듯 원 직업의 유효 기한은 끝이 보였다. 좋아하는 걸 하면 돈이 절로 굴러들어 오는 상위 0.01%에게만 허락된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에 떨며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꿈은 공구하는 사람’이라는 A의 도전은 ‘불혹의 방황러’의 뺨을 단호하게 내리쳤다. 지금 그럴싸한 꿈을 찾느라 헤매고 있을 때가 아니니 정신 차리라고, 일단 뭐라도 하라는 불호령처럼 느껴졌다.
“꿈은 명사가 아닌 동사”라는 닳고 닳은 말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직 선명한 꿈을 찾진 못했지만 ‘키즈 모델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밑바닥에 깔았다. 나를 향해 열린 가능성에 기대 이것저것 시도 중이다. 일단 시작했다면 실패하더라도 경험은 남으니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대책 없는 긍정력으로 겹겹이 쌓인 불안을 지우며 한 발, 한 발 나가는 중이다. 이 걸음의 도착점이 어딜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그저 목적지에 도착해 발걸음이 멈췄을 때, 머무르지 않고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간 오늘의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원문: 호사의 브런치
이 필자의 다른 글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