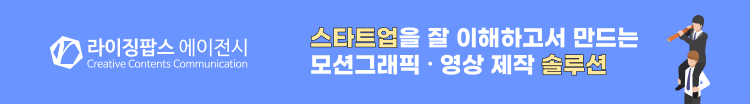60대 후반 A씨는 10년 전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그 돈으로 남녘 해안가에 펜션을 샀다. 아내는 아파트를 팔지 말고 가진 돈에 대출을 내서 만들자고 했지만 A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어차피 세종시를 떠날 것이라면 살지 않는 아파트는 파는 게 좋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사이 세종시 아파트 값은 곱절 올랐다. 펜션 땅 가격도 올랐지만, 세종시 아파트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다. A씨는 그때 아내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던 게 후회된다. 그런 의사결정을 한 자신이 미울 때도 적지 않다. 매스컴의 아파트 뉴스는 그에게 ‘스트레스 유발자’다. 그래서 TV에서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A씨처럼 집을 팔았다가 가격이 크게 오르면 겪게 되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간다. 따지고 보면 팔 때 당시 가격은 제값이지만, 이후 급등하게 되면 헐값이라는 편향을 갖는다.
물론 자신이 판 가격보다 떨어지면 자신의 탁월한 판단력에 쾌재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예측이 어긋나 집값이 급등하면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흔히 말하는 ‘멘탈 붕괴’다. 주변에서는 판 집 근처에도 가지 말고 시세도 보지 말라고 하지만, 인간이 이상 쉽지 않다.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내가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을까?
오른 아파트 시세를 볼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고 괴롭힌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정신적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다. 서울 용산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 손님에 대해 “15년 전 집을 성급하게 팔았다면서 지금도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파는 일에는 큰돈이 오간다. 가격이 급등락하면 누군가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긴다. 아무래도 집값 급락기에는 산 사람이, 급등기에는 판 사람이 고통을 겪을 것이다. 심지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수많은 고객을 접해 본 필자의 경험상, 집 매매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산 사람보다 판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집을 판 사람이 가격 급변동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얘기다. 아마도 집을 팔았기 때문에 반전의 기회조차도 사라져서 그런가 보다.

집을 꼭지에서 비싸게 산 사람도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집값은 장기적으로 라면값처럼 우상향하기 마련이니, 기다리면 해결된다. 어찌 보면 세월이 해결사인 것이다. 적어도 인플레이션 헷지 효과가 큰 대도시 아파트는 그렇다.
10년 전 베이비붐 세대가 앓았던 ‘하우스푸어’ 문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다. 그 사이 우여곡절과 고통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매듭지어졌다. 아파트값이 그사이 많이 오른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지금 MZ세대가 겪고 있는 ‘영끌 푸어’ 문제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대출 이자로 허덕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이니 거주 가치를 고려하면 그나마 견딜 만하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싸게 판 사람보다는 덜 괴롭다.
그러하니 집을 고점에서 비싸게 샀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굳이 지난 일을 곱씹어가며 자신을 과거의 굴레에 가둘 필요가 없다.
다만 교훈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열광할 때 냉정하게 사고하고 오버슈팅(overshooting, 과매수)이 있으면 반드시 언더슈팅(undershooting, 과매도)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른바 반성적 사유를 하는 것이다.
원문: 집과 삶
이 필자의 다른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