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같은 대학원생이라고 해도 이공계와 인문계의 삶은 크게 다르다. 당장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인문계에는 LAB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말만 해도 마치 코페르니쿠스 앞에서 그래도 지구는 돌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와 비슷한 표정을 접하게 된다. LAB의 존재가 열역학법칙과도 같은 이공계 관점에서는 이런 패턴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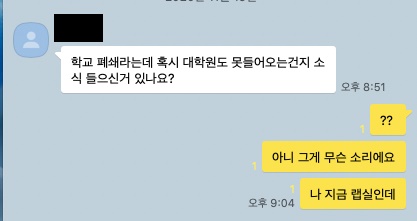
인문계 대학원은 철저하게 솔플이다. 물론 지도학생 개념이 있고, 대학원생끼리의 세미나도 존재하며, 학위논문 역시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작성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작업으로 수렴된다. 팀별 세미나나 지도학생 모임과 같은 건 각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탐색하면서 혹시 내 작업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 ‘곁눈질’하는 자리이기는 해도, 그 자체로 내 논문거리를 만들어주거나 밥벌이의 수단을 마련해주지는 않는다. 그건 정말 각자 알아서 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인문계 대학원에는 노동이라는 개념이 없다. 아, 오해하지 말자. 노동이 없다는 거지 노역은 존재한다. 지도교수의 심부름에서부터 행사 동원에 이르기까지 노역은 어디에나 있고 노동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대학원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들이 불거진 이후로는 이 노역도 차츰 사라져가는 추세이기는 하다. 그리고 이 줄어든 노역의 자리는 보통 대학원생의 ‘다음’ 단계, 즉 각 대학이나 연구소의 비전임 교원들이 떠맡는 경우가 많다. (먼산)
2.
노동의 개념이 없으므로 학비는 각자 벌어야 한다. 예전에는 조교 등을 통해서 학내에서 노동을 해결하는 일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적잖은 학교들이 학사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이 분야를 계약직 교원으로 다수 대체하면서 이 문도 상당 부분 좁아졌다.
몇 안 되는 외부 장학금으로 펀딩을 받는 방법도 있다. 과거에는 박사 수료만 해도 강의가 가능했으므로 candidate 과정에서는 강의로 돈을 벌기도 했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대부분의 시간강사 자리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상향되는 바람에 이조차도 불가능해졌다. 지금은 강사법의 덕으로 인해 박사학위 소지자도 강의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시대다. 어찌 되었든 보장된(?) 노동이 없으므로 보장된 수입도 없고, 보장된 수입이 없으므로 보장된 졸업도 없다. 그리고 보장된 졸업이 없는 만큼 보장된 취직자리도 없다.
웃기는 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생’ 과정에서 겪는 이런저런 노동의 고충을 인문계 대학원생들은 졸업 후에 겪는다는 점이다. 인문계 박사의 진로란 결국 각급 대학 아니면 대학부설연구소 등이 고작인데, 이런 곳에 들어가서 겪는 일들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태껏 해오던 연구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들이 대다수다. 행사용 포스터 제작에서부터 현장답사 안내요원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 및 연구소에서 비전임 교원들이 담당하는 노동은 다양하다. 그리고 저렴하다.
3.
굳이 비교하자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플렌테이션 농장에 내던져진 흑인 노예라고 하면 인문계 대학원생들은 호주 개척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덩그러니 내던져진 사람들이라고 해야 하나. 주인한테 채찍 맞을 일은 없지만 대신 아보리진에게 돌도끼 맞거나 이름 모를 야생동믈에게 받힐 확률은 높다. 뭘 심어도 도무지 싹이 틀 것 같지 않은 광막한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원문: 박성호의 페이스북
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