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에 탈 수 없을 만큼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이와 같은 사건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비만 인구가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항공사들의 비만인 차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항공사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는 단순하다. “비만인은 한 좌석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더 높은 요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 이것은 언뜻 들으면 일단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바꿔서 생각해보면 더 적은 자리를 차지하는 아이나 체구가 작은 사람에게 딱히 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의 부피당, 무게당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 아닌 1인당 항공료를 책정해 놓았다면 비만인에게 더 높은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 아닐까? (무게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수화물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다.)
항공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논리는 이것이다. “뚱뚱한 사람들이 한 좌석만 예매해서 비행기를 타면 옆좌석을 침범해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 이들은 마땅히 두 좌석을 예매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행기에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은 사실 아주 다양하다. 개인위생 문제로 냄새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특정 장애가 있거나 어린아이여서 소음 피해를 주게 될 수도 있다(물론 그냥 시끄러운 사람들도 있다).
항공사들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비만인들에게 하듯이 당당하게 “당신은 옆좌석에 피해를 주니 요금을 더 내시오”라고 요구하냐면 그렇지는 않다. 특히나 그것이 장애가 있어서라거나 영유아여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렇다. 그것은 인도적으로 옳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공사들이 어떻게 유독 비만인들에게는 이렇게 당당하고 가혹하게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걸까? 그것은 비만인을 차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때문이다.
비만은 많은 문화권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진다. 사람들이 비만을 ‘자기 관리를 못 하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얻게 되는 비정상적인 체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쉽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항공사들도 비만인을 향한 차별을 주장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에게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덕적으로 크게 지탄받고 회사의 이미지가 망가져 큰 손실을 입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항공사들은 비만인을 차별하는 이런 규정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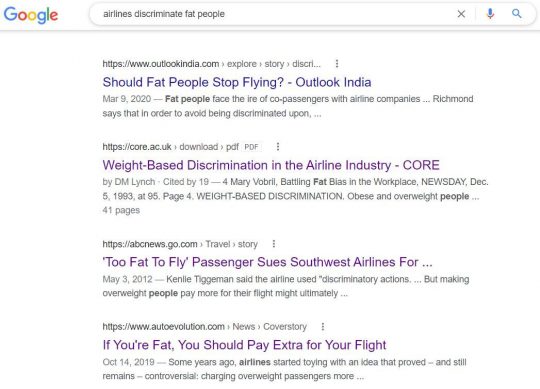
‘정상체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체형은 사람마다 다르게 타고나고 또 사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왜 정상체형과 비정상 체형을 나누는 것일까? 사람들이 비만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비만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비만인들은 노력의 부재로 ‘정상’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는 다양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체중과 BMI가 각자의 건강 상태와 비례하냐면 또 그렇지는 않다. 우리 큰오빠는 늘 100kg 전후의 몸무게를 가졌지만, 막상 체성분 검사를 하면 근육량이 높은 편이라 심각한 비만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나는 대다수가 보기에 마른 체형에 50kg 전후의 몸무게를 유지하지만 근육 부족형 체형으로 조금만 관리에 소홀하면 종종 체성분 검사에서 ‘경도비만’과 ‘복부비만’이라는 결과를 받는다. 보기에는 뚱뚱해 보여도 근육이 많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보기에 마른 체형이더라도 체지방률이 30%를 넘는 마른 비만인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직전의 문단에서 ‘관리에 소홀하면’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체중과 체형이 마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상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노력을 해서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해서 지방을 줄이고 보기에 좋고 건강에도 좋은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몸을 가지기 위해 모두에게 같은 양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20대의 나는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생활패턴도 엉망이었고, 술도 많이 마신 데다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40kg 초반의 몸무게를 유지했다. 어떤 노력도 없이 나는 남들이 ‘말랐다’ ‘예쁘다’라고 하는 몸을 가졌다. 그저 타고난 체질이었고 당시에 젊은 내 몸이 대사량이 높았을 뿐 딱히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30대 중반이 되고 나서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나이를 먹으면서 대사량이 떨어지며 흔히 말하는 ‘나잇살’이 붙어가는 것도 있고, 20대처럼 먹고 마시고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체지방률이 ‘비만’ 수준으로 올라간다.
또 하나의 요인은 나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나는 3년째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이를 보충해주는 약을 매일 복용 중이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주요 증상 중 몇 가지를 나열해보자면 우울감과 피로감, 그리고 체중 증가이다. 많이 먹지 않아도 살이 잘 붙는 사람이 되는 병이고, 살을 빼려고 해도 당장 몸이 아주 무겁고 피로하게 느껴지니 어지간한 의지로는 운동도 어렵다. 실제로 많이 먹지 않았음에도 처음 발병했을 때(진단 전)의 나의 체중은 몇 주 만에 6kg이 늘어나 있었다. 여기서 내가 병원을 빨리 찾아가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도 체중은 계속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내 예시를 들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체중과 체형은 반드시 그 사람의 ‘자기 관리 능력’이나 ‘노력’ 여하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타고난 체형이 몸집이 큰 사람일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도 비만 유전자를 타고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쉽게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나처럼 병으로 살이 더 찔 수도 있고, 그냥 젊고 운이 좋아서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항공사의 비만인 차별은 그저 사회에 팽배한 외모지상주의나 능력 중심주의를 보여주는 지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차별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가치관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항공사에서 유독 비만인에게만 가혹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비만은 개인의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일 것이다. 항공사에서는 승객 중 비만인이나 어린이의 비율을 계산해 여러 사이즈의 좌석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러기보다는 비만인들을 태우지 않거나 그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비만은 비난받아야 할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누구도 신체적 특징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원문: Pang Lee의 브런치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