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영웅전설』은 구리다. 그러나 『은하영웅전설』은 그레이트했다. 『베르사유의 장미』 스타일의 장발 꽃미남은 특히 구렸다. (만화만 그런 게 아니다. 소설에도 묘사가 그런 식이잖아.) 얀 웬리라는 주인공 이름도 구렸다. 설정 중 유일하게 맘에 들었던 건 탄소 크리스탈 토마호크로 무장한 척탄병이었다. 흠흠.
그런데 뭐가 그레이트했다는 건가. 아래 첨부한 이미지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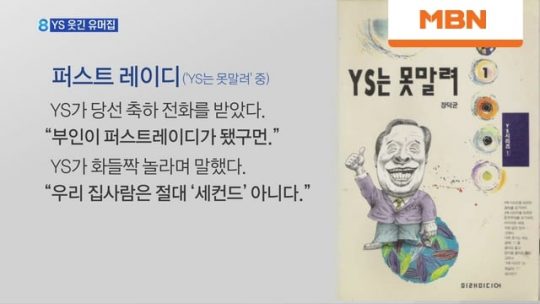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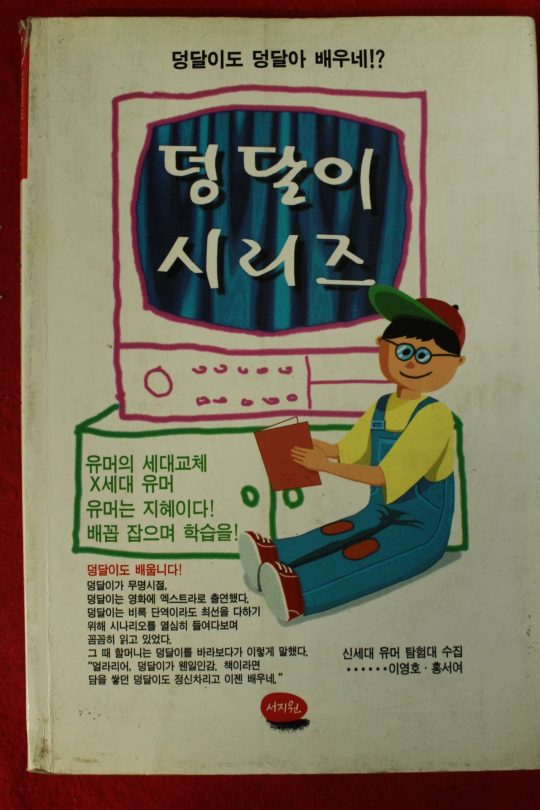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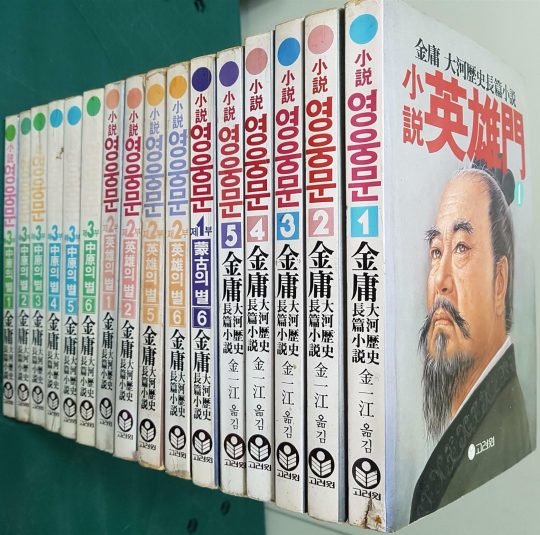

이게 1990년대 초반에 향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중문화였다. 어렵고 낯선 영어가 아닌 소년-청년 콘텐츠는 삼국지 아니면 무협지 또는 일본식 판타지뿐이었던 세상이었다. 최불암-덩달이-YS시리즈가 무려 책으로 출판되어 나오던 시절.
『은하영웅전설』의 일본식 준-유럽어 이름으로 된 우주 서사는 스타워즈 같은 최첨단 SF 느낌도 주면서, 당시 독자들에게 친숙했던 일본문화 콘텐츠인 거함거포주의나 비장한 전쟁 서사, 남자의 로망 등을 적절히 갈아 넣은 신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였다.
백미는 그 안에 녹아있는 정치와 체제에 대한 주인공의 고민인데, 볼 게 없어서 이문열 삼국지 5회독 10회독 하다가 초한지나 볼까 하던 독자들에게는 바로 그런 중2병 콘텐츠가 필요했던 거였다. 제국군 깨부수는 동맹군 자유주의자라니! 겁나 멋있어!
뭔가 나사 하나 빠져 있고 뭔가 시니컬하며 뭔가 의욕 없는 천재 함장, 당시엔 그런 주인공이 없었다. 국가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열정열정열정! 하며 불타오르는 삼국지 장수들이나 인생에 복수밖에 없는 무협지 주인공만 읽을 수 있던 소년들에겐 꽤나 새로운 주인공이었다. 가난에 죽네 병드네 힘드네 괴롭네 하던 해방문학은 뭐 말도 못 하고.
그 시대 그 독자들에게 『은하영웅전설』에 대항할만한 유일한 호적수는 『퇴마록』이었다고 본다. 심령이라는 장르의 특수성으로 인해 호불호가 일찌감치 갈렸지만, 인터넷 없고 PC통신이 일부 계층(!)만 향유하던 첨단기술이었던 시절, 학교 친구에게 ‘너 □□□ 알아?’라고 물었을 때 바로 대화가 시작될만한 “공통의 콘텐츠”는 『삼국지』와 『영웅문』 이후로는 『은하영웅전설』과 『퇴마록』이 거의 유일했다고 본다. (아, 물론, 드래곤볼 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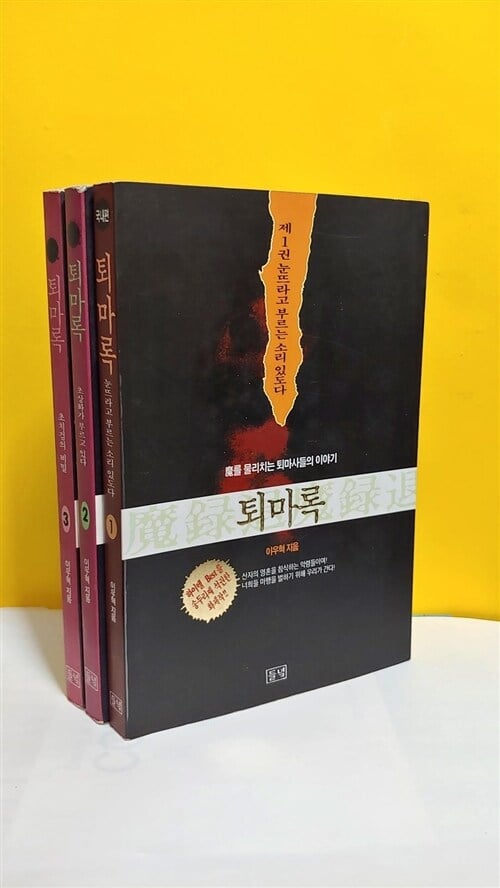

지금 『은하영웅전설』을 보면, 음, 참 구리다. “그 화려한 황금색 머리카락 밑에는 최근 5세기를 통틀어 최고의 군사적 두뇌가 담겨 있단다. 100년 늦게 태어나 그의 전기를 중립의 처지에서 썼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 따위의 대사에 코웃음도 안 나는 2021년이다.
그런데, 당시는 김건모가 신인가수로 신승훈의 아성을 위협할 때고, 서태지가 막 데뷔해서 정신없고 가사 안 들린다고 혹평을 받던 시기이며, 오렌지족들이 카페에서 체리에이드 가루 물에 탄 거 빨면서 테이블에 놓인 유선 전화기로 삐삐 음성 사서함에 녹음하던 시절이다.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는 우산 꽂힌 파르페를 주문했겠지.
『은하영웅전설』은 그래서 그렇게 그레이트 했다. 당시엔 그거만 한 게 없었다.
원문: 김어용의 페이스북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