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여행을 하던 무렵, 나는 외모 강박에 관한 책을 읽고, 몸의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사회적 억압에 대해 공부하며, 탈코르셋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식욕억제제를 먹기도 했다.
나는 외모 강박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나의 다이어트 욕구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퇴사 버킷리스트에 ‘세속적 아름다움을 떠나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자’는 다짐을 적고 한국 밖으로 긴 여행을 떠나왔으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다.
청년 실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선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나의 몸에 대한 성찰도 이런 식으로 미루게 된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우선 제가 마른 후에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꾸미지 않아도 괜찮은 ‘마른’ 상태에서 탈코르셋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식욕억제제를 먹은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대학생 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엄마가 먹던 식욕억제제를 빌려 먹은 적이 있었다. 중년의 외모 강박은 젊은 세대 못지않다. 중년 여성들이 얼마나 미용 관리 샵을 자주 가는지! 눈썹 문신, 속눈썹, 보톡스 등 여성의 외모 강박은 모든 세대를 아우른다. 어쨌든 그때 엄마의 약을 먹었을 땐 살이 잘도 빠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 손을 대지 않았었다. 약의 부작용이 꽤나 심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식욕억제제를 먹으면 하루 종일 우울했다. 커피를 10리터 정도 마신 듯이 가슴이 뛰고, 목이 마르고, 하루 종일 쫓기는 기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부작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 기분을 잊고 있다가 오랜만에 먹었더니 부작용이 더 심하게 느껴졌다. 잠을 자고 싶은데 잠에 들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른 것을 할 집중력은 없어서 유튜브나 트위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었다. 기분이 바닥 끝까지 치달았다. 이를테면 누가 아재 개그를 치면 예의상이라도 웃어줄 기력마저 없어지는 기분이다. 이렇게 약은 내 페르소나와 내면을 모두 망가트려 버린다.

당시 나는 이 약이 나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먹었다. 부작용을 알면서도 왜 먹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칠간 미친 듯이 음식을 먹고 살이 찐 나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낀 데다, 나의 외모 평가를 들었던 것이 원인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건 보통 아주 가까운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다. 나의 경우는 엄마다. 엄마는 내게 전화로 말했다.
넌 여행 가면 살 뺄 거라더니 사진 보니까 여전하더라. 아니 더 찐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외모 평가는 매우 흔하다. 안부 인사로 “너 얼굴 좋아졌다?”, “살 좀 쪘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기도 한다. 가볍게 던진 이런 외모 평가는 조금씩 쌓여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대상화하게 만든다. 결국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게 된다.
엄마야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겠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전 사진과 그 당시의 모습을 비교하며 내 몸이 어떤지, 살이 더 찌진 않았는지 강박적으로 체크하기 시작했다.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며 살을 빼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꽤 많다. 하지만 심리학과 교수인 러네이 엥겔른에 따르면, 실제로 비만을 주제로 이루어진 모든 연구에서 뚱뚱함에 대한 수치심이 다이어트를 돕는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다. 수치심은 오히려 신체 혐오만을 부추긴다.
수치심을 느끼고 우울해질 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먹지는 않아요.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던킨 도넛 가게로 향하죠. 수치심은 희망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녀는 설명했다.
- 러네이 엥겔른,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웅진지식하우스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서 살을 빼고 싶은 마음, 이상적인 타인의 몸과 나를 비교하며 내 몸을 바꾸려는 생각. 이 생각은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저 다시는 식욕억제제를 먹지 않으리라 다짐해볼 뿐이다.
약을 먹었을 때의 비참했던 기분을 생각하며, 자잘한 외모 코르셋에서 하나씩 천천히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언젠가는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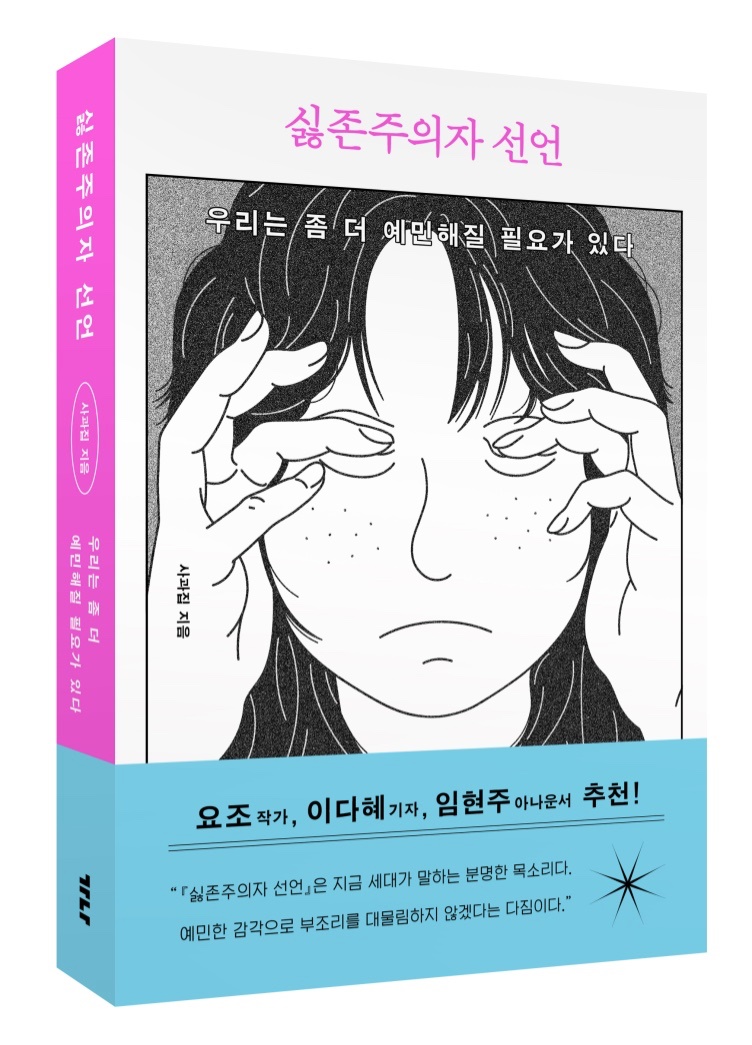
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