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작가는 과거 한예종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짜증 난다’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TV 프로그램 ‘대화의 희열’에 출연해서도 부연설명을 했었는데,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하자면 ‘짜증 난다’라는 표현은 보다 깊은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짜증이 난다고 느끼는 상황과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슬퍼서 그럴 수도 있고 화가 나서 서운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을 ‘짜증 난다’는 말 한마디로 편리하게 ‘퉁’ 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 난다’는 표현을 쓰지 말고, 더 적확한 표현을 사용해야만 자신의 감정을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단어를 개념적으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다. 뭐가 좋으려나, 퉁 단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포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엄브렐러 워드(umbrella word)? 이렇게 깊숙한 감정, 생각, 사상, 의견, 설명, 묘사 등을 편리하게 ‘퉁’ 쳐버리는 단어가 몇몇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집이 세다‘이다. 고집이 센 것은 그냥 고집이 센 것 아닌가 하며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고집’이라는 엄브렐러 워드의 가면을 벗겨보자.
본격적이 이야기에 앞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 의문: 다른 이에게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사람의 고집은 얼마나 셀까? 가끔 다른 사람에게 ‘고집이 세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고집은 얼마나 셀지 궁금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이에게 고집에 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집이 세상에서 제일 센 것 같긴 하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타인을 ‘고집이 세다’고 표현할까?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듯하다.
첫째, 보통 상대방이 의견을 잘 바꾸지 않을 때 이런 말을 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관점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의견을 잘 바꾸지 않을 때 ‘고집이 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고집이 세다’고 표현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나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고, 설득력이 부족한 것을 타인에게 귀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는 성인이며,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다. 이렇게 논리와 근거를 갖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당연히도!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갖춘 또 다른 생각과 마주했을 때나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타인이 고집이 세다기보다 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맞다. 바로 그거다. 우리가 타인을 고집이 세다고 묘사할 때의 50%는 이런 상황이다. 한마디로 로고스적 이유이다.
둘째, 그런데 정말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갖춘 생각을 제시했는데도 의견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고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부족한 이해력은 많은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다. 부족한 지식과 경험 등등 수많은 이유가 있다.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것을 고집이 세다는 말로 편리하게 ‘퉁’ 쳐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일까? 전혀 아니다.
상대방이 이해를 잘 못 하는데, ‘고집이 세다’는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매우 불친절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돕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질문해도 매우 귀찮은 것으로 느끼고 건성으로 들으며 조금만 들어도 다 아는 것처럼 지레짐작하기 일쑤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파토스적 이유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듣는 이 입장에서 자신을 설득시키려는 상대방의 의견이 충분히 논리적이며, 잘 이해가 되는데도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글쎄 싫다기보다 그냥 그 사람의 말에 설득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에토스적 이유라 할 수 있겠다.
어떤 상황일 때 그 사람의 말에 설득되고 싶지 않을까? 서로 악감정이 있는 상황, 즉 감정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상황이 있다. 설득을 시도하는 사람이 과도하게 권위적인 경우이다. 적당한 권위는 설득의 품격을 더해주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불변의 진리가 있듯 과도한 권위는 설득에 대한 반발심만을 불러일으킨다.
‘고집이 세다’는 게으른 언어 사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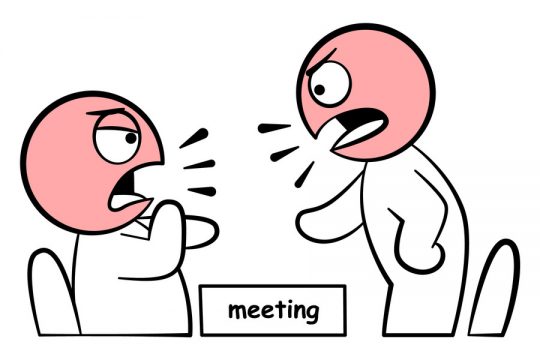
정리하자면 누군가를 ‘고집이 세다’고 묘사하는 것은 추악한 진실을 굉장히 간편하게 덮어버리는 게으른 언어 사용이다. 누군가 ‘고집이 세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일 확률이 매우 높다.
- 나의 설득력이 부족할 경우 (로고스의 부재)
- 상대방의 이해력이 부족한데 그것을 감수할 의지가 없는 경우 (파토스의 부재)
- 상대방과 서로 악감정이 있거나 내가 너무 권위적이어서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은 경우 (에토스의 부재)
나는 별로 고집이 센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몇몇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주변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내가 고집이 세다고 단언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들은 상황들은 놀라우리만큼 유사했다. 바로 위 세 가지 경우의 수 중 2번과 3번이 묘하게 혼재된 그런 상황이었다.
상당히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누군가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설득하려 하고 내가 그 설득 논리에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 그들은 나에게 고집이 세다고 말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들의 논리가 이상(?)해서 납득이 안 가서, 내가 “고집을 부린” 경우도 있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나는 그들의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논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나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경우 그들의 의견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물어보는 편이었다.
선생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만,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은….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제시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은 십중팔구 ‘고집이 세네’였다. 그것도 아주 권위적인 톤앤매너로. 내 친구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네-‘ 하면서 넘겨버리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기엔 나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나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기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하나라도 더 묻고 배우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배움은 내가 이해하지 못 하는 말을 머릿속에 욱여넣는 것이 아니다. 모르는 것,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 귀찮아하지 않고, 자기가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이니 상대방의 고민과 질문을 일부만 듣고 판단해버리지 않고, 성심성의껏 눈높이를 맞춰 주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라 믿는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고집이 세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내 말을 이해 못 하나?’, ‘내 말이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도 ‘고집이 세다’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다. ‘고집이 세다’. 이 말이 떠오를 때면, 다시 한번 돌아보자. 내가 설득력이 부족한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아닌지, 내가 상대방에 대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권위적으로 다가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근데 가만 보면 이런 일을 몇 번 겪고도 그냥 그러려니 ‘네-‘ 하지 못하는 나도 참 ‘고집이 센’ 것 같긴 하네.
p.s.
로고스와 에토스는 그럭저럭 적절히 대입된 것 같으나, 파토스 부분은 다소 깔끔하지가 않아서 아쉽다.
원문: 로도스의 브런치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