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100% 객관은 없지만 100% 주관도 없습니다. 원빈과 정우성 가운데 누가 더 미남인지 따지는 건 취향 문제. 이 둘을 유해진과 비교하는 건 또 다른 접근법입니다. 기사 역시 마찬가지. 서로 다른 기사를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 못 쓴 건 못 쓴 겁니다.
이 현직 기자 말씀을 믿으세요. (잘난 체하자면) 저희 회사에서 2년 동안 수습(신입) 기자 채용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냈던 몸. 대학생 인턴 기자 멘토 구실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래 기사처럼 쓰면 언론사 입사 시험 때 좋은 점수 받기 어렵습니다. (혹시 보게 되실까 봐 밝히자면 이 기사 작성하신 분께 악감정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예시를 찾다가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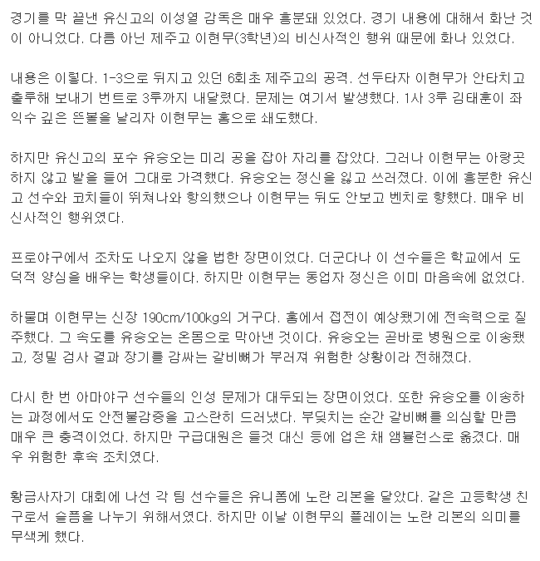
1. 기본, 기본, 기본

육하원칙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육하원칙을 “역사 기사, 보도 기사 따위의 문장을 쓸 때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여섯 가지를 이른다”고 풀이합니다. 실제 기사에서는 ‘왜’를 알기 어려운 일이 잦아 ‘오하원칙’을 쓰기도 합니다.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이제 한번 저 기사를 읽으면서 이 여섯 가지를 찾아보시죠. 언제, 어디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17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제68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이 열렸네요. 자기가 언제 어딘가를 찾아가서 취재했다면 그걸 기사에 밝히는 게 기본입니다. 당연한 일이죠.기자들은 아예 리드(첫 문장)에 이를 밝히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16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회의실 앞 복도.
김광준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포함해 본청에 근무하는 총경급 이상 간부 10여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가 이날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째를 맞아 현안보고를 듣겠다며 김석균 해경청장을 불렀으나 김 청장이 사고 수습을 이유로 불참하자 대신 보고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싸들고 출석한 것.
이들 간부 중에는 수색구조과장과 기동방제과장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과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를 맡아야 할 주무과장들이다.
기사를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를 때는 이 육하원칙 중에 어떤 게 제일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고 쓰면 그만입니다. 그걸 첫 줄에 쓰는 거죠. 위에 링크한 기사는 시간과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기자가 판단해 리드에 썼을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 육하원칙, 적어도 오하원칙 중 어떤 게 빠졌는지 따지면서 글을 채워가면 됩니다. 이게 기사 쓰는 첫걸음. 잘 썼다는 말은 못 들어도 못 썼다는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2. Don’t tell, just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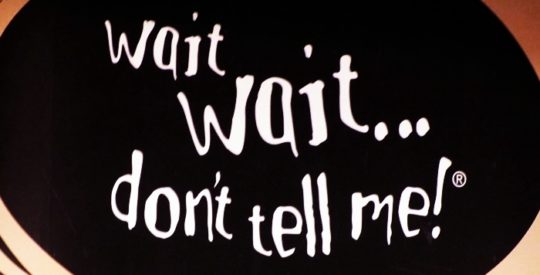
이제부터는 제 주관. 기자는 이야기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보여주는 사람일까요?
저는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왜’를 알기는 참 쉽잖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판단은 독자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기자 주관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 첫 단락에서 감독이 흥분했다거나 화가 났다는 건 기자가 판단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이 빠져 있는 것뿐입니다. 이현무 플레이를 두고 ‘비신사적’이라고도 표현한 것 역시 기자 판단. 심지어 “이현무는 동업자 정신은 이미 마음속에 없었다”는 전지적 작가 시점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왜’를 읽어 보면 기자가 한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대신 저라면 이 감독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풀어썼을 겁니다. 이 기사에도 “유신고 선수와 코치들이 뛰쳐나와 항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만 봐도 흥분하고 화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후속 조치”, “노란 리본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무색게 했다’가 표준어)” 역시 굳이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던 문장입니다.
주관을 줄여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지면 제약 때문.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만큼 긴 글을 쓸 수 있다고요? 과연 독자들도 무작정 긴 글을 끝까지 읽어줄까요? 기자 주관을 줄일수록 글은 짧아집니다.
3. 더 주관적인 몇 가지 제언

리드에 신경 쓰세요. 쉽게 쓰세요. 능동문으로 쓰세요. 구체적으로 쓰세요. 비유를 조심하세요. 접속사를 줄이세요.
제 책상에는 이상을 강조한 말이 이렇게 늘 붙어 있습니다.
취재 안 한 기자는 ‘존재란 추론에 의해 구성된다고 믿어진다’고 작성한다고 알려졌다. 취재하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다고 쓴다.
– 르 귄 ‘글쓰기의 항해술’에서 패러디
또 제가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건, 접속사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 잘 쓰면 글쓴이 의도를 음미해 볼 수 있는 쉼표가 되지만, 잘 못 쓰면 문장 진행을 가로막기만 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 괜찮은데 역시 가장 어려운 건 역접을 써야 할 때. 접속사 없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한번 참아보세요. 쓰다 보면 ‘하지만’이나 ‘그러나’ 같은 접속 부사가 없어도 뜻이 다 통합니다. 마지막을 위해 아껴두세요.
지금까지 제가 쓴 게 정답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감 시간에 쫓겨 급하게 기사를 쓰다 보면 저도 어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오답 역시 아닙니다. 데스크가 여러분 기사를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100% 그렇습니다.
원문 : kini’n cre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