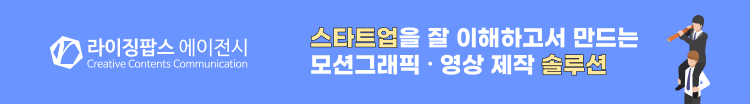야, 연락 좀 자주 해라.
연락 좀 하고 살자.
왜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해!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간밤에 꿈속에 나타난 옛 친구가 있어서 궁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로 오랜만의 연락입니다. 그런데 벨이 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받자마자 “야, 연락 좀 자주 해라. 나 까먹은 거 아냐?”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순간 기분이 묘했지요. 반가우면서도 지적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조금 씁쓸했달까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휴, 본인도 나한테 연락 한번 안 했으면서… 내가 연락 안 한 거나, 네가 연락 안 한 거나 피장파장 아닌가?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 저 역시 누군가에게 “왜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어? 연락 좀 하고 살자”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여겼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았지요. 그러자 “상대방도 분명 이런 감정을 느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친구가 던진 “야, 연락 좀 자주 해”라는 말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토라짐이나 친근한 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랜만에 들은 이 한마디가 왜 거슬리는지 곰곰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연락은 쌍방향이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다들 알지만, 왜 마치 한 사람만 노력하지 않은 듯이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심리학을 공부하며 접했던 의사소통과 감정에 대한 여러 관점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연락’이라는 마음의 다리
연락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지인 등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란,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으며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유대감입니다. 궁금해서 먼저 연락을 하면 상대방도 내 안부를 묻고, 이렇게 주고받는 흐름 자체가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죠. 한편, 상대방에게 건네는 작은 관심과 호의는 교류분석에서 말하는 ‘긍정적 자극(Strokes)’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내?”라는 짧은 메시지가 주는 온기는 생각보다 크거든요.
다만, 이 따뜻함이 책망 섞인 표현으로 바뀔 때는 오히려 불쾌감과 부담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연락 좀 자주 해”라고 들었을 때 느끼는 압박감
반가움에서 비롯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죄책감이나 방어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첫째, 의무감 vs. 자발성 문제입니다. 연락은 자발적으로 해야 서로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연락 좀 자주 해”라는 말은 상대에게 ‘너는 연락할 의무가 있다’라고 전달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기보다, 연락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약간의 책임을 묻는 듯 비칠 때도 있는 거죠.
둘째,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라는 표현에는 은근히 “내가 서운하다” 혹은 “네가 잘못했다”라는 의미가 묻어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책망을 듣는 기분이 들 수 있어, 마냥 반갑지는 않을 때가 있죠. 나도 나름대로 바빴던 사정이 있었을뿐더러, 어쨌든 상대방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나에게 연락을 안 한 거잖아요. 모처럼 큰맘 먹고 연락을 딱 했는데, 연락이 왜 없었냐고 뭐라 한 소리 듣는다면,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해도 오해를 사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장 상사나 웃어른으로부터 “자주 연락해”라는 말을 듣는 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등한 관계인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이러한 말이 나올 경우, 괜히 불편한 지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연락 좀 자주 해라, 내가 싫어진 거야?
하지만 정작 저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대개 모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혹여 상대방이 언짢아하는 기색을 보이면 ‘난 반가워서 그런 건데 왜 저러지’ 생각하며 오해를 갖게 되는 거죠. “왜 속 좁게 그러냐?”라고 되려 역공을 가하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오랜만에 연락한 일이 도리어 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대신 건네면 좋은 말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은 누구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비난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안전감은 사실 사소한 표현 하나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말씀드린, 표면적인 비난(“왜 연락을 안 하니?”)도 그 예시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게 더 이롭습니다.
1. “바쁠 텐데 이렇게 연락해 줘서 고마워.”
이러면 상대방이 늦게라도 전화를 줬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락도 훨씬 부드러워지죠.
2. “다음에는 내가 먼저 연락할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이해하는 동등한 관계라는 느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훨씬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겠죠.
3.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진심으로 너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표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연락이 늦었던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친밀함도 쌓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말들이 더 효과적일까요? 저는 이런 말들이 ‘연락의 쌍방향성’, ‘호혜적 성질’을 암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 연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부모님이나 중요한 집안의 어른이 아닌 다음에야 연락이 의무는 아닙니다.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유대를 다지는, 그러나 어느 한쪽이 부담스럽다면 강요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죠.
그래서 “연락 좀 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지만, “다음에는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는 서로가 같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대등한 관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느껴집니다.

마치며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말 중 상당수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연락 좀 자주 해라” 역시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미묘한 압박감이나 서운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가움인가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더 다정한 방식으로 꺼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연락’이라는 두 글자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반가움과 편안함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문: 허용회의 사이콜로피아
작가의 말
심리학적 글쓰기, 직장심리, 자존감, 목표관리, 마음건강, 메타인지, 외로움 극복, 공간활용의 심리학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 가능합니다. 출강 제안도 환영합니다. 허작가의 사이콜로피아 홈페이지에서 제 소개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필자의 다른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