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치열하게 꿈을 좇고, 치열하게 사랑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들을 아까워하며 절박하게 마음을 쏟고, 자기 자신을 갈아넣듯이 사랑하고, 눈물을 쏟고, 미친 듯이 웃고,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 속에 새벽까지 머리를 싸매고 빠져들고 몰입하면서 한세월 보내는 것이 좋은 삶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마냥 여유 있고 느슨하고 때로는 무얼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부담 없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 약간 재밌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삶이 좋을 것 같지만, 아닐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여유롭고 산책하는 듯한 삶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다 바쳐야만 하는 뜨거운 무언가가 삶을 내내 따라다닐 필요도 있을 것이다. 쫓기듯 살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어쩌면, 쫓기듯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 싶은 삶도 있을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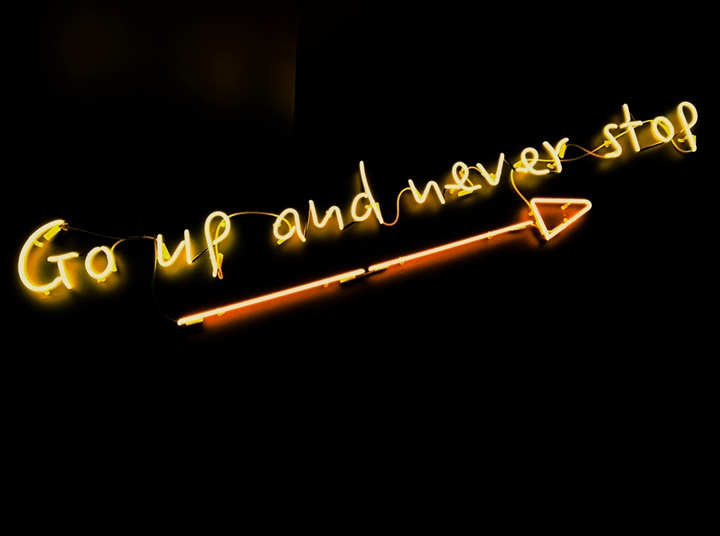
모처럼 지난 몇 년간,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치열했다고 할 법한 신혼생활을 보냈던 도시를 방문했다. 그러면서 그 시절의 마음이랄 게 피어오르듯이 기억났다. 단 하루도 그냥 놓아둘 수 없을 만큼 중압감에 시달리고 쫓기고 쫓듯이 살아가는 날들이었지만, 그랬기에 하루에 얼마간 시간을 내어 아이랑 놀이터에 가고, 악착같이 긁어모은 시간으로 아내와 나들이를 나서고, 동네에 나서던 산책조차도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던 그 날들의 마음이랄 게 생각났다. 그때는 하루 삽십분 정도 글 쓰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졌다. 그조차 소중했다. 신들린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재빠르게 글을 써나갔다. 그런데 그 시절 썼던 글들이 내 생에 가장 좋은 글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든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생의 극한으로 몰아넣은 듯한 나날들이었다. 내일 죽을 것처럼 밤을 새어가며 할 일에 몰두하고, 그 속에서 틈을 내어 글을 쓰고, 악착같이 음악 한 곡 듣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돈을 버는 일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일도 소홀할 수 없었고, 집안 문제도 늘 신경 써야 했고, 하루를 열흘처럼 쓰면서 살았다. 나라는 존재를 백 배쯤 확대시켜서 일 년을 십 년처럼 살았다. 매일 힘들다 속으로 수백 번씩 되뇌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기를 잘했다고, 이따금 오히려 그 시절이 그리워지곤 하는 것이다. 생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듯이 인생을 고갈시켜버리고 수명마저 단축시켜버렸을 어느 나날들이, 인간은 그립기도 한 모양이다.
인생이 어떤 시점에 도달하고 나면 꿈꾸던 행복이나 평화, 마냥 좋을 것만 날들이 막연하게 주어질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날은 없는 것 같다. 평화롭거나 안정적이거나 잔잔한 기쁨들이 가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나날들에도 그 나름의 회의감, 아쉬움, 허탈감도 따라다닐 수 있다. 반면, 인생이 바빠지고 치열할수록 피로만 쌓이고 좋은 시절을 다 놓치는 듯이 느껴질지라도, 그토록 치열하게 삶을 가득 채웠던 시절이 가장 그리운 시절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모든 시절에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기 마련이다. 가장 힘든 시절이 가장 소중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가장 편한 시절이 별다른 기억도 없이 사라질 나날들일지도 모를 일이다. 삶을 계속, 더, 끝까지 살아보기 전까지는 역시 모를 일이다.
원문: 정지우의 페이스북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