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갈 산을 왜 굳이 오르는 걸까? 등린이(등산+어린이)시절, 산 앞에 서면 늘 저 질문이 날 가로막았다. 내 의지로 산에 가는 일은 없었다. 일 때문이거나, 단풍철이거나, 산에 갔다가 내려와 산 아래 식당에서 동동주에 파전을 먹자는 꾐에 빠져 어쩌다 산에 가곤 했다. 매번 남의 손에 이끌려 간 산. ‘클리어할 미션’을 받은 게임 속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산을 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벅지 근육은 찢어질 듯 아파오고, 얼굴은 땀으로 엉망진창이 된다.

정상에 가 보지 않은 한, 정상까지의 거리를 가늠하기 어렵다. 친절한 표지판이 정상까지의 거리를 숫자로 가르쳐 준다. 하지만 뼛속까지 문과인 나에게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지와 산은 오르는 속도가 다르다. 물속에서는 하늘을 나는 듯 유영하는 펭귄도 육지에 올라오면 뒤뚱거리는 것처럼. 걷는 걸 아무리 좋아해도 산은 장르가 다르다. 그래서 산에 오를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마다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묻곤 했다.
정상까지 얼마나 올라가야 해요?
음… 한 15분? 20분?
등린이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15분을 올랐다. 하지만 정상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내려오는 분에게 물었다.
얼마나 올라가야 정상에 도착하나요?
한 15분이면 도착해요. 금방 가요. 힘내세요.
다시 15분이 흐른 후, 내 눈에 보이는 건 정상이 아니라 아직 한참 올라갈 울퉁불퉁한 돌 길이었다. 연이은 거짓말 공격에 허탈함이 밀려왔다. 이대로 포기하고 하산할까? 생각도 밀려온다. 하지만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깝다.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상을 향해 걷는다. 다시 고비가 왔을 때쯤 고민한다.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볼까?
하지만 이제는 어떤 답이 돌아올지 묻지 않아도 안다. 15분. 그것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 사이의 암묵적인 룰임을 인정한다. 닥치고 오른다. 그때부터는 정상을 보는 게 아니라 땅만 보고 걷는다. 많은 산은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가파르다. 정상을 바라보며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헛디디지 않기 위해 당장 내 디뎌야 할 한 걸음 앞만 신경을 쓴다. 먼 목표 따위는 잊어야 한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난 정상에 도착해 있었다.
정상 위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물을 마신다. 발밑의 산 아래 땅을 내려다보면 어느새 땀이 식는다. 허벅지를 찌르던 근육통도 어느새 사라졌다. 그제야 알게 된다. 먼저 정상을 찍고 내려오던 사람들이 다 15분이라고 얘기했는지.
얼마나 올라가야 하냐는 내 질문에 등산 선배들은 진실을 답할 수 없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만약 ‘1시간이요’ ‘2시간이요’라고 말했다면? 등린이는 정상을 찍지 못했을 것이다. 진실과 마주하면 분명 머릿속에 스멀스멀 #포기, #하산, #탈출 이런 단어들이 채워질 것이다. 그랬다면 난 분명 평생 정상에서 산바람을 맞는 묘미를 모른 채 살았을 거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늠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방향만 맞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가 끝나는 곳까지만 우선 올라가 보자. 눈 앞에 보이는 저 바위까지 가 보자. 저 평평한 바위에서 누워 초코바를 먹으며 내려갈지 말지 그때 다시 생각해 보자.
저 앞에 가는 빨간 가방을 멘 아주머니만 따라잡아 보자. 산다람쥐 같은 아주머니를 넘어서면 5분만 쉬자. 이런 식의 짧은 목표를 두면 긴 산행도 지루하지 않다. 손에 닿는 가벼운 목표들은 결국 날 어느새 정상에 데려다 놓는다. 나처럼 끈기도 지구력도 약한 인간이 꾸준히 운동을 하고, 글을 쓰고, 책을 내게 된 것도 다 이 짧은 목표들 덕분이었다.
산에서 만난 무수한 거짓말쟁이들. 그들의 하얀 거짓말은 포기가 일상인 등린이에게 보낸 따뜻하고 담백한 응원이었다. 종종 산에 갈 때면, 등린이 시절의 나를 보는 듯한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빨갛게 상기된 볼, 땀범벅인 그들은 나에게 묻는다.
얼마나 올라가야 해요?
탈진 직전의 그들에게 나는 말한다.
한 15분? 20분? 저 바위만 넘어가면 금방 도착해요.
나도 산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하얀 거짓말을 나에게 해주었던 등산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문: 호사의 브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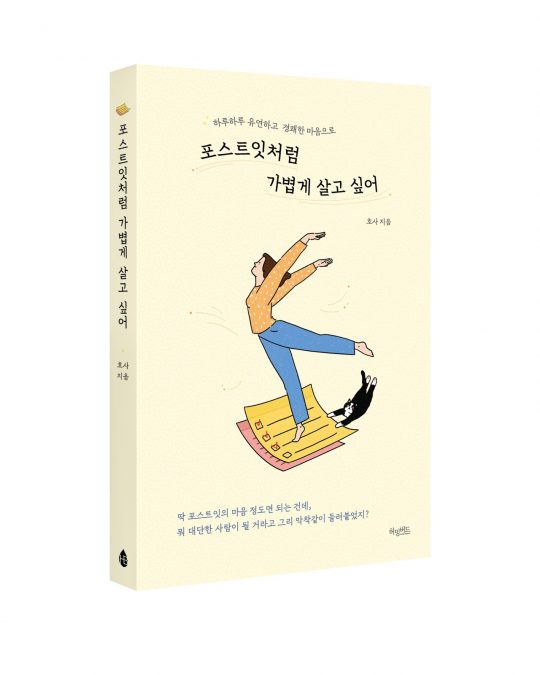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