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츠제럴드의 가짜 편지 한 장
얼마 전, Nick Farriella라는 미국 작가가 패러디물로 제작한 ‘스콧 피츠제럴드의 편지’가 소셜미디어 위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대유행의 마지막 해인 1920년에 피츠제럴드가 프랑스 남부에 격리된 상태에서 그의 절친인 ‘로즈마리’에게 보낸 편지라며 온라인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는데요, 사실 ‘로즈마리’는 피츠제럴드의 소설 『밤은 부드러워』 에서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이 패러디 편지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죠.
It was a limpid dreary day, hung as in a basket from a single dull star.
이 문장 또한 소설 <밤은 부드러워> 9장의 첫 문장을 약간 변형한 겁니다. 아무튼 시류에 편승해 순진한 선생님들 낚아서 이름 한번 날려보려는 치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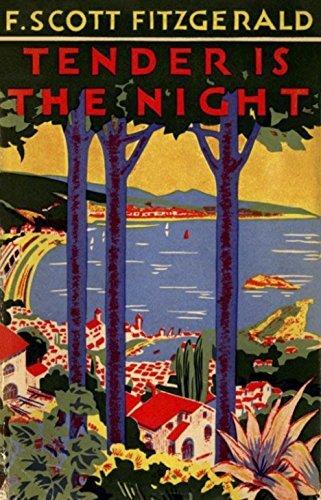
오늘은 스콧 피츠제럴드 선생님이 그의 마지막 개인 비서였던 프랜시스 크롤 링(Frances Kroll Ring)의 남동생이자 신인 작가였던 모튼 크롤(Morton Kroll)에게 쓴 실제 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2장의 편지 속에는 마음을 뒤흔드는 교훈이 있죠. 앞서 이야기한 가짜 편지가 아니에요! 진짜 편지입니다.
피츠제럴드의 진짜 편지 두 장
1939년 8월 3일의 첫 번째 편지에는 모튼 크롤의 작품을 받아본 피츠제럴드가 그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들어있고, 1939년 8월 9일의 두 번째 편지에서는 피 선생님께서 조금도 따분하지 않은 태도로 고전(클래식) 읽기와 글쓰기의 기본기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 선생님의 편지 전체를 번역하여 소개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맨 아래에 링크로 첨부한 피츠제럴드의 편지 전문을 쭉 읽다 보면 그의 겸손하고도 친절한 태도에 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편지가 쓰인 시기는 피츠제럴드가 헐리우드에서 인생의 바닥 체험을 하던 때이거든요. 그래서 일견 그의 태도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피츠제럴드는 습작생들을 늘 응원해주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문학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던 가슴이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말하는 당사자에게는 자못 새롭게 여겨지는 용감한 말도 알고 보면 그 이전에 똑같은 어조로 백 번도 더 되풀이되었던 말이다. 추는 항상 좌우로 흔들리고, 사람들은 같은 원을 늘 새롭게 돈다.
- 서머싯 몸 『달과 6펜스』
몇 개월 전, 봉준호 선생님은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소감을 발표하며 마틴 스콜세지 옹의 명문을 빌려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전설의 멘트를 날린 바 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의 정확한 워딩은 다르다며 딴지를 거는 선생님들도 계시던데, 봉 선생님의 수상 소감이 전 세계에 무자비하게 송출된 이상,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39년 8월 3일, 피츠제럴드 선생님은 모튼 크롤이라는 신인 작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조언을 날립니다. 아래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초보 작가들이(너에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캐릭터와 감정을 다루며 뭘 써야 하고 또 쓰지 말아야 하는지의 갈림길에 도달했을 때, ‘잘 알려진, 선망받는 그리고 현재 잘 받아들여지는’ 방식에 이끌리게 되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면서.
“어느 누구도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 이 하찮은 행동에 관심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만 특별한 거라고. 이건 대중적이지도, 재밌지도, 심지어 옳지도 않아.”
그런데 만일 그 재능에 깊은 통찰이나 운이 깃든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보게 될 거야. 그 갈림길에서 또다른 내면의 목소리(속삭임)로 인해 누가 봐도 하찮고 사소한 것들을 써 내려가고, 그것은 그 사람의 스타일이자 개성이 되지. 그리고 결국 아티스트로서의 완전한 자신이 되는 거야. 그가 버려야겠다고 생각해 온, 또는 아주 흔하게 버려왔던 것들이 사실은 그에게 허용된 미덕이었던 거지.
거트루드 스타인도 인생을 이야기하며 이와 비슷한 생각을 전달하려고 했었어. 우린 마흔 살이 되기 전까지 우리들의 특별한 자질들과 맞서 싸우고는 너무 늦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그러한 특별한 자질들이 사실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것들은 우리가 보살피고 가꿨어야 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모습이었다고.
- 1939년 8월 3일
피츠제럴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주 사소하고 하찮다고 여겨지는 오직 나만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들, 너무 잘고 대수롭지 않아서 어디에도 안 먹힐 거라 지레짐작하며 무심코 버려왔던 작은 아이디어들이 실은 진짜 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일단 뱉어내고 운도 조금 따른다면, 창의적인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중간에 인용하는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의 이야기도 곱씹을 만합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특별한 자질과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세상의 눈치를 보며 부정하거나 애써 죽여버린다는 의미겠죠) 더 소중히 그것들을 가꿔야 한다는 지점이죠. ‘개성’이 전부인 이 시대에 정말로 가슴에 새겨볼 만한 생각이네요.

“어린 시절부터 고전을 읽을 것”
다음은 1939년 8월 9일 편지의 일부입니다. 피츠제럴드는 해당 편지를 통해 어린 시절, 고전(클래식)에 대한 감응력을 키워놓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정석적인 기본기를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음…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맥락 파악이 잘 안 되고 문장이 복잡해서 번역하는 데 애를 먹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작가의 개성이라는 것이 아주 어린 나이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야(존 키츠를 봐!).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 나는 고전 작품과 얼마나 교감했는가에 따라서 스무 살이 되기 훨씬 이전에도 타고난 산문 작가가 탄생할 수 있다고 믿어.
우리 엄마는 내가 열두세 살 무렵에 쓴 두 개의 작품을 빼고는 어린 시절에 내가 쓴 글들을 전부 갖다 버리는 몹쓸 짓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 용케 살아남은 그 두 작품을 읽어보니 그것들이 7, 8년 후 빡센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시기에 쓴 글들보다 더 훌륭하더라고. (……)
꽤 장황한 편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덧붙일게. 네가 만약 테니스를 배우고 있다면, 틸든(Tilden)처럼 정도를 벗어난 방식이 아닌 코쳇(Cochet)이나 라 코스트(La Coste)처럼 클래식한 스타일로 자세를 잡아보렴. 독특한 버릇을 따라 하는 일에 힘을 쓰지 마. 어떤 사람이 틸든의 테니스 스타일을 6년 동안 연마한다면, 아마 결국에는 187cm라는 그의 신체 조건 때문에 해당 스타일이 가능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 1939년 8월 9일
여러분은 80년 전에 소설가 피츠제럴드가 한 신인 작가에게 쓴 편지의 일부를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하군요. 혹시 ‘뭐야, 뻔한 이야기잖아?’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제가 케케묵은 80년 전의 미국산 편지를 보물찾기하듯 뒤져가며 찾아 읽는 이유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놀라움과 깨달음의 순간이 주는 쾌감 때문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도 아니니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믿는데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훌륭한 ‘크리에이티브’도 몇백 년 전에 다 끝난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에 같은 수준의 고민을 다른 관점에서 반복하다가 운 좋은 몇몇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 한 시대를 새롭게 이끌고 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에이터들은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듯합니다. 최신 콘텐츠는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그 사람 모르냐며, 그 영상 안 봤냐며, 그 카페 안 가봤냐며 핀잔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럴 때일수록 옛날 것들을 찾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견딘 단단한 생각의 힘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싶어서요. ‘본질’을 찾기 위해서죠.
날이 많이 추워지네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스눕피의 매거진을 찾아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문: 스눕피의 브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