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한 함정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든 우린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역할에 따라 무엇인가를 함께 하게 된다. 기획자가 개발자를 만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앱을 개발하기도 한다. 평소 알던 디자이너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뭔가 서로의 니즈가 통하면 같이 공동창업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함께 열심히 일을 한다. 호흡이 착착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하는 일이다 보니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더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워낙 시급하고 부족한 게 많다 보니 사람들은 아쉽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거나 나중으로 고민의 깊이를 미룬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찜찜하기 시작한다. 공동창업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때나,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또는 함께 일하는 파트너 관계에서도 일은 진행되고 있는데 클리어하기보다 뭔가 모호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말하기 좀 애매하기도 하고 껄끄러울 수도 있다. 그래도 이야기를 꺼내보지만 변죽을 울리다 만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다. 뭔가 많이 틀어졌다는 느낌이 들거나 생각의 갭이 엄청나게 크다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 그제야 그럴 줄 몰랐다고 서로를 원망하거나 돌이켜보려 애를 쓰지만 그 갭은 되돌리기에 너무 크고 마음의 틈은 회복이 요원하다.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원인을 함께 논의하지만 이미 되돌아오기엔 멀리 가 있다.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중이 절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고, 스타트업이라면 결별을 이야기하는 수순이 온다.
여러 스타트업의 결별을 보았고, 회사를 떠나는 개발자들을 목격했고, 보내온 시간과 함께 믿음과 신뢰가 한꺼번에 깨지는 회사를 보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쉽게 암묵적 합의의 늪에 빠진다

암묵적 합의란 서로 명확하게 조건과 요구사항을 드러내 이야기하고 그것에 맞는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성문화하는 정식합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초기에 구체적이지 않았으니 달려왔던 관성으로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마음으로 믿거나, 그렇다고 간주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지분을 주는 사람과 받을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도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초기에 자금의 여유가 없고 상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러자니 관계가 쪼잔해 보인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암묵적 합의의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것이 장기화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왜 암묵적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일까
많은 스타트업을 만나고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도 해보는 등 다양한 회사와 집단의 사람과 만나면서 느낀 이유는 이렇다.

-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의 시작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이다. 시간이 흐르고 깨닫기 시작하지만 번번이 바로 잡을 타이밍을 놓치거나 미루게 된다.
- 일부러 피하는 경우. 해야 하는 걸 알면서 한쪽이 일부러 피한다. 지분을 더 받기로 개발자는 믿고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는 처음과 마음이 다르다. 직원은 5%쯤 받을 거라 믿고 있는데 대표는 1%를 생각하고 있다. 주는 것이 아깝거나 떠날까 두려워 대표가 이를 피한다. 개발자들이 무언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들어 줄 수가 없다. 암묵적 합의는 양쪽이 함께 거리를 좁혀오지 못하면 명시적 합의로 바꿀 수가 없다.
-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 암묵적 합의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언뜻 그렇게 들었고 개발자는 나중에 대표가 지분을 줄 거라 믿고 있다. 대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는 했으나 사실 주겠다는 확신은 없다. 파트너와 프로젝트가 잘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상대편도 챙겨주겠지 생각하지만 이익이 나면, 또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합의는 없었다. 직원이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나 R&R이나 일의 스펙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고 동료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막연히 잘할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 암묵적 합의의 내용은 각자의 머릿속에서 다른 모양으로 커가고 있다.
- 이야기했으나 성문화하지 않은 경우. 그나마 나은 것은 명시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경우이다. 하지만 문서나 이메일, 계약서 등으로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이야기된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다른 모양으로 바뀐다. 사람의 기억이나 말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 해석하는 조건의 차이로 인해─막연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것보다 구체적일 수는 있지만─진화하는 모습을 막을 수는 없다.
- 성문화했으나 명료하지 않은 경우. 가장 나은 케이스는 명료하지 않아도 문서화를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문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환경이 바뀌고 사람과 일에 대한 이해도가 커지면서 구체적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완벽한 명시적 합의는 스타트업에서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초기부터 명시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껄끄러운 이야기도 나누고 원하는 일, 해야 할 일, 투자하고 손해 봐야 할 조건, 기여하고 보상해야 할 구체적 과정들을 논의하면서 서로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글로 기술해 남긴다면 이것은 암묵적이지 않은 명시적 합의가 된다. 명시적 합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로의 갭을 줄이고 방향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암묵이 아닌 명시의 문화로
사업을 하고, 스타트업이나 타인과 컬래버레이션하는 모든 경우 우리는 이렇게 암묵적 합의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인은 싫은 이야기 나누는 걸 꺼리고, 건전한 토론을 감정적 대립으로 인지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특히나 명시적 합의를 위한 과정을 추구하기보단 쉽게 쉽게 암묵적 합의의 틀을 만들어 민감한 것들은 그 안에 넣어두고 싶어 한다.
암묵적 합의는 시간이 흐른 후에 독이 되어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는 씨앗이다. 구체적이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논의의 과정이 불편해도 믿음과 신뢰가 쌓일 수 있고 관계의 가치를 지속할 수 있는 명시적 합의를 만드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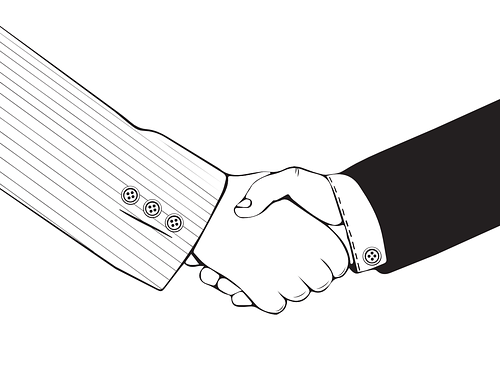
어쩌면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아이템의 사업성이나 시장 상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명시적 합의로의 커뮤니케이션과 이를 위한 문화라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원문: 최형욱의 브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