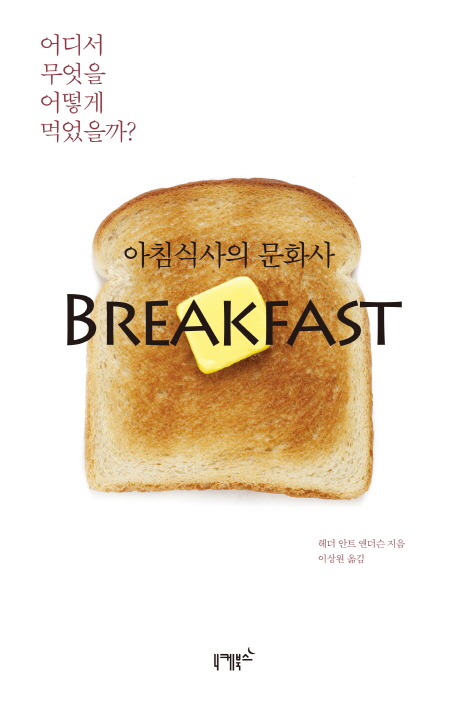고3 때, 어느 날 아침이었다. 어머니께서 아침을 차려주시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내게 조용히 물으셨다.
“지각 아니니? 아침을 꼭 먹고 가야겠어?”
당시 등교 시간은 오전 7시 20분까지였다. 아침 청소를 하고 조회를 하고 8시에 0교시가 시작됐다. 등교한 순으로 원하는 자리에 앉는 시스템이었는데, 난 항상 교탁 앞에 앉을 정도로 지각을 밥 먹듯 했다. 그래도 난 아침은 꼭 먹고 가야 한다는 파였다. 대다수의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
급식이 없어 모두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던 시절이었다. 대부분 3교시가 끝나면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까서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이들은 4교시에 식곤증에 시달렸고 점심시간 시작과 함께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잠을 잤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자는 나를 비롯해 대여섯 명만 있었다. 4교시에도 똘망똘망했던 우리들의 공통점은 집에서 아침을 먹고 온다는 것.

그러고 보면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 ‘아침을 먹어야 하느냐 마느냐’ 따위의 고민을 해본 적은 없다. 아침은 당연히 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야간자율학습’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3학년 때 ‘0교시’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언제나 잠이 부족했다. 시간에 쫓겨 아침을 먹느냐 마느냐와 같은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한국의 문화 중 ‘밤 문화’가 청소년 시절부터 밤 12시까지 야자에 학원에 뺑뺑이 돌리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집에서 놀 줄을 모른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이다. 야근과 회식, 술자리에 쫓겨 밤을 보내고, 일찍 출근해야 하는 아침에는 5분이라도 더 자겠다고 이불 속에서 아등바등하는 와중에 아침 식사는 사치에 가까운 행위다.
몇 개월 전 여의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기한 풍경이 하나 있었다. 오전 11시만 되면 식당들이 가득 차는 것이다. 12시 붐비는 시간을 피해서 일찍 점심을 먹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근 시간이 7~8시로 이른 회사들이 많아 아침을 거른 직장인들이 조금 일찍 밥을 먹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답잖은 TV 정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뉴스에는 “아침 식사를 해야 두뇌 회전에 좋다” “아침 사과는 보약이고 저녁 사과는 독이다” “아침을 먹어야 살이 덜 찐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와 같은 모순적인 이야기들로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 그렇다. 고3 이후 아침 식사는 절대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가 된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아침 식사가 죄악이었다고 한다. 헤더 안트 앤더슨이 쓴 『아침식사의 문화사』에 따르면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아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다.
“어린아이와 노인, 병약자, 육체 노동자는 예외지만 일반인들은 아침을 먹는 것은 물론 아침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은 폭식의 죄를 범하는 길”
반면 15세기 프랑스에서는 프랑수아 1세 왕이 ‘5시 기상, 9시 아침 식사, 5시 저녁 식사, 9시 취침’이라는 규칙을 세운 덕분에 아침 식사가 유행이 됐다고 한다.
사실 ‘아침-점심-저녁’으로 짜인 현대인의 식사 공식이 인간 DNA에 박힌 유전적 습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렵 시절에는 며칠을 굶다가 사냥에 성공해 근사한 포식을 했을 것이다. 지금도 사자는 그렇게 산다. 그러다 농경사회가 도래해 저장된 곡식이 있고,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게 되면서 아침 식사라는 것이 등장했다. 육체노동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금기시했던 금욕주의 시대에도 ‘육체 노동자’는 예외로 뒀다.
아침 메뉴가 인류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아침에 맥주나 포도주 같은 술을 음료로 마셨단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1451년 5월 10일의 일기에는 “6시에 아침 식사. 소고기는 지나치게 익혔고, 맥주는 약간 이상한 냄새를 풍김.”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대식가로 유명한 어느 백작 부부의 아침 메뉴는 ‘빵 두 덩어리, 맥주 1리터, 포도주 1리터, 염장 생선 2조각, 훈제 청어 6마리, 신선한 청어 4마리 또는 생선 요리 1접시’였다고 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동료들이 아침에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신다고 투덜대기도 했다고. ‘해장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대를 잘 못 태어난 듯. 아침 맥주와 포도주가 차와 커피로 바뀐 것은 19세기 들어서였다. 적당한 양의 술이나 카페인 모두 각성 효과 때문이었으리라.
아침 식사의 대명사인 시리얼은 미국에서 유행이 시작됐는데 그 시작이 재밌다. 원래 시리얼은 ‘간편식’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건강식’이었다. 1894년 재림교 신자이자 채식주의에 관심이 많아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던 존 하비 켈로그는 물에 불린 통밀을 냄비에 넣고 삶았는데 불 위에 올려놓고 깜빡해 죽이 돼버렸다.
버리기 아까워 얇게 반죽을 만들어 보려고 롤러에 넣어 돌렸는데, 롤러를 통과한 반죽이 말라 우두두두 부서져 통 속으로 떨어졌다. 이게 시리얼이 된 것이다. 마침 건강증진센터에 견학을 갔던 포스트가 켈로그의 아이디어를 훔쳐 회사를 차렸고, 존 하비 켈로그의 동생 윌 켈로그는 설탕을 첨가한 콘플레이크를 만들어 회사를 차렸다. 이 두 회사가 우리가 아는 ‘켈로그’와 ‘포스트’의 시작이었던 것.
미국에서는 전쟁 당시 달걀과 육류의 배급제가 일어나며 시리얼이 아침 식사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1960년대 페미니즘 붐과 함께 시리얼은 여성을 아침 조리의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식단으로 각광을 받았다고 한다.

『아침식사의 문화사』를 읽은 결과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아침 메뉴는 뭐가 좋으냐에 정답은 없다.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과 건강, 습관에 맞게 아침을 먹으면 된다. ‘낮 12시에 점심을 먹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침을 먹는 게 좋을 것이다.
오전 9시에 일어나 10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굳이 아침을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낮에 일어나 새벽 5시까지 일하는 올빼미족이라면 자정에 먹어도 된다. 아침이라는 영어 단어 ‘Breakfast’는 ‘단식(Fast)’을 ‘깨다(Break)’라는 뜻이다. 무엇이든 하루에 먹는 첫 끼니가 아침인 셈이다.
물론 불규칙한 식사는 건강에 안 좋다. 내 라이프스타일에 맞고, 내 체질과 건강에 맞는 아침 시간(‘먹느냐 마느냐’를 포함해)과 메뉴를 정해두는 것은 필요하다. 현대인의 삶에서 점심과 저녁은 항상 메뉴가 바뀌기 마련이다. 아침, 혹은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나에게 맞는 ‘나만의 식단’을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먹는 것이 좋겠다.
『아침식사의 문화사』는 외국인이 쓴 책이라 우리 음식에 대한 고려는 없지만(중국과 일본이 나오기는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아침을 먹고 사는지 들여다보며 내 식단을 구상하기 위한 자료로는 손색이 없다.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레시피에 앞서 철학을 갖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