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는 종종 거짓말 같은, 낯선 이들과의 해프닝이 일어난다. 오늘 오후 분리수거를 하려고 박스를 바리바리 짊어지고 나가는데 맞은편 복도에서 이보세요, 이보세요, 하고 부르는 연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시하려다가 고개를 꺾어 보니 한 할머니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달라니?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저는 문을 못 여는데요. 열쇠가 있어야죠.” 했더니 “나도 열쇠가 없는데…” 하셨다.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집에 문이 안 열린다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한 할머니가. 나는 기시감에, 그때는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던 죄책감에 이끌려 다가갔다.

문에 달린 것은 번호키였다. 할머니는 내복에 가까운 실내복 차림에 지팡이를 문 옆에 세워둔 채였다. 할머니가 불러준 번호대로 입력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혹시 치매신가? 집을 잘못 찾았을 가능성이 번득 머리를 스쳤다. 10년 전의 할머니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엉뚱한 집에서 이렇게 번호키를 삑삑거리는 것도 문제라 나는 재차,
“할머니, 여기가 댁이 맞으세요?”
동과 호수를 확인했다. 주소는 맞았다. 혹시 같이 사는 사람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혹시 잘못 찾은 집이더라도 애꿎은 사람이 겁 먹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도 대담해졌다. 거듭 번호를 입력했다. 번호가 틀렸다면 삐삐삐 하는 소리가 나거나 할 텐데 살짝 걸쇠가 돌아가다가 멈추는 소리만 들렸다. 고장 난 것일까. 문을 당겼다가 밀어서 꽉 닫히게 한 뒤 다시 한 번 시도해보았다.
‘삑삑삑삑, 위잉.’
마침내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틀린 것도, 치매도 아니었다. 문의 문제였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기계의 오류였다. 할머니는 내가 몹시 대단한 일이라도 해낸 양 거듭 허리를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다음부터는 안 되면 밀어서 해보세요, 하는 말을 남기고 내려오면서 나는 복도에서 할머니가 불렀던 집의 비밀번호를 그 라인에 사는 누구도 우연히 듣지 않았기를 기도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먼 미래의 일을 오십년 정도 앞질러 경험한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수십 년을 살면서 자신을 둘러싼 것들이 쫓아가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바뀌고, 기어이 그보다 훨씬 대단하고 복잡한 일들을 해냈을 한 인간이 낯선 기계 앞에서 완벽하게 무능해지는 순간에 대해서. 90을 바라보는 내 할머니가, 전쟁을 경험하고 첫 아이와 남편을 잃고도 살아남은 강인한 사람이 아이처럼 말간 얼굴로 내 태블릿을 들여다보면서 그걸로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던 때의 막막함처럼.

나이듦과, 불친절한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란 어떤 것일까. 나는 벌써 몇몇 흐름들을 쫓아가지 못하는데. 신체와 사고는 더 느려지고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할 것이다. 나갈 때 열었던 문이 들어올 때는 열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이겠고.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다. 수직으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질서 앞에 서면 2016년 5월 5일, 오늘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주 미래의 내가 불쑥불쑥 파편으로 튀어나와 푹 찌른다. 영어로 된 화장품의 용도를 설명해달라고 하면서, 집을 못 찾겠다고 손목을 잡으면서, ATM에서 돈을 뽑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환승하는 방법을 빼곡하게 적은 쪽지를 들이밀면서, 영어 간판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포인트 적립 카드를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면서.
그럴 때의 그들은 나에게서 어려울 것 없고 무엇이든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던 과거를 볼까. 어린이날이랍시고 잔뜩 흥에 겨워 마음껏 아이스크림을 고르던, 허리를 구십도로 꺾고 곧 빨려들어갈 듯 아이스크림 통에 매달려 있던 아이의 파란색 쫄바지가 나를 90년대의 어느 순간으로 데려가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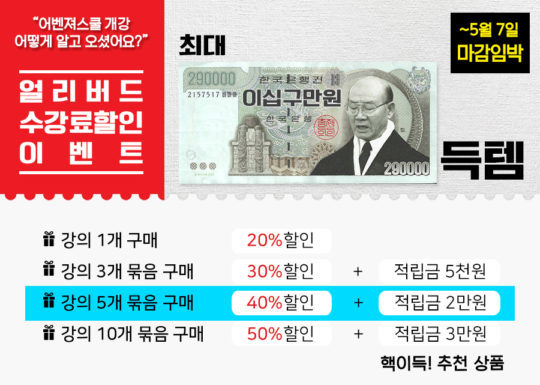
원문: 짐송님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