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에게 일베가 너무나 가까운 존재임을 알고 섬뜩해질 때가 있다.
교과서에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 시나리오가 나온다. 아이들과 함께 ‘김씨 표류기’를 보았다. 영화의 첫 장면은 주인공 김씨(정재영 분)가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직장도 그만 두게 되고, 그래서 여자친구(수정이)에게도 차이고. 삶의 희망이 없어진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영화 타이틀이 나오기 직전, 다리 난간 밖으로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김씨의 뒤로 파란 버스가 지나가고, 난간에 서 있던 김씨가 사라진다.
이 타이밍에 몇몇 아이들의 입에서는 ‘운지’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처음에는 ‘운지’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 잘 몰랐다. 그러다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시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글을 쓰기 직전, 트윗에서 본 일베 분석 글에서 ‘운지’라는 말이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이 말을 ‘떨어지다’의 의미와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 누군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몇몇 학생들의 입에서는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데, 그 뉘앙스는 또 얼마나 찰지게 뱉어내는지,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다.
아이들의 일상 언어가 되어버린 ‘일베 언어’
아이들과 늘 함께 수다 떠는 일이 업이다 보니, 아이들에 대해 쉽게 파악하는 편이다. 대략 교실 내에 ‘일베충’을 감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호들이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일베어’들을 구사한다거나, 양성평등 사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해댄다거나, 정치적 쟁점들에서 진보 진영에서 주로 옹호하는 가치들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다거나.
그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말들도 잘 해서 ‘일베’에서 학습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그럴 듯하게 이야기를 끌어낸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베충’ 중학생들은 ‘유머’에 대해 예민한 녀석들이 많다보니 그러한 듯하다.
대체로 그런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의미가 오고 가고 한다는 느낌이 없다. 대화라는 느낌보다는 녹음된 이야기를 읊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이건 아마 일베를 전혀 모르고, 아이들과 반대 방향으로 치우친 내 탓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서로의 논의는 평행선을 긋고, 소통이나 설득될 수 있는 지점을 찾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정치적 입장이 반대이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일베, 아이들에게 정치적 성향에 앞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게 하는 곳.
여기에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필자의 아버지는 매우 보수적인 분이시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분배보다는 성장, 평등보다는 경쟁. 필자의 정치적 입장과 모든 지점에서 정반대 쪽에 서 계신다. 5.18에 대해서도 ‘폭동’이라고 인식하고 계신 것은 물론이다.(이 부분에서 필자 역시 굉장히 분노했다.) 그토록 보수적인 아버지이지만, 5.18 유족 사진을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조롱을 일삼지는 않는다.(이에 대한 일베의 논의는 여기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물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아버지의 주장에는 나름의 분명한 근거가 있고, 그렇게 드는 근거들이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나는 일베의 문제점이 보수적인 가치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유해한 머저리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베의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퍼뜨리기 위해 선택하는 유머를 구사하는 방식이 남의 존재나 삶을, 죽음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어떤 한 인간의 존재의 소멸을 희화화할 권리를 누가 가질 수 있는가. 자신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을 잃은 어떤 이들의 슬픔을 왜곡하거나 조롱할 권리는 없다.

내가 바라는 아이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교육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일베에 가서 낄낄거리지 않았으면 한다. 어떤 대통령을, 혹은 여성을 악의적이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이 의견을 유머러스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믿는 곳에 가서 낄낄거리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아이들이 그 하나로서 16년의 역사라고 믿는다. 인간은 짧든 길든 다들 자신의 삶을 꾸리는 데에 고군분투하는 역사 그 자체이다. 나는 내 아이들이 사람들이 사실 다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한다. 자신이 공부하느라,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느라 피곤한 만큼, 부모님도 나를 키우고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서 버텨내고 있음을 알고, 애처로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한다. 그렇기에 나는 내 아이들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남의 삶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에서 웃음의 근거를 찾지 않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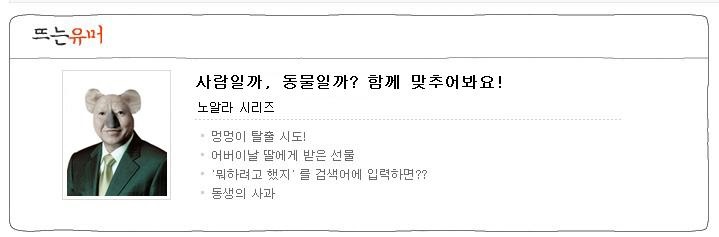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옳고 그른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 사회 역사적인 기본 지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근현대사 교육이 철저해야 함은 물론이고, 고정되어 암기해야 하는 지식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는 것으로서의 역사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에 나오는 영어나 언어 지문보다 다른 이의 감정을 읽어내는 것을 잘 하는 아이들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면 쓸수록 책임감이 덮쳐 온다. 시 한 편으로 글을 갑자기 끝내 보려 한다. 우리는 서로 손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한 삶을 토닥거리면서도 유쾌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져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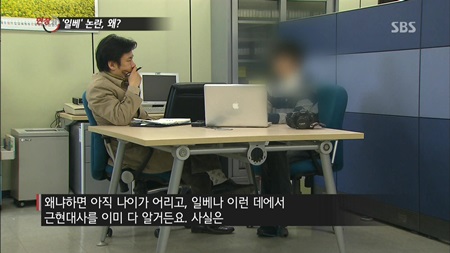
묵화 / 김종삼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