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한 사람들의 부고 기사를 매일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작가님이 있다.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의 죽음에 모두가 애도의 물결을 이룰 때도, 작가님은 꿋꿋하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어제도 본 것 같고, 한 달 전에도 본 것만 같은 언뜻 비슷해 보이는 삶과 죽음의 모습.
그들은 대개 스스로 말하지 못한다. 지역, 성별, 나이, 직업, 자살의 이유가 짤막하게 간추려져서 나올 뿐이다. 신문 부고란 몇 줄의 기사로 한 사람의 삶이 정리되는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된 나에게 차곡차곡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작가님의 페이스북은 내가 잊고 사는 많은 이름 없는 사람을 상기하게 하는 공간이다.
우리는 어떤 죽음에는 크게 슬퍼하고, 어떤 죽음에는 이상하리만큼 무감각하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에는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으면서, 정작 아랫집 여자의 매 맞는 소리에는 항상 귀를 닫았다고 말한 한 인디 가수의 고백은, 내 모습과 닮아 있었다.
친한 친구 A는 세월호 직전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중절했다. 다음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쳤음에도 그녀는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자신의 아픔이 하찮게 느껴졌다고 했다. 누군가의 부재는 ‘마땅히’ 애도해야 하는 것이 되고, 누군가의 부재는 그렇지 못하다.

매 맞는 아랫집 여자의 폭력은 ‘그런 남자를 만났거나, 여자도 똑같거나, 여자가 맞을만했거나’로 해석하며 폭력을 희석하고, 중절한 여자의 아픔은 ‘그러게 피임을 잘 했어야 했다, 여자가 자초한 일, 여자가 아니라 죽은 아이가 불쌍하지’의 이유로 왜곡한다.
파리 테러의 희생자들을 애도했던 많은 사람은 아프리카, 시리아, 팔레스타인 제3세계 곳곳의 희생자에게도 같은 슬픔을 느꼈을까.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함께 아파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죽음이나 폭력에는 어떨까.
여전히 ‘자발적 매춘’이었는지, ‘강제적 인신매매’였는지는 위안부 문제의 중심 화두가 된다. 설사 ‘매춘’이라면 그 폭력은 다르게 해석되는 걸까. 키우는 강아지의 죽음에는 슬퍼하지만,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동물들의 죽음에는 무감각하다.
한 서울대생의 자살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의 유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생각했다. 그는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가 있었기에 그나마 자신이 ‘살아 있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죽음’ 역시 말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도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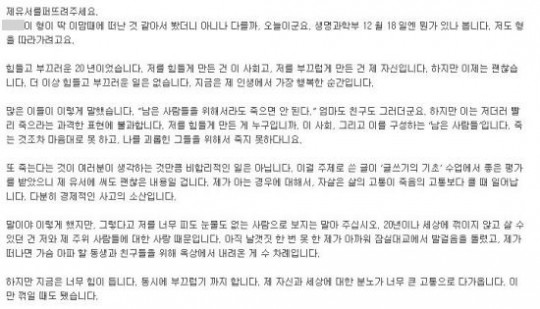
지금까지도 나는 그를 기억한다. 오늘도 소리 없이 죽어간 사람들과 그의 차이가 무엇이어서 내 감정이 차별적으로 반응하는 걸까. 주디스 버틀러가 말한 ‘살아 있어도 살아 있지 못하는’ 비실재화된 폭력에 노출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떠올린다. 애초에 살아 있지 못해서 죽을 수도 없는 삶.
사람뿐 아니라 동물, 자연 등 스스로의 언어를 갖지 못해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존재처럼 애도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을까. ‘애도’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도 정치적으로 선별되어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수긍하게 되었다. 그 많은 죽음은 어디로 갔을까.
애도될 수 없는 삶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폭력과 그들의 공적인 애도 가능성에 대한 금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폭력과 금지는 모두 똑같은 폭력이 모습만 바꿔서 나타난 것은 아닐까? 담론의 금지는 죽음과 삶의 탈인간화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신문이 침묵하는 중에 어떤 사건도, 어떤 상실도 없었다.
-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中
원문: 홍승은님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