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서울 Hi Seoul이 ‘안녕, 서울’이 아니라 ‘서울에 인사하시오’가 될 수 있다고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코리아 헤럴드의 최용식 기자로 그의 저서 <한국영어를 고발한다>를 보면 하이 서울의 문제가 뭔지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목조목 정리하고 있다. 다만 나는 여기서 이미 과거의 브랜드가 된 하이 서울의 총체적 문제점보다는 하이 서울이 ‘서울에 인사하시오’가 되는 문맥적, 상황적 오류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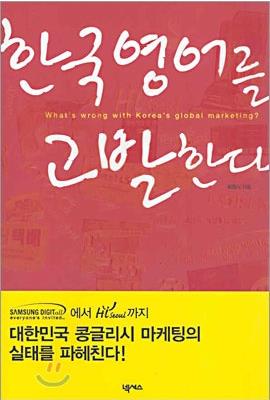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남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르다
‘나는 겸손합니다’라는 문장이 있다. 문법적으로는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뭐야? 자기가 자기 보고 겸손하대. 웃기는 사람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나는 효자입니다’역시 문법적으로는 괜찮은데 자식의 입장으로서 난 효자예요 하고 말하면 좀 웃기는 상황이 된다. 효자인지 아닌지는 부모가 판단하는 게 아닌가?
내가 기업체 강연을 갈 때마다 처음에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너스레 떨 때 자주 쓰는 문구가 있었다. “여러분, 제가 못생겼잖아요.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은 청중 쪽에서 아니에요, 예뻐요! 미인이세요! 가 나오기 마련인데 한번은 “그렇군요. 진짜 영어를 잘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군요.” 라고 말한 남자 사람이 있었다.
너같이 미친 새끼는 어느 부서 소속이십니까? 하고 따져 묻고 싶었으나 꾹 참고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는데 그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래도 요즘은 단순히 예쁜 것보다는 동안이 대세니까 이명현 선생님은 희망이 있네요.” 굳이 이렇게 확인사살까지 하다니…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남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분명 다르다. 같은 주제라도 화자와 청자의 표현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부모는 자기 자식 보고 우리 집 못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이 내 자식 보고 “그 집 못생긴 막내딸 잘 있어요?” 하면 즉시 그 사람은 원수가 된다.
반대로 어떤 정치인이 “여러분, 저는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하면 대박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겠지만 제3자가 나서서 “여러분, 땡땡 후보는 정말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입니다” 해 주면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모여들게 된다. 그래서 홍보 기법 중에 ‘endorser 활용 방안’이라는 게 있다. 뭔가 대단히 전문적인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좋은 이야기를 나 스스로 자랑하기는 민망하니 제3자의 입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남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분 못 해서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 전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인데(아마도 이 아저씨보다는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를 훨씬 더 바르고 고급스럽게 구사할 것이다) 지금도 회자하는 역대 최고급 실수가 1991년 영국 여왕의 백악관 방문 시 자신을 ‘부시 가문의 문제아’라고 소개한 일이다. 본인 스스로 본인을 가문의 문제아라고 소개한 것은 겸손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으나 부시 아저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우리 가문의 문제아는 난데 당신 가문의 문제아는 누구인가요?”
질문을 이렇게 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뭐라고 대답해야 옳은가? ‘우리집 문제아는 찰스 왕세자예요’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앤 공주? 여왕이 뭐라고 했는지는 언론에 알려진 바가 없지만 당시 영부인이었던 바바라 부시 여사가 이 철없는 아들을 호되게 야단쳤다는 비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하이 서울은 대체 누가 하는 말인가
하이 서울은 십 년 넘게 사용했던 슬로건이다. 사실 슬로건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아서 슬로건이라고 부르기에도 참 민망하지만 말이다. 우리는 하이 서울이 너무 익숙해져서 ‘안녕 서울’로 바로 해석하는데 잠깐만 예전 중학교 때 교과서를 한번 떠올려 보자. 교과서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개 1장은 반가운 인사말로 시작해 주신다. “Hi Jane! – 안녕 제인!”이라고 반갑게 인사한다. 그럼 또 “Hi John! – 안녕 존!”이라고 반갑게 인사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이 제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굴까? 자기가 자기 보고 하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한 사람은 존이다. 반대로 ‘하이 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인이다. 인사라는 것은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또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면 하이 서울은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정상인가? 서울이 서울 보고 안녕 서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인사를 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되고 인사를 받는 주체는 서울이 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접해야 하는 호스트 서울이 대접받아야 하는 게스트 외국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거꾸로 게스트인 외국인이 호스트인 서울에게 하는 말이 돼 버린 것이다.
보통은 출발지를 떠나 어느 도착지에 당도하면 환영합니다, 라는 말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웰컴이 아니라 하이라고 하니 왜 내가 할 말을 저쪽에서 하는 거지? Say Hi to Seoul? 인가 하고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하이 서울을 그냥 보면 안 이상할 수도 있는데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이 서울을 보면 정말 이상하다. 어라, 여기는 웰컴이 아니라 하이 서울이네.

영국의 어느 유력 정치인이 ‘한국에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환영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려 그 자리에서 증발해 버리고만 싶었다. 다행히 그는 의전상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진 않고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 같다. 영어로는 헤어질 때 다 같이 Goodbye이라고 해도 한국어로는 안녕히 가세요, 와 안녕히 계세요, 로 나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이 서울의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딜 가나 대접 잘 받고 다니시는, 소위 말해서 ‘높은 분’들이 많았는데 어차피 서울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세계적 명사들 앞에서도 손색이 없어 지려면 하이 서울은 서울에게 걸맞은 슬로건이 아니었다.
결론. 하이 서울을 바꾼 건 정말 잘한 거다. 그게 아이 서울 유여서 문제였던 거지.
원문 : 이명헌의 영어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