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제조기 FM, 야구계에도 감독이 되는 게임이 있다
보통 스포츠게임이라고 하면 유저 본인이 선수가 되어 플레이하는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유형은 비록 유저가 선수는 아니지만 그라운드 위 선수가 된 듯한 흥분과 박진감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면 피파, 위닝일레븐 시리즈 같은 축구게임을 떠올리면 된다. 메시로 헤트트릭을 하고, 이동국으로 월드컵에서 한 경기 다섯골 막 넣고…
이처럼 선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에 맞서 감독의 재미를 선사하는 게임들이 최근 부상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Football Manager (FM)’이라는 악명 높은 축구게임을 비롯해 야구게임 ‘Baseball Mogul’ 등 감독형 게임이 이미 다수 출시되었다. 이를 경험한 국내유저들은 이른바 ‘FM폐인’을 몸소 인증하며 감독형 게임의 중독성을 절감했다. 영국에서는 FM으로 가정에 소홀한 남편이 이혼감으로 인정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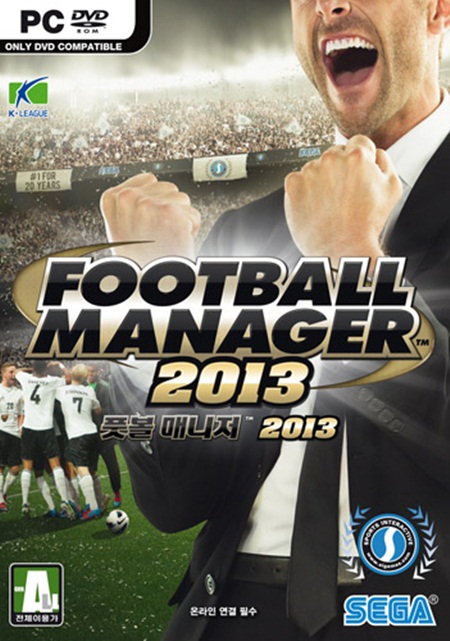
감독이 한 시즌 승패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야구는 축구보다 게임 중 감독의 개입여지가 많다. 마운드에 직접 감독이 올라가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미시적인 작전지시도 많다.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유니폼을 입는 유일한 스포츠가 야구라는 사실은 감독이 그만큼 게임에 개입하는 여지가 많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절대 축구가 야구보다 ‘단순해서 열등한’ 스포츠라는 말이 아님을 독자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야구감독은 종종 신과 같은 능력을 팬들로부터 요구받기도 하는데 그러한 팬들의 요구를 스스로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감독이 되어 팀을 운영하는 야구게임이다. 그 중에서 국내야구를 다루는 ‘프로야구매니저’와 미국 메이저리그를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Baseball Mogul’을 비교해보자. 감독을 비난하고 내가 감독이라면 저것보단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서양을 가리고 다 비슷한가 보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야구를 잘 구현한 게임 프야매
국내 최초 온라인 감독형 야구게임은 2010년 오픈한 게임트리사의 ‘프로야구매니저 (이하 프야매)’다. 카드와 아기자기함이 돋보이는 이 게임은 일본의 향기를 풍긴다. 본질적으로 이게임은 뽑기 게임이다. 무엇을 뽑아? 카드를! 그래서 카드를 잘 뽑으면 이긴다. 잘 뽑는 방법은? 많이 뽑으면 된다! 어차피 무작위 확률로 나오는 카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많이 뽑으려면? 게임머니가 많으면 된다! 게임머니가 많으려면? 현질이 제일 빠르고 효과적이다.
맞다. 이 게임의 왕도는 현질이다. 온라인 기반의 게임에서 다른 유저들과 경쟁을 하려면 자기의 라인업이 경쟁자들의 라인업보다 좋은 선수들로 꾸려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높은 가치가 책정된 카드를 획득해야 하고, 그러려면 많이 뽑아서 확률을 높여야 한다. 많이 뽑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즉, 돈이 실력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의 냄새를 풀풀 풍긴다. 야구가 가장 자본주의화된 스포츠라 불린다는 점에서 실제 야구를 잘 구현했다고 볼 수도 있다(…)
전력을 구성하는 것이 카드이고 이 카드가 운에 따라 나오다 보니 전적으로 이 게임의 전력은 운에 따른다. 운이라는 것을 확률의 문제로 봤을 때, 그 미미한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것이 돈이다. 사실, 실제 스포츠에서도 돈 없으면 힘들긴 하니까 역시 야구계를 잘 구현한 거라 볼 수도(…)
이렇다보니 이 게임은 유저가 ‘감독’이 되는 건지 ‘구단주’가 되는 건지 다소 헷갈리기 시작한다. 실제로 프야매 게임 내에는 ‘감독카드’라는 아이템을 설정할 수 있다. 감독의 성향을 설정해 놓는 것인데 이는 구단주 입장에서 감독을 선택한다는 늬앙스를 준다. 더군다나 돈을 벌어서 카드를 뽑는 데 게임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유저는 더욱 더 ‘감독’보다는 ‘구단주’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물론 현질 없이도 게임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질을 한 유저와의 차이는 극단적이다. “난 현질러가 아니야!” 라는 고고함은 지킬 수 있겠지만 0-15라는 스코어로 안드로메다로 보내지는 자신의 팀을 볼 때마다 현질의 유혹은 찾아온다. 고고함 따위 승리의 쾌감에 비할 바가 아니니까.

현실성 없는 프야매 카드, 바티스타 = 주키치?
카드 뽑는 재미로 인기를 끌었던 프야매는 최근 유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바로 선수 평가의 불공정함 때문이다. 2012년 선수들의 성적을 토대로 가치를 매겼는데 그 결과가 가히 어이의 상실 수준을 넘어섰다. 압도적인 최하위팀 한화 이글스의 선수들이 대표적이다. 고동진, 이대수, 최진행 등이 부여받은 가치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단적인 비교로 KIA의 유격수 김선빈의 수비력이 74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시즌 내내 이해하기 힘든 4차원 수비를 선보인 이대수의 수비력은 73이다. 강정호의 수비력 수치도 77, 김상수도 74다. 과연 이대수가 지난 시즌 김상수와 비슷한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까?
최진행의 경우도 마찬가지. 타격의 경우 타율, 타점, 홈런 등 객관적 수치로 표현이 가능하기에 항목별 능력에는 이견의 소지가 적다. 하지만 그 선수의 가치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코스트’란 항목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정도다. 작년 시즌 코스트에서 8성 (1에서 10성까지의 카드가 있으며 수치가 높을 수록 좋은 카드다.)을 얻은 선수는 손아섭, 정근우, 김현수, 박종윤, 강민호, 박한이, 진갑용 등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중 몇몇에게 8성이라는 가치는 과분해 보인다. 박종윤과 최진행이 이 선수들과 같은 레벨로 평가할만한 활약을 했는가. 정말 의문이 든다.
이는 단일 년도 팀 선수들을 다 모았을 때 능력치를 신장시켜 주는 게임의 기능을 쉽게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 구단에 높은 코스트의 선수가 없을 경우 팀덱 버프를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저들간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물론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선수들의 코스트를 안배한다면 소탐대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프야매 운영진은 머리가 좀 나쁜 것 같다. 4승 6패 8세이브를 기록한 한 투수가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9코스트를 부여받았다. 누구일까. 한화의 흑형 바티스타다. 정말 바티스타가 주키치, 니퍼트와 동급의 활약을 펼친 외국인 선수라고 볼 수 있을까.

야구계의 FM, 모굴 베이스볼의 위용
물론 FM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Baseball Mogul (이하 모굴)’은 프야매와는 확실히 차이가 크다. 우선 이 게임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진행에도 카드라는 요소가 없다. 역대 팀 가운데 한 팀 혹은 가상의 팀을 선택해 진행한다. 물론 선수는 모두 세팅이 완료된 상태다. 예를 들면 1998년 LA 다저스의 멤버를 고대로 갖고 와서 컴퓨터의 인공지능을 상대로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다. 코스트의 개념은 없다.
다만 지난해 성적을 기반으로 각각의 능력치를 숫자로 표현해놨다. 그리고 그 능력치도 매우 세분화 되어 있어서 하나 하나 따져보고 기용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루 능력에 first to third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1루 주자가 우전 안타 때 3루까지 내달리는 능력을 일컫는데 이런 것까지 능력치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다.
물론 모굴에서도 돈이 중요하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유저가 직접 소액결제하는 돈은 아니다. 구단의 재정과 유저가 설정한 게임 난이도에 따라 사용가능한 자금이 주어진다. 이를 팜시스템 구축, 스카우트 활동, 의료비용 등 여러 항목에 활용할 수 있다. 웃돈을 얹어주고 단행하는 트레이드에 보탤 수도 있고, 기존 선수들과의 계약연장에 사용할 수도 있다. 프야매가 실제의 돈으로 선수를 뽑는 게임이라면 모굴은 가상의 돈으로 팀을 운영하는 게임이다. 아! 이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데 실제 돈이 든다. 근데 다들 어둠의 경로를 통해 내려 받아서 플레이할테니(…)

의미는 다소 다르지만 모굴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도 역시 돈이다. 선수들에게 일일이 작전을 내려서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것도 재미있지만 프런트가 제공하는 예산에 따라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인지를 본인이 정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팜시스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화수분 야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FA로 검증된 선수를 폭풍영입하며 야구계의 QPR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컴퓨터의 인공지능을 상대로 한다는 점이 흥미를 반감시키긴 하지만 FM이 악마의 게임이 된 이유도 온라인 게임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외려 차분하게 스스로가 정말 감독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지며 플레이 할 수 있는 집중도와 전문성을 배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너무 프야매를 까기만 했나 싶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기반 게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온라인 게임도 돈이라는 요소를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다. 현질을 비난할 이유도 없다. 다만 게임 내 선수 구성 자체가 다소 불균형하며 납득할 수 없는 구석이 많다. 두 게임을 놓고 고민하는 유저가 있다면 두 게임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말하고 싶다. ‘카드 뽑는 재미’와 ‘함께 하는 재미’를 원한다면 프야매를, ‘미국에 진출한 김성근’, ‘나만의 머니볼’을 꿈꾼다면 모굴을 추천한다. 이 게임 때문에 폐인이 됐다는 원망은 하지 마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