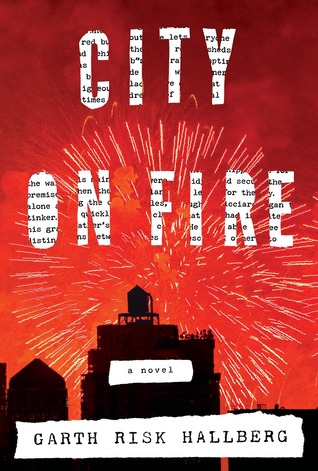※ 이 글은 뉴욕타임즈의 「Why Can’t We Stop Talking About New York in the Late 1970s?」를 번역한 글입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뉴욕은 그 당시를 살아보지 못한 이들조차 향수를 느끼게끔 합니다. 그때는 뉴욕이 한창 위험하던 시절, 여자들은 가방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넣고 다니고 남자들조차 택시에서 내려 문으로 들어갈 때까지 맘을 놓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발란신이 명성의 정점에 다다랐고 뉴욕 주립 극장이 도시의 지적 살롱 노릇을 하며 존 레논이 샐린저를 읽는 광신자에게 살해당하던 시절, 필립 로스는 유명하고 돈 드릴로는 무명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미국 문화에서도 고급 문화와 하위 문화가 한데 뒤엉켜 있던 마지막 시절이었고, 작가와 화가와 배우들은 ‘예술에 몸 바친 순교자’가 되길 바라던 시절이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어 이삼 년은 우려먹을 수 있을 책을 출판 취소하거나, 뉴욕의 시인들이 자신의 ‘예술적인’ 친구들에게 헐리우드 감독을 소개시켜 주길 꺼리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최근 들어 1977년부터 1982년 사이의 5년이 여러 소설이나 영화,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레이첼 쿠슈너의 2013년 소설인 <화염방사기(The Flamethrowers)>에서는 소호의 예술시장을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는 여주인공이 등장하며, 가스 리스크 할버그의 출간 예정인 소설 <시티 온 파이어(City on Fire)> 역시 비슷한 시기의 뉴욕을 배경으로 합니다. 또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두 편의 텔레비전 시리즈가 준비 중입니다. 하나는 마틴 스콜세지가 메가폰을 잡고 믹 재거와 함께 각본을 맡았고, 다른 하나는 바즈 루어만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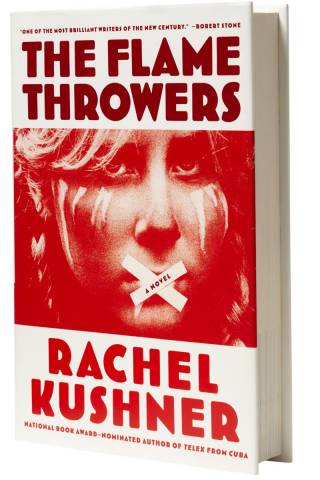
이들 작품들은, 상황은 더 나빴으되 더 ‘민주적’이었던 시절의 뉴욕에 대한 갈망을 뿜어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동일한 비극과 동일한 자유에 묶여 있었던 때, 돈조차 그 주인을 보호하지 못하던 때 말입니다. 존 워터스는 말했습니다.
“뉴욕이 한때 위험했다는 게 전혀 믿기지 않는군요. 예술에 몸담은 싸움꾼들은 자기네가 사는 도시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길 바랄까요? 누가 안전한 맨하탄의 거리에 대해 글을 쓴단 말입니까? 공기가 온갖 위험스런 가능성을 품는 때는 언제나 폭풍 전야인 법이죠.”
당시의 문화계는 지금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화가는 음악가를 알고 음악가는 작가를 알고 모두가 한데 연결되어 있었죠. 프란 레보비츠의 말에 따르면, 앤디 워홀의 인터뷰를 읽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다 알 정도였고, 이 작은 세상은 미국의 음악과 회화와 시와 유희 전반에 걸쳐 영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트빌리지를 거점으로 하여 곤조 저널리즘과 펑크의 탄생 등 다양한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던 시절이었죠. 70년대 중반 파크 18번가에 위치한 맥스 캔자스 시티는 블론디와 클라우드 노미와 시드 비셔스가 몸담은 곳이었으며 패티 스미스를 비롯한 많은 밴드가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시는 모더니즘과 1960년대의 급진주의가 마지막 숨을 내쉬던 시대였습니다. 미학에서는 엘리트주의가, 정치에서는 유토피아주의, 사회주의와 금을 긋는 평등주의가 모순적인 공존을 이루던 때였습니다. 그 뉴욕을 대표하는 거물을 꼽아본다면 수잔 손탁, 재스퍼 존스, 조지 발란신, 로버트 윌슨, 로버트 매플스롭, 존 애쉬버리 등 여러 문화계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뉴욕 리뷰 오브 북스의 편집자인 바바라 엡스타인과 로버트 실버스, 크노프의 편집자인 밥 고틀립 등도 빼놓을 수 없죠. 몇몇은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었지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급진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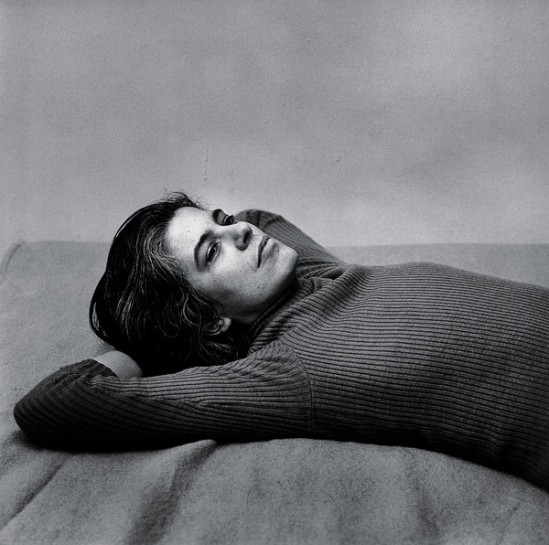
당시는 집세가 충분히 저렴하던 시대였습니다. 작가며 가수, 춤꾼 지망생들이 맨하탄의 이스트(안되면 웨스트) 빌리지에 세들어 살 수 있었고, 한번 밀려난 사람들이 또 다시 부쉬윅이나 호보켄으로 쥐어짜듯 밀려나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비록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더라도 얼굴을 마주치는 건 도시에 활기를 북돋아줬고, 생각을 나누고 자극을 받는 데 중요했습니다. 70년대는 온갖 종류의 창의적 인물들이 별다른 계획 없이 만나 서로에게 팁을 주고 이론이나 예술시장이나 현재의 흐름에 대해 토론하곤 하던 때였습니다.
에이즈를 모르던 시대, 스튜디오 54와 마인샤프트의 전성기, 게이들은 유행을 선도하고 취향을 만드는 이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랭크 리치는 1987년 에스콰이어에 기고한 회상에서 ‘미국의 호모섹슈얼화’를 되새깁니다. 그러나 1981년에 창궐한 에이즈가 풍경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으며 눈부신 육체를 자랑하던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검은 점으로 뒤덮인 아우슈비츠의 해골로 돌변했죠. 이제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혹은 ‘게이의 삶을 평범한 무언가로 전락’시키면서, 70년대 풍의 퀴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력적으로 비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매혹적이라 느꼈습니다.” 이는 흡사 게이로서의 삶에 대한 낭만적 시점이 다시 되돌아온 듯합니다.

그러하던 나날은, 그 시절은, 가버렸습니다. 누군가 “폐허 속의 사랑”이라 부를 법한, 무명의 젊은이들이 명성을 얻거나 적어도 명성에 손이라도 뻗어볼 수 있었던 시절 말입니다. 발밑을 스치고 지나가는 시궁쥐 떼나 대낮 한복판의 분주한 크리스토퍼 거리에서 벌어지는 노상강도 같은 것도 개의치 않는다면 말이죠.
그때의 섬세한 생태계는 이제 돌이킬 길 없이 망가졌습니다. 여전히, 눈부시게 똑똑한 사람들이 돌아다니죠. 뉴욕 식당가의 식탁을 스쳐간다면 네 번 중 세 번 정도는 대화에 끼어들고 싶어질 겁니다. 이 도시에서 만나는 사람의 절반은 어디든 다른 도시에서 인터뷰를 하든지 체포당하든지 하겠죠.
그러나, 뉴욕 문예사조를 대표하는 시인들과 50년대를 밝힌 추상표현 화가들과 세계 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건너온 망명자들이 일으킨, 뉴욕을 스쳐갔던 흐름으로서의 문화적 불꽃은 이제 꺼져버린 듯합니다. 개개인의 빛이 아직 이곳저곳 흩어져 명멸하고 있음에도. 오직 행복한 몇몇만이, 그런 활력을 위해서라면 위험과 가난과 도처에 널린 추악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고 말하겠지요.
원문: 뉴스 페퍼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