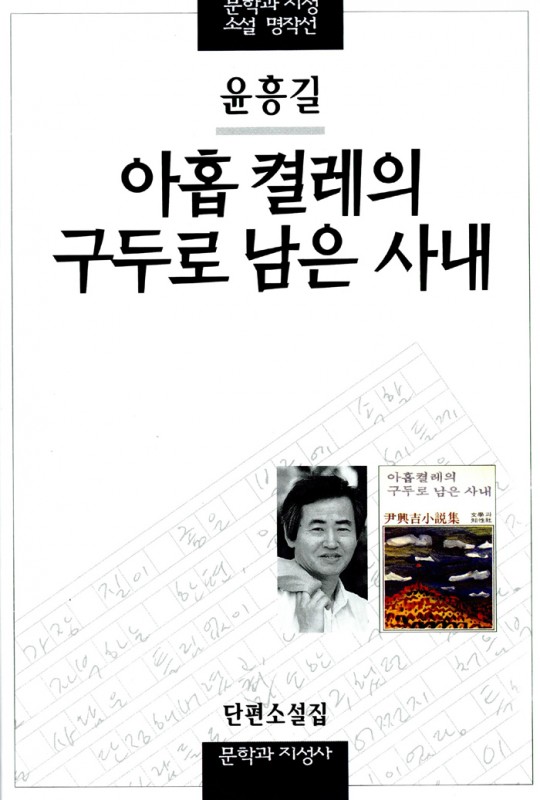여기서 광주는 빛고을의 광주가 아니다. 넓을 광 자 광주다. 즉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를 의미한다. 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 땅에서 그 서슬 퍼렇던 박정희 정권도 (일단은) 두 손을 든 심각한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친숙한 용어로는 ‘광주대단지 폭동 사건’이라 한다.
(경기도) 광주대단지 폭동 사건
이 봉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뒤로 미루고, 봉기 와중에 벌어진 일 하나를 먼저 소개해 보자.
몽둥이와 최루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참외를 실은 삼륜차 하나가 뒤집어지고 참외가 길거리에 나뒹굴었다. 그러자 군중들은 일제히 진흙 범벅이 된 참외에 달려들었다. 참외 한 차 분량이 금새 동이 났다. 우걱우걱, 어적어적… 어떤 소녀는 “배고파요, 배고파요”를 울부짖으며 몽둥이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참외로도 성이 안 찰 만큼 몇 끼를 굶은 사람들은 많았다. 이 장면은 윤흥길의 소설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실감나게 재현된다.
왜 그들은 그렇게 배가 고팠던가. 왜 소녀가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상황에 내몰려야 했던가. 그들은 대개 용두동, 마장동 이하 청계천변에 판잣집을 짓고 살던 철거민들이었다. 서울시는 청계천 일대의 판잣집 23만 가구 약 127만 명을 강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봉기한 사람들은 그 계획에 따라 옮겨진 산물이었다. 군용 트럭으로 실어날라진 그들은 전기, 전화, 통신 시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가려면 버스로 2시간이 걸리고 그 버스의 배차간격은 2시간인 곳에 처박혔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딱지’만 있으면 무허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20평 정도의 땅을 얻을 수 있다는. 1971년 건설 경기가 하늘에 닿을 무렵, 광주대단지의 유보지 입찰 가격은 평당 20만 9천원, 당시 도심이었던 종로구의 땅값 수준이었다.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 하는 희망 또한 하늘을 뚫었다. 그러나 그걸 그대로 놔둘 대한민국의 관료와 지배층이 아니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관청은 연달아 ‘딱지 전매금지 처분’을 내렸고 3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라던 약속은 사라지고 ‘일시불로만 상환하라’는 난데없는 결정만 하달한다.
희망은 사라졌다. 삶의 터전을 잃고 옮겨와 일자리 잡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장밋빛이던 미래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배고픈 임산부가 자기 애를 삶아먹었다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사람들은 심하게 굶주리고 있었다. 서울시장이라도 불러와서 살 길을 찾아야했다. 수없는 진정이 이뤄졌고, 서울시장과의 면담이 약속됐다. 하지만 약속한 날, 서울시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분노는 폭발한다. 광주대단지 폭동의 시작이었다.

당시 서울시의 생각은 이랬다. “대단지에 인구 10만 명 이상을 모아놓으면 어떻게든 뜯어먹고 살 것이다.” 즉 삶의 터전이고 뭐고 알아서 인간들은 알아서 살게 마련이란 것이다. 서울시로서는 주거지를 제공했으면 됐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게으른 것들의 욕심이었다. 이미 딱지를 팔아버린 것들이나 딱지값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들이 무작정 버티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빨갱이들이나 할 짓이었다. 박정희가 폭동 이후 “주동자 엄벌”을 각별히 지시했던 건 그런 믿음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식칼, 몽둥이를 들고 나섰던 이 광주대단지 봉기는 박정희 정권을 일단 굴복시킨다. 주민들의 요구를 서울시가 일단 수용하고 나선 것이다. 나타나지 않던 서울시장은 최소한의 구호 양곡 확보, 생활보호 자금, 도로 포장, 공장 건설 세금 비과세 면제 등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 이상은 나아갈 수도 없는 자연발생적인 봉기였지만 그 위력은 박정희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물론 시간이 지난 후 앞서 말한대로 주동자는 엄단됐고, 고문의 희생양이 되어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짓을 했다”고 자백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4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재개발’ 관행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지만 멀쩡히 터전 잡고 살던 사람들을 내몰고 그 위에 새 집을 짓고 빌딩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관행은 변함이 없다.
권리금 따위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건 너 좋으라고 한 일이니 보상할 필요 없고, 그저 이것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여전하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만큼 했으면 국가의 의무는 다했으니 그 이후는 내 알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10만 명 풀어놓으면 알아서 먹고 산다”던 서울시의 입장은 면면히 계속되고 있다.
이 슬픈 8월 10일에는 이런 구절이나 곱씹을밖에.
“도쿄의 도시계획 120년의 역사에는 항상 상식이 통하고 있었다. 권력의 나무도 없었고 정치 자금의 창출도 없었으며 이권의 개입도 없었다. 개인의 재산권이 무참히 짓밟히거나 탈취되는 사건도 없었다. 하물며 도시계획을 통해서 재벌이 탄생하거나 육성되는 일도 없었다. 그쪽의 도시계획을 ‘바람기가 전혀 없는 날의 남해 바다’로 비유한다면 이쪽의 도시계획은 ‘태풍을 맞은 목포 앞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원문: 산하의 오역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