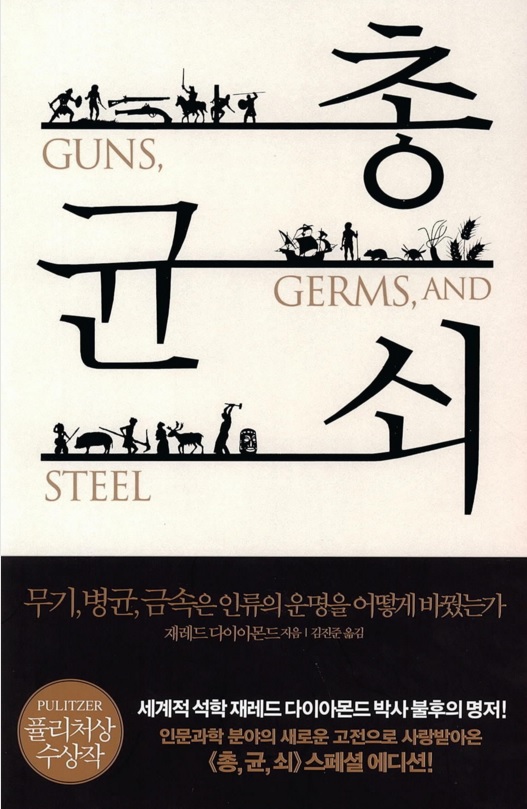‘심플’.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 중 하나다. 애플은 아이폰을 위시해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잡스는 자신의 ‘만트라’가 ‘집중’과 ‘심플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림의 원형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지운 마크 로스코의 심플한 그림을 사랑했다.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사랑한 래퍼 빈지노는 마크 로스코를 주제로 삼은 윤종신의 곡 ‘The Color’에 피처링했다. 여기서 빈지노는 랩으로 심플함의 가치에 대해 말한다. 현대사회의 창작자들은 심플함을 사랑한다.
디자이너가 심플함을 추구한다? 좋다. 그렇다면 심플함은 어떤 상태인가? 이에 관해 UX 매거진이 두 가지 의견을 소개했다.
첫 번째 의견,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가 심플함이다.”
양이 적은 것이 심플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도 분명하지는 않다. ‘더 이상 뺄 수 있는 상태’가 대체 어떤 상태란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빠져 있다.
두 번째 의견, “사용자가 쓰기 가장 좋은 상태가 심플함이다.”
디자인적 요소보다 실용성이 중요하다는 노던 웨스턴 대학교 도날드 로먼 컴퓨터 공학 교수의 주장이다. 깔끔한 디자인적 상태를 심플함이라고 한다면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디자인의 목적은 그 자체의 보기 좋음보다는 제품을 잘 쓸 수 있도록 소비자를 돕는 것이다. 만약 심플함이 디자인적 상태가 된다면, ‘엘레강스한’ ‘시크한’ 등 디자인 업계의 의미 없는 단어가 돼버린다.

심플함의 목적이 ‘사용자 만족’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 많은 것이 해결된다. 심플함은 ‘알기 쉽다’이지 ‘요소의 양이 적다’가 아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UX 매거진은 심플함의 상징인 아이폰도 디자인적으로 보면 필요 없는 요소가 많다고 피력한다. 조금 요소가 많은 상태가 더 알기 쉽다면 그것을 택한다. 결국, 심플함은 주관적이며 상황마다 다르다. 고객을 관찰하며 끊임없이 가장 알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야만 심플할 수 있다.
거대 담론을 만드는 지식인들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세상 모든 것을 논파하길 좋아한다. 대표적으로 진화론으로 세계 문명을 설명한 ‘총, 균, 쇠’나 계급 투쟁으로 인류 역사를 설명한 ‘자본론’이 있다. 이런 거대 담론은 사람들에게 쾌감을 가져다준다. 세상의 이치를 발견한 듯 우쭐해 한다. 하지만 그 어떤 단일 아이디어도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하려면 세상의 리액션을 받아들여야 한다. 리액션을 받아 수정하면서 그 상황에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언제나 최선의 상태는 상황에 따라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심플’ 또한 마찬가지다.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심플해지는 비결이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외교 관계던, 기업 간 협상이건, 타인을 위한 제품 디자인이든 이것이 핵심이다. – 도널드 로만 박사.
원문: 김은우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