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는 독특한 언론이다. 우선 일간지가 아닌 주간지다. 기사에는 기자의 이름도 없다. 오로지 조직으로써 ‘이코노미스트’라는 자존심으로 유지하는 언론이다. 주간지다 보니 가장 권위 있고 깊은 기사로 정평이 나 있다. 특이한 점은 광고 수익보다 프리미엄 유저의 구독료 모델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에디터를 뽑았다. 주간지와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매일 뉴스를 제공하는 ‘에스프레소’라는 유료 뉴스 앱을 성공적으로 런칭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수익률에도 매각을 앞두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수석 편집장이자 이코노미스트의 디지털 전략을 주관하는 Tom Standage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이코노미스트의 디지털 전략
1. 현재 이코노미스트의 상태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이것만 보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기분을 판다. 정보 과잉에 대한 해독제를 파는 셈이다. 이는 주간지뿐만 아니라 신규 런칭한 ‘에스프레소’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다른 어떤 정보도 필요치 않도록 기사를 준비한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아웃링크를 걸지 않는다. 트래픽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기사를 봐야 사안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2.이코노미스트가 여타 언론과 다른 점
특히 신진 언론 기업들과 그들에게 투자하는 VC들은 새로운 언론이 it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내 견해로는 그렇지 않다. 뉴스 산업은 뉴스 산업일 뿐이다. 그들 대부분은 야후 등의 포털이 자신들을 인수하기를 바랄 뿐이다. 지속가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예외는 있다. 버즈피드와 바이스가 그렇다. 하지만 이들은 내가 보기에는 언론사가 아니다. 광고 회사가 미디어로 변장하여 브랜드를 쌓는 것일 뿐이다.
많은 언론사들이 페이스북, 스냅챗 등의 다른 플랫폼에서 수익을 내려 한다. 하지만 다른 플랫폼에 기사를 주면서 수익을 낼 수는 없다. 다른 플랫폼은 인지도를 올리는 데만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래서 다른 플랫폼에 진출하지 않는다.
3.이코노미스트가 원하는 미래

우리의 주 수입원은 언제나 독자에게서 나온다. 더 정확하게는 유료 구독비다. 인터넷은 구독자 수를 늘리기에 좋다. 아무래도 종이 주간지보다는 인터넷으로 일본판, 혹은 중국판 이코노미스트를 만들기가 쉽다.
종이든 인터넷이든 하나의 매체일 뿐이다. 우리의 목적은 독자가 우리의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내고 기사를 보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잡지든 인터넷 유료구독이든 방식은 상관 없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디지털 뉴스를 종이 뉴스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한다. 심지어 매일 제공되는 에스프레소 어플의 기사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자들이 기사를 쓴다. 주간회의 때 주간지와 디지털 뉴스를 같이 회의한다. 그리고 기자들의 성과 평가도 인터넷 기사와 종이 기사를 동등하게 평가한다. 매체는 다르지만 동일한 ‘이코노미스트’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국 언론의 경우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는 미국보다 혁신적이다.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스트리밍 음악이 대세가 되었던 것이 좋은 예다. 뉴스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챗 등은 이제야 자신의 플랫폼 안에 뉴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미 네이버 뉴스는 한국의 뉴스시장을 접수한 지 오래인데 말이다.
그에 반해 한국 언론은 어떤가? 한국 언론의 미디어 전략은 해외보다 뒤떨어져 있다. 인터뷰에서 보듯,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넷 기술에 선도적인 혁신 미디어 기업이 아니다. 1843년에 창간되어, 마르크스가 생전에 ‘자본주의의 수호자’라며 비판했을 정도로 유서 깊은 기성 언론이다. 버즈피드 등 뉴미디어를 광고회사라고 격하할 정도다. 인터넷 기업 창업자가 사주인 워싱턴 포스트나, 버즈피드 출신을 미디어팀 핵심 인재로 기용하는 뉴욕 타임즈와는 다르다.
그런 이코노미스트조차 한국의 기성 언론보다 혁신적이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디지털 뉴스팀과 기성 언론팀이 동등하다. 같은 인재들이 회의에서 같은 비중으로 디지털 뉴스와 지면 뉴스를 논의한다. 기자 성과 측정도 디지털 뉴스와 지면 뉴스를 같이 측정한다. 한국의 언론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언론사의 인터넷 팀은 따로 떨어져서 각자도생을 요구받는다. 지원은 물론 부족하다. 발언권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종이 지면과 같은 가치를 디지털로 제공하려는 의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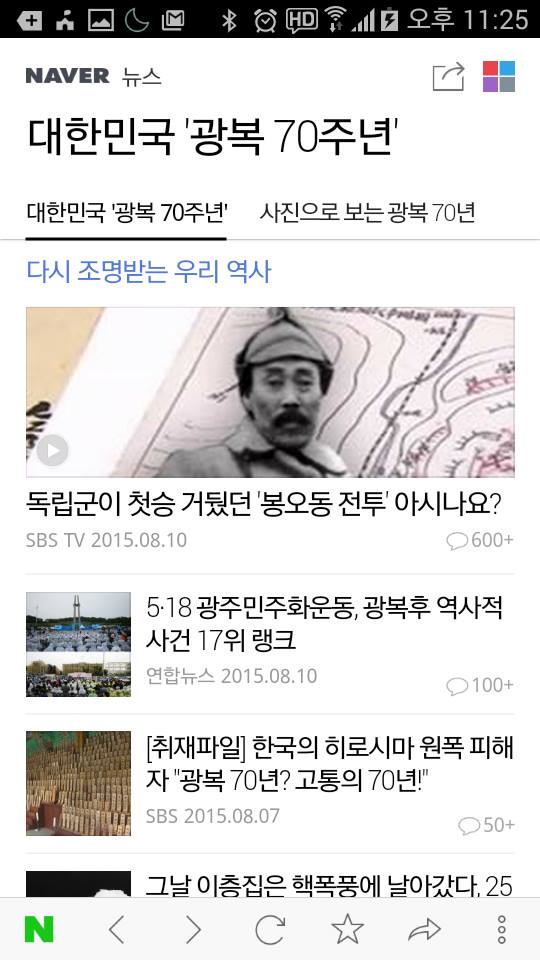
한국의 특징은 전통과 최신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게 기술을 받아들이는 청년층과 농경, 산업화 시대의 가치를 고스란히 유지하는 노년층이 공존하는 사회다. 그에 반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여타 경제 선진국은 이미 60년대에 섹스 혁명, 락앤롤 혁명, 히피 혁명 등을 거쳤다.
지금의 기성 언론들은 종이 신문과 지상파 뉴스를 보는 기성세대 상대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20~30대는 아무도 종이로 신문을 보거나, TV로 제시간에 뉴스를 보지 않는다. 이들이 나이가 든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사라질 때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의 뒤처진 기성 언론은 그 어떤 나라보다 미디어 장악을 완벽하게 끝낸 디지털 플랫폼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원문: 김은우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