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나 사기꾼은 번지르르한 말뿐이고, 프로는 명쾌한 문서로 말한다
나는 아들만 둘을 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물어오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생활에 대한 궁금함이 늘어나는가 보다. 도대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냐는 질문…그렇다. 당신은 종일토록 책상에 앉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장생활의 대부분은 보고서, 품의서, 기획서, 제안서를 쓰면서 지나간다. 회의나 보고처럼 얼굴을 마주대고 하는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다. 그 외 대부분의 시간은?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으리라. 모니터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거나 문서를 쓰고 읽고 있을 터이다. 하긴, 회의에는 회의록이 따라 붙고 보고에는 보고서가 들어가 있으며,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역시 뭔가 문서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다. 회사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결국 문서 만들기로 귀결된다.
그렇다고 이런 문서에 딱히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제도를 건의하는 품의서는 내용상 기획서이기도 하고 형식상 보고서이기도 하며, 기업 내부 고객에 대한 제안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형식적 구분이 아니라 글로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것이다.
‘문서력’이 곧 기획력이다
일본인들은 창의력, 의지력과 같은 형태로 ‘문서력’이란 말을 쓴다. 추상명사가 아닌 ‘문서’라는 일반명사에 ‘력(力)’을 붙여서 쓰는 걸 보면, 참 조악한 조어력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문서작성 능력’이라는 말보다는 간결하기도 하고 힘있게 들린다. 그래서 나도 곧잘 따라 쓴다.
문서력을 기획력과 다른 뜻으로 쓴다면, 문서력을 다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보기 좋고 알기 쉽게 만드는 문서 ‘편집력’으로 정의하여 쓰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임원이 아닌 (사원~부장 사이) 실무자의 경우라면 자기 기획은 자기가 직접 문서화 할 것이다. 적어도 문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예외적으로 기획과 문서작성을 나누는 사람도 있다. 예전 직장에 ‘빨간펜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한참 일할 차장 시절에도 자기 문서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 뭐 대단한 문서도 아니었는데, 꼭 장황하게 구술(!)을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문서화 해오라고 지시를 했다.
한번은 자기 혼자서 참석한 외부 회의 내용을 이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니 ‘회의록’을 써오라는 것 아닌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말이다. 외국에 주재를 나갔을 때는, 현지인들이 들어주지 않아서인지 영어 실력이 딸려서인지, 본사에 전화를 해서 실무자들에게 문서 만들어 보내라고 달달 볶아대던 기억이 난다.
이 사람이 ‘빨간펜 선생님’이라 불렸던 건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어떤 문서를 만들어 이메일로 보고하면 그걸 일일이 다 출력한 다음, 종이 위에 빨간펜으로 수정 사항을 써준다. 손글씨가 아름답지도 않아서 보고자가 되묻는 과정까지 따져보면, 팀 차원에서는 시간과 노력이 배 이상 든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문서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간 파워포인트 파일이다. 아시겠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각각 나뉘어 나타나는 그림과 글씨가, 출력을 하면 한군데 겹쳐져 나타난다. 입체를 평면화 하는 이 기능을 ‘빨간펜 선생님’을 무척 싫어했었다. (당시 상무는 파워포인트 파일도 직접 고쳐서 보내곤 했는데, 어떻게 차장이 이러고 있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이 사람은 문서만 만들지 못했을 뿐 뛰어난 기획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는 사람을 보진 못했다. 왜냐하면 문서의 작성과 기획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디어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완결한 다음 문서에 옮기는 사람은 천재뿐이다. 우리 같은 범재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종이 위에 옮겨 적고, 그림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밝히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자체가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문서력이 곧 기획력이다.
천재의 문서 작성법 비결
전방 사단 사령부 작전처에서 막내 장교로 군생활 하면서 천재에 가까운 분을 모신 적이 있다. 전군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문서작성과 브리핑 실력으로 위관장교 시절부터 참모총장감이라는 소릴 듣던 분인데, 그 진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아마 김일성이 죽은 해였던가. 하루하루 조용할 날이 없던 시절, 대전에 있는 육군본부에서 불시 검열단이 새벽에 우리 사단을 향해서 출발했다. 불시(不時)니까 검열단이나 검열받는 부대나 어느 부대가 검열 대상인지 미리 알 수가 없다. 새벽에 참모총장의 낙점을 받은 대상 부대를 확인한 검열관들이 출발 전에 미리 전화 한통 걸어주는 따뜻한 예의가 있을 뿐이었다.
깡 새벽에 비상 소집된 사단 참모부가 우왕좌왕 하는 사이, 단호한 얼굴로 집무실에 앉은 작전참모는 담담하게 이면지를 채워 나갔다. 당시에는 장교들이 직접 문서를 타이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B4지 이면지에다 연필로 초안을 잡아서 워드병에게 넘겨주면 그 분량이 그대로 A4지에 출력되어 나왔다. 부대의 일반현황에서부터 당시 계속 변경, 발전되고 있던 사단작전계획상 정보, 작전, 인사, 군수 분야의 주요 이슈별 미비점, 사단의 조치사항, 개선 방안 및 상급부대에 대한 요청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작전참모가 한 페이지씩 작성한 초안에 혹시 내가 채울 사항이 있으면 채워서 워드병에게 넘겼다. 당시 워드병들은 컴컴한 보안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번 넘겨주면 문서화 해서 나오기 전에는 앞서 보낸 문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작전참모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적어 넘긴 앞 페이지를 보자고 하지 않으면서도 문서에 매기는 번호와 글머리표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지우개도 거의 쓰지 않았다. 단어는 적확했고 문장은 명료했다. 마치 외워서 답안지를 쓰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완성한 수검표는 무려 40페이지가 넘었다. 단 몇 시간만에 40페이지가 넘는 문서가 뚝딱 만들어진 것이다.
사단 사령부에 도착한 검열단이 사단장실에서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자리에 작전참모가 수검표를 내놨다. 눈이 똥그래진 검열단장은 어디서 정보가 사전에 샜느냐고 뒤돌아 서서 검열단에게 그 똥그래진 눈을 부라렸다. 자기도 몇 시간 전에야 검열 대상이 결정되었다는 걸 알면서… 내색은 못했지만 사단장도 놀라는 눈치였다. 자기 부하지만 ‘뭐 이런 괴물이 다 있지?’하는 눈빛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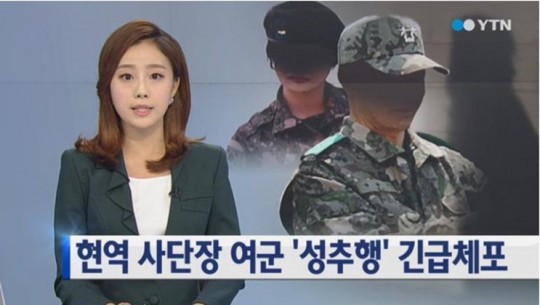
군대에도 천재가 있구나 하는 생각, 그 때 처음으로 해봤다. 우선, 작전참모가 선임 참모이기는 하지만 작전 외에도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 사단 현황을 두루 꿰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아마, 당시 다른 참모에게 자기 분야에 대해 각각 작성하라고 했어도 그 짧은 시간에 절대 그렇게 써내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걸 일필휘지로 써내려 갈 때 보여준 한치 빈틈도 없는 논리 전개, 내용에 맞는 구성의 선택, 아이디어를 곧바로 표현하는 문장력은 지금까지도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최상의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당시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작전참모는 참모장과 사단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검열단 앞에게 소신있게 자기가 만든 수검표를 내밀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상사들의 의도와 견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사석에서 그때 일에 대해 물어봤다. 비결이 따로 없단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살았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다. 그분이 늘 얘기하던 군인의 충성심이란 이런 것이구나 할 뿐이었다.
원문: 개발마케팅연구소
※ 「프로는 문서로 말한다 ②」에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