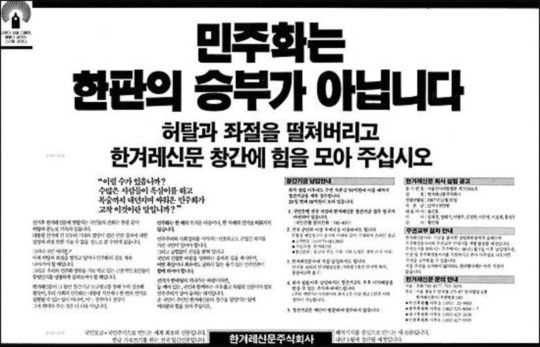1988년 5월 15일 한겨레 신문 창간
대학 신입생 시절 부산에 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그닥 좋은 점이 못되었다. 대학생이 됐답시고 전국을 헤매고 다니던 대학 친구들의 여행 종착지가 대개 부산이었고 나는 손님 치르다가 여름 방학을 다 보냈으니까. 그중에 지금은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광주 친구가 하나 있었다. 이 녀석이 부산을 떠나던 날 터미널에서 조금 낭패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신문이나 하나 사야 쓰겄다.”라는 말을 남기고 매점으로 간 녀석이 주인과 말을 꽤 오래 섞는 걸 보고 뭘 하나 싶어 다가갔더니 약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녀석의 말인즉슨 이랬다. “한겨레가 왜 없어요? 그것이 진짜배기 신문인디.” 87년 대선으로 전라도 김대중에 대한 감정이 가시지 않은 도시에서 전라도 말 징하게 써 가면서 한겨레를 찾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기에 녀석을 억지로 끌고 나오긴 했는데 나오면서도 녀석은 소리를 질렀다. “한겨레 신문 꼭 갖다 노씨요 아저씨.”
그 녀석이 원하던 ‘진짜배기 신문’ 한겨레 신문은 1988년 5월 15일에 태어났다. 그 창간호를 주워들던 순간의 느낌은 지금도 첫 미팅 나가던 숙대 앞 정경처럼 눈에 선하다. 백두산 천지 위에 판화 같은 글씨로 쓰여진 한겨레 신문은 사실 신문이라기보다는 대학가 유인물보다 좀 세련된 인쇄물처럼 보였고, 논조도 신문이라기보다는 팜플렛을 보는 것처럼 생경하고 뚝뚝했다. 하지만 신문이었다. 일간신문이었다.
한겨레 신문이 되기까지
한겨레 신문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곡절이 있었겠지만, 한겨레라는 제호가 정해지는 것도 꽤 오랜 진통을 겪었다. 물망에 오른 후보작은 4개였다. 한겨레 신문, 민주신문, 독립신문, 그리고 자주민보. 유신정권 시절 동아일보 기자들이 해직당할 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일갈하며 사표를 던졌던 편집국장이자 초대 한겨레 사장을 지내는 송건호는 ‘독립신문’을 선호했다고 하고, 수십 명의 추진위원들이 뽑은 제호는 ‘자주민보’였다. (오늘날 자주민보가 UFO가 조선인민공화국의 비밀 병기라는 판타지 언론인 걸 생각하면… 참) 하지만 이 고리타분한 제호 자주민보에 젊은 축들은 일제히 반발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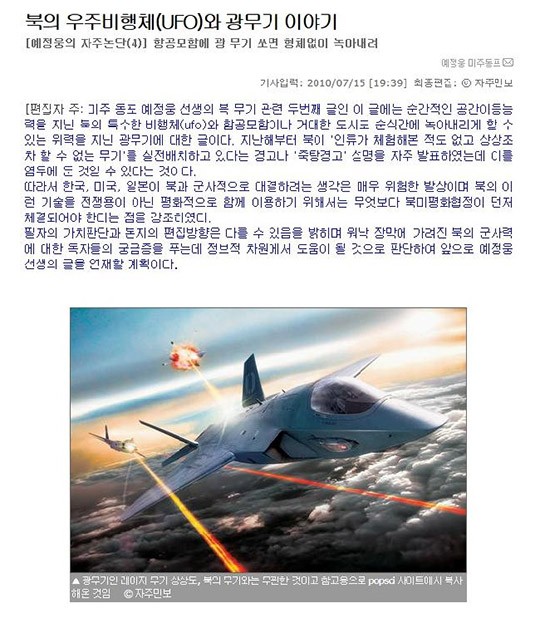
“하여간 노땅들은 안된다니까!”
이들이 제시한 것은 젊은 층에 대한 여론조사였다. 어디에 의뢰에서 전국적으로 수만 명을 조사할 깜냥은 못되고, 직원 등 200명과 대학생 200여 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한겨레’로 낙착을 본다.
이 한겨레 창간 정신의 시원(始原)을 따지자면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한 해직기자의 꿈을 들 수 있겠다. “새 시대가 오면 온 국민이 골고루 출자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신문사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민중을 위한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전용을 해야지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동아일보 해직기자 안종필.
경남고등학교를 나온 부산 사나이였던 그는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잘린 뒤 신문에 나지 않는 소식들을 모아 ‘민주인권일지’를 냈다가 콩밥을 먹는데, 그 감방 안에서 박정희의 죽음을 접하고서 이런 예언 같은 사자후를 토해 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로부터 석 달 뒤 세상을 떴다.
6월 항쟁의 불바다가 지나간 후 들이닥친 무더위 속에서 안종필의 외침은 극적으로 되살아난다. 국민 모두가 주식을 형식으로 창간에 참여하고 그 종잣돈으로 신문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신문을 만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저주와 “50억을 모아요? 그럼 재야와 운동권 자금은 씨가 마르겠군요.” (이해찬) 같은 우려와 “그 돈이 있으면 정권타도투쟁을 해야지 새 신문이 더 급한가?”(고 박현채 교수)라는 호통까지 한겨레의 시작에는 많은 시선과 발언들이 얽혀 있었다.
한겨레 신문 창간 기금 마련 광고가 나가면서 많은 이들의 호응이 있었다. 동아일보 백지 광고 투쟁 이후 바른말 하는 신문과 옳은 글에 목숨 거는 기자들에 굶주렸던 이들이 한 푼 두 푼 금자탑의 밑돌이 되었는데 한 대학생의 이야기는 가슴을 찡하게 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87년 1월 고문치사당한 박종철의 아버지 박정기 씨의 이름으로 주식 100주(50만 원)을 청약한다.
무슨 사연인지 밝히지도 않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려는 학생을 붙들고 설득한 끝에 박정기 씨와 통화를 하게 했는데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성금으로 보내려고 틈틈이 모은 돈인데 이렇게 전해 드리는 게 더 뜻있는 것 같아서…” 박정기 씨도 울고 통화를 지켜보던 기자들도 울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겨레 신문은 점차 그 형상을 스스로 그려내기 시작한다.
87년 대통령 선거의 실패 이후의 분위기는 요즘 말로 ‘멘붕’이었다. 2012년 대선의 ‘멘붕’이 축대가 무너진 정도라면 87년의 멘붕은 63빌딩과 삼풍백화점을 합친 멘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세상에 6월항쟁 그 난리를 치고도 군부의 후계자가 대통령이 되다니, 아니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 주다니. 한겨레 신문 기금 모금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가히 짐작이 간다. 야 이런 거 해서 뭐하냐는 한탄부터 엽전들이 뭘 한다고 하는 절망까지. 그때 한겨레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의미 있는 모금 카피 하나로 사람들의 눈을 찌른다.
“민주화는 한판의 승부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전 10억이 모였는데 대선이 끝난 후 두 달 동안 40억이 몰려들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웅크리고 있어 봐야 별수 없고, 대통령 선거 졌다고 세상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그 거대한 자각이 분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 준 것이다.
역사는 승리로 인해 한 발 당겨지지만, 패배로 인해 두 발 거리를 건너뛰기도 하는 재주를 부린다. 한판의 승부에서 졌다고 슬퍼하고 술 마시고만 있지는 않았던 사람들 모두의 작은 승리, 그것은 국민주신문 한겨레 신문의 탄생이었다. 1988년 5월 15일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랬던 한겨레가…” 하며 통탄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한겨레라는 이름은 (그리고 여타 많은 이름들은) 지난한 역사의 산물이고 가까스로 확보한 진지이며 다시 이루기 힘든 성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기대하지도 말고 쉽게 포기하지도 말지니, 어차피 역사는 ‘한판의 승부가 아니다.’
원문: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