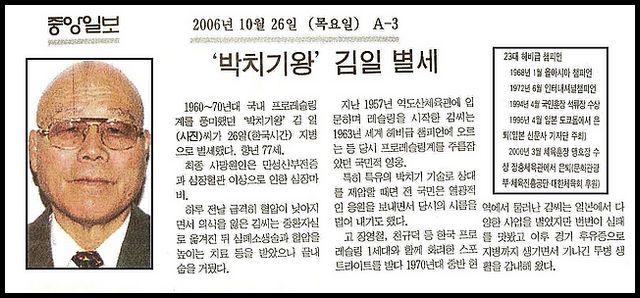1.
6-70년대 최고의 인기 스포츠는 무엇이었을까. 답은 프로레슬링이었다. 지금은 한 물이 아니라 두 물 세 물이 간 이름이지만 6-70년대 프로레슬링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애들은 김일의 박치기를 보기 위해 TV 있는 집 아이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아양을 떨었고, 만화 가게에 “여건부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출전 ‘레쓰링’ 경기”가 나붙는 날이면 어른들까지 만화 가게를 가득 메웠다.
전쟁 때 황해도에서 피난나온 한 청년은 우연히 일본의 프로 레슬링을 다룬 영화를 보게 된다. 안 그래도 체육관에서 레슬링으로 체력을 다지던 그는 영화 속에서 자기가 갈 길을 발견한다. 일본으로 가서 프로레슬링 경기를 지켜보며 노하우를 어림잡은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내 최초의 프로레슬러가 된다.
부산 지역에서 서울로 진출한 프로레슬링은 공전의 히트를 쳤고 황해도 피난민 청년은 한국 프로레슬링의 산파이자 대부가 된다. 그 이름이 장영철이었다. 덥수룩한 수염과 날렵한 드롭킥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레슬러.

2.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던 장영철에게 강력한 신흥 세력이 등장한다. 신흥 세력이라기보다는 선진(?) 세력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일본 프로레슬링의 최고봉 역도산의 제자 김일이 입국한 것이다.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었지만 여러모로 미숙하고 일본 프로레슬링의 화려한 기술과 경기 운영에 비하면 조악했던 국내 레슬링계에 김일의 출현은 야릇한 긴장의 대결 구도를 가져왔다. 개척자를 자임하는 토종 국내파와 ‘선진문물’을 등에 업은 해외파의 대결은 레슬링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던 중 1965년 11월 27일 운명적인 사건이 터진다.
5개국 친선 레슬링 대회가 열렸고, 김일의 메인 게임에 앞서 장영철은 일본의 오쿠마와 3전 2선승제의 시합을 치르고 있었다. 경기 중 오쿠마가 장영철에게 ‘새우 꺾기’를 시도했다. 허리를 꺾는 위험한 공격에 장영철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매트를 두드렸다.
이는 항복 표시로 경기가 중단되어야 했는데 어쩐 일인지 오쿠마는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았고 여기서 사단이 났다. 링 사이드에 포진해 있던 장영철의 제자들이 링 위로 튀어 올라가 오쿠마를 집단 폭행한 것이다. 그들은 (김일이 불러온) 오쿠마가 장영철의 허리를 꺾어 버릴 심산이었고, 이는 김일측의 장영철 제거 음모라고 판단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장영철이 한 말을 상당한 파장을 가져왔다. “오쿠마가 각본대로 하지 않고 (김일의 지시를 받아) 이기려고 했다.”는 증언을 했는데 이 말이 경찰과 언론을 거치면서 “프로레슬링은 쇼다.”라고 장영철이 선언한 것처럼 되어 버렸다. 사실상 장영철은 “프로레슬링은 쇼냐?”라고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실 프로레슬링은 예나 지금이나 ‘쇼’적인 성격은 분명히 있다. 100 킬로그램의 거구가 로프 위에 올라가 매트에 쓰러진 이를 향해 점프해서 실제로 무릎으로 내려찍는다면 경기마다 송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원로 레슬러 천규덕이 문화일보와 인터뷰한 걸 들으면 적어도 당시의 프로레슬링은 쇼적인 성격은 있되 완전한 쇼는 아니었던 것 같다.
“레슬링엔 엄격한 룰이 있어요. 예컨대 팔을 15도 이상 꺾으면 안 됩니다. 더 꺾으면 팔이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꺾었다가 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쇼로 생각하는 거지요. 절대로 경기 결과를 서로 짜지 않아요. 다만 프로는 아마와 다르니까, 경기를 할 때 승부보다는 화려한 테크닉을 우선해야 한다는 묵계는 있지요. 그래야 관중을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3.
사실이야 어쨌든, “프로레슬링은 쇼”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장영철이 선언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귀국한지 얼마 안된 김일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장영철은 김일에게 도전장을 던졌으나 김일은 “일본 3류한테 지는 선수가 나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코웃음을 쳤다. 아울러 “이런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한국에서 레슬링을 하고 싶지 않다.”고까지 했다.
한국 프로레슬링을 개척한 황해도 장사 장영철과 전라도 고흥 장사 김일 두 거한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교환하며 가없이 멀어지게 된다. 그 뒤 장영철 측의 선수가 김일 라인에 침투하여 선수를 빼내려 했다는 일종의 프락치(?) 파동 등을 거치면서 증오는 시멘트로 굳어 버렸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2006년 김해의 어느 병원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방문한다. 한때 130킬로그램을 넘던 거구였지만 지금은 몰라보게 초췌해진 박치기 왕 김일이었다. 그의 방문 대상은 역시 100킬로그램의 당당한 레슬러였지만 현재는 미음으로 연명하고 있는 장영철이었다.
“죽기 전에는 한 번 봐야겠다.”는 것이 김일의 의지였고, 장영철은 “이렇게 오실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 감격스러워했다. 둘은 그때에야 나이를 확인한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몇 살이십니까?”(장영철) “나 일흔 여덟이오.” (김일). 둘이 서로를 안 지 41년이었지만 그제야 ‘민증’을 까고 있으니 그 세월이 미루어 짐작이 간다.
김일 역시 “후배가 먼저 찾지 않는데 내가 찾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라고 고백했지만 김일은 얄팍한 자존심을 버리고 장영철의 손을 먼저 잡았다. 그리고 병실을 울린 것은 41년만의 사과 비슷한 장영철의 말이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힘차게 일어서자고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로부터 머지않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장영철은 그 해 8월, 김일은 10월 세상을 뜬다. 하지만 둘은 저승길에 버겁고 거추장스러울 큰 짐 하나씩을 버리고 갔다. 1965년 11월 27일 링 위의 난장판으로 시작된 41년의 포한이 그것이다. 의미 없는 자존심 폐기하고, 먼 길 헤치고 장영철의 손을 잡아 준 그날, 김일은 그 레슬링 인생에서 안토니오 이노끼에게 퍼부은 박치기 이후 가장 통쾌하고 감동적인 ‘박치기’를 성공시켰다. 41년의 절교와 오해의 세월을 매트 위에 누인 것이다. 그 찜찜함을 가슴에 묻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 저승길의 발걸음이 오죽 무거웠을 것인가.
4.
누구에게든 크건 작건 “1965년 11월 27일”은 존재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장영철이 되기도 하고 김일이 되기도 하는 오해의 틈바구니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나 그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꿍하니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포한들도 많을 것이다. 가끔은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고, 좀 고까와도 훌훌 털자 웃음을 지음이 결국은 나 자신을 가볍게 하는 일이라는 것, 김일과 장영철은 그걸 알려 주고 갔다.
11월 27일이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기, 가슴 속 납덩이가 혹여 있다면 장영철의 멋진 드롭킥과 김일의 가공할 박치기로 날려 버리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김일의 박치기! 장영철의 드로오오옵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