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을 가거나 면접을 하거나 할 때, 상대방이 잘 사는지 물어 보려면 대체로 둘 중 하나를 물어 보게 된다.
얼마나 버니?
이 질문은 “아버지는 뭐하시니?” 내지는 “월급은 많니?” 등과 같은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재산은 얼마나 있니?
이 질문도 “집은 어디니?” 내지는 “집은 몇 평이니?” 같은 변형이 있을 수 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첫 번째의 질문을 자주 물어 보다가 요즘 들어서는 (한 5-6년 전부터는) 두 번째의 질문을 사람들이 더 많이 물어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점점 계급사회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 사회의 분위기의 변화는 피케티가 말 안해줘도 다 알 수 있다. 피케티의 천재성은 이게 전체적인 성장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첫번째 질문을,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두번째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피케티는 국가의 통계도 제1차세계대전 이전에는 첫번째 질문에 집중했다가, 대략 1940년을 전후로 하여 두번째 질문(GDP)으로 넘어갔다가, 1990-2000대를 전후로 하여 다시 첫번째 질문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피케티가 말하는 것처럼 측정/계산기술의 문제와 대공황을 극복하거나 성장을 관리하는 등의 정책과제와도 관련이 있다.
피케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다음의 공식일 것이다.
α = r × β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r은 자본의 수익률이다. β는 자본/소득의 비율이다. 이 둘을 곱하면 α 즉 한 나라의 전체 수익에서 자본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온다. 예를 들어 보자.
r이 5%라고 하고 (이건 이상하게도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는 숫자이다. 자본의 장기적인 평균수익률이 5%에 수렴하는 것이다),
β가 600%라고 한다면 (즉, 한 나라의 총재산이 총수입의 6배, 또는 6년동안 벌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30%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피케티는 자본을 아주 넓은 범위로, 즉 노동의 수입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몫이 대체로 전체의 70% 정도라는 것이다. 이건 평균/경향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래야 한다는 당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피케티에 대해서 한국의 우파들이 비판하는 이유이다.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걸 한국의 경우에 따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추측컨대는 그렇게 비판적인 걸로 봐서는 α가 30을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경험적으로도 “얼마나 버니?”라는 질문에서 “재산이 얼마니?”라는 질문으로 이행하게 된 시점이 아마도 α가 30 (또는 세계 평균)을 넘어선 지점이 아닐까라고 대충 추측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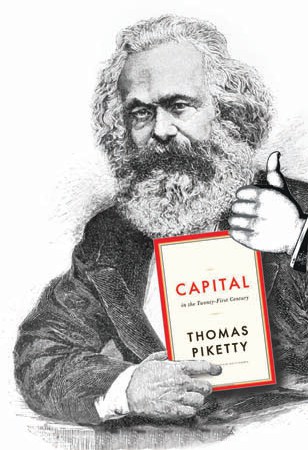
아직 피케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제2장까지, 그러니까 제1부 다 읽었음 — 15%), 이건 피케티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마도 저성장시대로의 전환점인 것이다.
오해하지 말 것은 피케티는 α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고성장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단지 저성장시대가 오면 α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 나라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여 주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장의 대부분을 피케티는 고성장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규칙이라기보다는 예외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1900년에서 1980년까지는 유럽과 미국이 세계 생산의 70-80%였는데, 이 숫자가 2010년이 되면 50%로 줄어들었고, 결국은 20-30%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게 세계 인류에서 미국/유럽이 차지하는 지위이고, 19세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체로 그 수준이었으니 말이다. 이 말은 산업혁명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점이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외라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의 성장률은 잘 해봐야 0.1-0.2% 수준이었다. 산업혁명에서 대충 제1, 2차 세계대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성장률이 유례 없이 높았지만, 이건 예외이다. 그 이후 약 1970년대까지는 미국의 성장률을 유럽이 따라잡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률이 높았고, 지금은 이걸 중국이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률이 높다. 그렇지만, 결국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성장률은 그리 높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성장의 세상이 오면 평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
Capital-dominated societies in the past, with hierarchies largely determined by inherited wealth (a category that includes both traditional societies and the countries of nineteenth-century Europe) can arise and subsist only in low-growth regimes.
주로 상속재산에 따라 계급이 결정되는 과거의 자본주도 사회(여기에는 전통 사회와 19세기 유럽이 포함된다)는 저성장 구조에서만 발생하고 지속될 수 있다.
오해하진 말라.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분배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피케티가 말하는 것은 계급사회의 조건이 저성장이라는 것이다. 이 둘은 다른 이야기이다. (어쩌면 수천년의 문화와 전통을 가진 인도는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성장을 보이코트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로 보이는가? 산업혁명에서부터 약 2000년 정도까지의 기간이 세계역사상으로 보면 예외에 속하고, 그 이전이나 (이보다 중요한 것으로 그 이후로도)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요즘은 하도 들어서 좀 지겹기는 하지만, 그냥 손사레치고 넘길 수는 없는 이야기이다.
저성장사회에서는 실력보다도, 운보다도 부모 잘 만나는 것이 장땡이라는 이야기가 마르크스주의라면, 세계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교본은 주역이나 당사주나 토정비결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