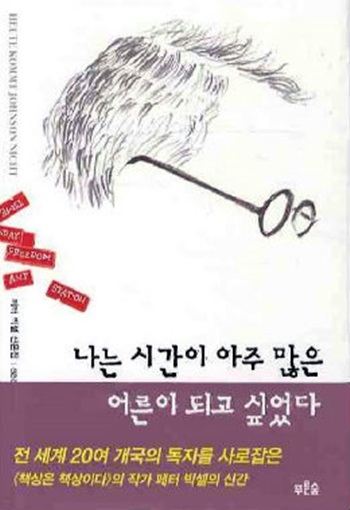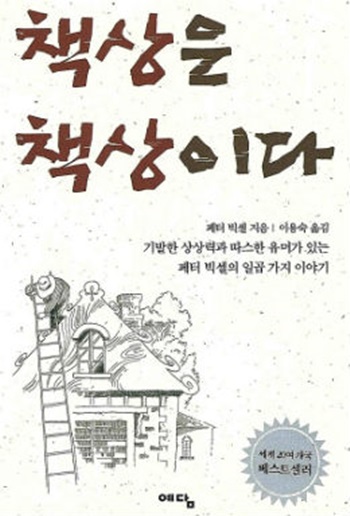페터 빅셀의 산문집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전은경 역, 푸른숲, 2009)는 머뭇거리기를 반복하며 읽어야 했습니다. 연신 이런 말을 되뇌기도 했고 말입니다. ‘어쩜 이리도 내 마음과 닮았을까?’ 공감 가는 대목이 너무 많아 어디다 밑줄을 쳐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는데, 일테면 이런 부분이 제 마음을 심하게 흔들었던 대목입니다.
나는 글을 읽거나 쓰기 위해 기차를 탈 때가 많다. 조바심은 읽기와 쓰기의 적(敵)인데, 기차는 나를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지만 내가 취리히나 프랑크푸르트 또는 베를린으로 가고 싶거나 가야 해서 기차를 타는 경우도 자주 생긴다. 사실, 이때 역시 일을 하기에 좋은 기회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기차에서 글을 쓰기가 불가능해진다. (중략) 예고는 기다림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예고는 기다림을 방해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 42쪽
빅셀의 짧은 이야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묘한 기운이 있습니다. 결코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기주장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글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 장편(掌篇) 형식의 글들은 어느새 내 가슴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생각의 길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중 특히 압권이었던 「발리의 사제는 그저 가끔씩만 오리를 가리킨다」를 발췌해 보렵니다.
발리에 사는 친구가 내게 말했다. “사제는 뭔가 필요하면 손가락으로 그걸 가리킨다네. 그럼 가질 수 있지.” 그러면 사제는 부자가 될 수 있겠다고 하자, 친구는 깜짝 놀라 날 바라보았다. “아니야, 사제들은 현명해.” 그는 사제들이 현명하고, 오리가 필요하면 오리를 가리킨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제도 사람이며, 사람은 권력을 악용하는 성향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도 간혹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은 그러냐고 물었고, 나는 창피하지만 고개를 끄떡이며 시인했다. 그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해명거리를 찾으려고 했다. 한참 뒤에 그가 말을 꺼냈다.
“사제들은 피곤해. 엄격한 학교를 다녔고, 산스크리트어와 또 다른 언어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평생 배우고 또 배우지. 마침내 사제가 됐을 때는 이미 무척 늙었다네. 권력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피곤한 상태지.”
어쩌면 현명함은 피로와 관계가 있는지도 모른다. 피로는 한때 신중함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뚱뚱한 남자들을 내 주변에 두라.” 카이사르가 한 말이라고 한다. 느린 남자들이라는 의미였을까? 내가 보기에도 우리의 민주정치는 너무 느릴 때가 많다. 하지만 정치가 너무 빨라지고, 정치적 성공이 스포츠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랴. 그들은 권력을 소유했다. 모든 것을 가리키고,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러나 발리의 사제는 그저 가끔씩만 오리를 가리킨다.

책에서 인용한 부분과 여러모로 대비되는 현실을 사는 느낌입니다. 콩알만 한 권력만 쥐어도 그걸 악용해서 온갖 패악질을 서슴지 않는 현실의 권력 앞에서 수시로 좌절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발리의 사제만큼의 자제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악용하기에 앞서 그 권력의 원천이 어디인지, 원천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권력자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리가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앞다퉈 오리를 가리키는 권력이 출몰하기 때문입니다.
기왕 빅셀의 책을 다루기로 했으니 또 한 권의 명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역시 웅숭깊은 사유가 돋보이는, 『책상은 책상이다』(이용숙 역, 예담, 2001)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코뿔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언제나 신이 나서 앞으로 달려나가지만, 우리 안을 두어 바퀴 돌고 나서는 방금 떠오른 생각을 잊어버리고 다시 오래오래 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다.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았다. 그러다가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제나 너무 일찍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코뿔소에게는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먼저 하고 이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같지만 막상 돌이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더 많고, 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투성이입니다. 코뿔소보다도 못한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때로 말과 행동으로부터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설까요. 이론과 실천의 조화, 말보다 행동이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지 않습니까. 코뿔소가 우리를 맴도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생각의 포로가 되었을 때 마구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게 돌이켜보면 참으로 덧없고 부질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새 망각의 강에서 허우적대기도 하고, 또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를 주저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일을 되풀이하며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수시로 떠오르는 생각을 차곡차곡 정리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늘 망각과 비겁, 회의와 무망의 강을 오가고 있을 뿐이니 말입니다. 이젠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글쓰기인 거죠.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쓰고 또한 생각을 끌어내는 글을 써야겠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따지느라 허송할 게 아니라 일단 내게 주어진 우리를 두 바퀴 정도 돌고 나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후 정말로 필요한 그 무엇이 생겼을 때 그때 아주 조심스럽게 발리의 사제처럼 오리를 가리키려 합니다.
원문: 대안미디어 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