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는 잘 했지만 리더가 된 후에는 조직을 파괴하던 분들을 몇몇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다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외, 수기, 과다’죠. 그러니 조직으로 시너지를 내는 걸 포기하거나, 사람을 잘 활용해 성과를 내는 것의 반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 3가지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1. 예외
하나의 예외를 만들면 더 많은 일들이 태어납니다. 그건 마치 재고가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늘어난 재고는 운송비, 창고비 등등의 추가 관리 요소를 불러옵니다.
수수료 구조를 정한다고 생각합시다. 15%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개발합니다. 처음에는 예외 없이 시행됩니다. 그러다 영업력이 부족해지면서 예외가 생깁니다. 누구는 10%, 누구는 12%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개발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수수료만 변경하면 모든 것이 바뀌도록 별도로 개발하는 경지에 다다릅니다.
그다음은 이렇게 개별 수수료를 책정한 사용자 그룹을 관리하는 것으로 리소스가 옮겨갑니다. 새로운 요구가 생겨납니다. 수수료만 바뀌는 것에서, 다른 것도 바꿔 달라는 요구가 들어요죠. 오는 요구대로 다 받아주면서 이제는 다른 부분도 수정해 주는 것을 또 개발하고, 관리하고, 정책화시키고, 매번 전략을 짜는 것으로 분화해 나갑니다.

좋게 보면 ‘상품의 고도화’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전략적 선택의 폭이 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덩치가 커지면서 필수적으로 변화하니까요. 하지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 가지치기 없이 계속 일어나면, 벌인 일만큼이나 동시에 고도화를 해야 하는 리소스의 도전을 받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리소스가 계속 투입되면서 커리어에 도움 안 되는 일을 잡고, 동기부여를 못 하는 동료를 만들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죠.
예외 자체를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예외는 신중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않으면, 예외는 필수적으로 엔트로피 증식의 중심이 되니까요.
2. 수기
예외의 친구 중에는 ‘수기’가 있습니다. 자동화해서 일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일하지 않고, 재연성이 없는 수기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만 보여주려고 시켜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지원받지 못해 실무자가 끌고 가니까 수기가 생깁니다.
하나의 수기는 또한 엔트로피를 여는 문이 됩니다. 오디언스 타겟팅(Audience Targeting)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아무나에게 해 보라고 합니다. 아무나 분은 엑셀로 고객 명단을 랜덤하게 추출해서 알림을 주거나 쿠폰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는지 손으로 엑셀에 옮겨서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누가 알림을 보았는지, 쿠폰을 사용했는지 엑셀로 손으로 붙여서 기록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담당자는 손으로 고객 명단을 내리고 붙이는 작업을 오류가 없다는 가정하에 수행합니다.
일을 하나 수기로 시작한 것일 뿐인데, 일이기 때문에 성과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수기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시스템 하나 도입하면 버튼 하나 누르는 걸로 끝날 텐데, 사람이 하다 보니 오퍼레이팅에만 몇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하는데’만 시간을 쓰니 생산성을 올릴 힘은 없습니다. 여기에 분석을 추가로 하라거나 로그를 더 남기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수기는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장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그만이니, 관리자는 거기에 투입되는 기본 리소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를 못 하죠. 왜 힘들어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묵살하게 마련입니다. 정규직이 그런 일 하기 힘들면 기간제를 쓰거나 파견직을 써서 오퍼레이팅만 돌아가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오퍼레이팅만 할 수 있게 갖추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기획부터 맥락까지 다 들어있는 하나의 수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은 비슷하게 모방도 못 해냅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조직의 노하우도 사라집니다. 어떤 조직이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과다
좋은 기획은 100%를 만들기 위해 3배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격언은 마치 근면성실하게 책상머리를 잡고 성공한 신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시간이 많다면 많은 안을 준비하고 여러 효과들을 검토하고 세계적인 레퍼런스를 양껏 넣어 그중에서 적용할 점을 백과사전으로 만들어 두어도 됩니다. 어차피 다 읽지도 못할 기다란 보고서를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성과를 만드는 총아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무한맵이 아니니까요. 뭐든 과하게 준비하는 것은 다른 데 쓰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하게 과다한 요구를 예정 없이 하는 상사는 모두의 예측 가능한 자원을 뺏아갑니다. 상사가 극 P이고 실무자가 극 T라면 최악의 조합이 벌어집니다. 일 잘하는 실무자가 매번 갑자기 떨어지는 무거운 업무에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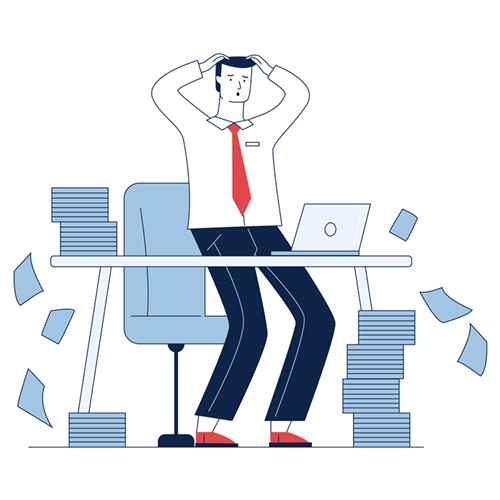
‘적정 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상황과 인프라를 고려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스펙으로만 해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례는 아프리카의 깨끗한 물이 부족한 곳에 간단한 정수 처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갑자기 해야 하는데 오늘 엄청 많은 세부 스펙으로 준비하라고 하거나, 오늘 밤에 의견을 덧붙일 건데 전에 없던 내용이거나 처음과 다른 방향으로 지시합니다. 충동적이고 과다하죠. 제가 아는 이런 관리자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치며
‘예외, 수기, 과다’는 조직이 힘을 써야 할 때 쓰게 만들지 못하고, 에너지를 축나게 만들고, 잠재적인 동기 부여를 감소하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지시하는 일, 나누는 일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아닌지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외를 만들고 있는가, 수기를 조장하는가, 과다한 요구는 아닌가. 상식적인 선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더 나은 일할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겠죠.
원문: Peter의 브런치
이 필자의 다른 글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