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에는 룰 같은 것이 있다. 간단한 내용이면 글로, 복잡한 내용이면 말로, 상호 간 이익 따져야 하는 등, 불편한 내용이면 대면 미팅을 한다는 것이다. 이중 업무를 하면서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불편한 내용일수록 대면 미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불편할수록 만나기 싫으니 메일을 쓰고, 편하고 간단한 일은 만나서 논의하고)
미팅이나 통화 등에서 사용되는 표정과 제스처, 어감이나 어투, 뉘앙스 등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표현이다.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수단이 많을수록 오해의 소지가 적고, 반대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줄어들수록 오해의 소지는 많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메일 < 통화 < 미팅” 순으로 오류 가능성이 적다.
글의 경우 나는 예의 있게 쓴 것인데 상대방은 단호하게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 가급적 메일보다는 전화나 대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추천하는 이유다.
이처럼 ‘글’로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말·표정·제스처’까지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중 어떤 게 더 전달력이 높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미팅이나 전화로 할 수는 없다. 사안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는 업무에 따라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업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꼽자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메신저나 메일이 가장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메신저가 휘발성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면, 메일은 비휘발성이며 좀 더 공식화된 툴로서 많이 사용된다.
메일의 장점은
여러 수신/참조자를 두어 1대 多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고, 파일 첨부 등을 통해서 자료의 공유나 보고 등의 정리된 형태로도 가능하다. 비동기식이라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을 때, 읽고 싶을 때, 회신하고 싶을 때 회신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으며, 하단에 붙여진 메일 내용을 통해 업무의 히스토리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단점은
상대방의 수신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쌍방향의 실시간 소통이 어렵고, 이 때문에 수신·참조자가 서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협업 툴이 도입되고 있다. 슬랙, 웹엑스, 컨플루언스, 지라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메일을 업무 요청·보고 등을 위한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
어찌 보면 소소하지만, 어찌 보면 중요한 메일 커뮤니케이션 팁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수신/참조자를 정확하게
앞서도 말했지만 메일의 가장 큰 장점은 1 대 多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인지, 누가 참고하고 있어야 할 업무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잘 못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10명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다 수신자로 배정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10명이 다 서로 ‘쟤가 챙기겠지…’ 하면서 누락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수신/참조자 구분이 안 되면 누구한테 요청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수신자가 누구인지, 참조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지정해 주는 것이 좋다.
2. 회신할 때는 전체 회신으로
회신할 때 임의로 수신/참조자를 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은 팀장, 임원처럼 내가 답변하는 내용을 공유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회신할 때 껄끄러운 내용이면 차라리 발신자에게 전화하거나, 대면 미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낫다. 메일에서 임의로 수신자를 빼도 상대방이 다시 추가해서 회신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임의로 빼고 회신한 사람의 상황만 더 이상해질 뿐이니, 기존의 수신/참조자를 임의로 빼거나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좋다.
반대로 수신/참조자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메일 본문에 “업무 처리에 유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수신자 확대하였습니다.”라는 형태로 수신자를 확대했다는 알림을 해주는 것이 좋다.
3. 소속과 이름을 밝히면서 인사하기
글은 형식을 갖추는 것에서 기본적인 예의가 시작된다. 메일 수신자가 누구든, 메일 시작에는 소속과 이름을 누구인지 밝히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간혹 그냥 ‘아래 메일 확인해서 전달해주세요’라고만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글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일수록 가능하면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물론 첫 메일이 아닌 회신된 메일에 다시 회신하는 경우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4. 요청하는 내용과 일정을 명확하게
메일로 업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지와 ‘해당 일정까지 피드백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도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보통 요청만 하고 일정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모든 업무가 ASAP라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모든 업무가 ASAP는 아니다. 수신자에게는 전체 업무의 단편적인 한 부분만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가능하면 요청하는 업무의 전반적인 일정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수신자가 전체 일정에 문제없도록 내가 어떻게 업무를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5. 수신 확인 안내와 함께 피드백 일정 안내
메일로 업무 요청을 받은 경우, 업무가 다 끝날 때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이 지나서 ‘결과’만 회신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메일의 장단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일은 수신 확인과 진행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바로 처리가 가능한 일이라면 모르지만, 업무 처리에 며칠이 소요되는 건이라면 요청한 사람은 메일 확인은 했는지, 업무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확인’, ‘계획’, ‘결과’ 순으로 3번 피드백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확인”은 ‘요청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내일까지 검토해서 일정을 회신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요청하신 업무 처리하여 회신 드립니다’ 처럼 단계별로 피드백을 하기를 추천한다.
6. 폰트 크기/컬러/bold 등의 사용은 최소화
메일 본문에 온갖 컬러와 bold, 글씨 크기에 밑줄까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일부 내용 강조를 위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지저분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잘 읽히기 않는 경우들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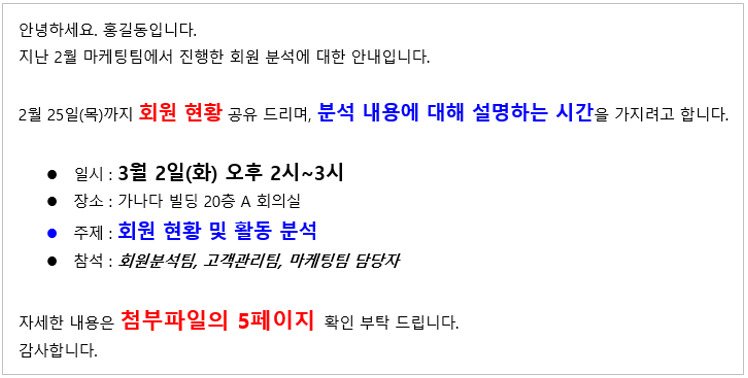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치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를 덜 중요한 건지, 강조하지 않은 나머지 내용은 스킵이 되어 버리는 경향도 생긴다.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강조는 한두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내용’과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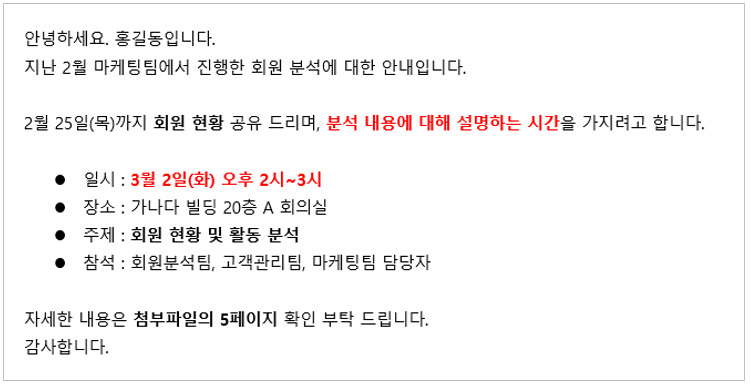
같은 취지에서 브런치의 편집 툴도 네이버, 다음 등의 타 편집 툴과 다르게 모든 기능을 다 열어놓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7. 감사합니다, 라는 끝맺음
뭐가 감사한지는 모르지만, 습관처럼 쓰는 “감사합니다”라는 한 줄 역시 글이기에 필요한 요소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어색함 같은 것이다. 뭔가 맺음말과 같은 인사를 해야겠는데, 딱히 뭐라고 할 말은 없을 때 고민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로 끝내자.
8. 서명을 통해 직급과 연락처 기재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 전화를 했는데 홍길동 씨라고 해야 할지, 홍길동 님이라고 해야 할지 등등. 저기요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말문이 막히는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물론 요즘 직급을 많이들 없애는 추세이고, 어떤 회사들은 이름 없이 닉네임을 만들어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냥 닉네임이나 “님” 호칭을 부르면 된다. 하지만 직급이 있는 회사를 다닌다면, 서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호칭을 알려주는 것이 상대방의 고민을 덜어주는 배려가 될 수 있다.
급히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거나, 글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때는 메일 외에 유선으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문: RSH의 브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