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북을 살까 고민했다. 이미 글 쓰는 도구로 데스크탑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까지 다 갖춰놓았지만 이번에는 휴대성이 아쉬워졌기 때문이다. 태블릿과 휴대용 키보드 조합은 휴대용 키보드 특유의 장난감 같은 키감이 영 적응되지 않는다. 그래서 넷북을 살까 고민했다.
그런데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초고를 핸드폰으로 쓰는 것이다. 브런치에 쓸 글이라면 어려울 것도 없다.
안 그래도 작년에 ‘시사인’에서 기사를 읽은 적 있다. 핸드폰으로만 쓴 글로 출판을 한 작가들이 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이 고민하던 것도 비슷했다. 글은 쓰고 싶은데 자세 잡고 제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쓸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핸드폰 안에 봉인해 두기로 하고 메모장을 켠 것이 시작이었다고 했다. 잠깐,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핸드폰을 쓰는 이유
모두가 그렇겠지만, 삶은 주제가 정해져 있는 드라마가 아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편성된 24시간 방송국에 가깝다. 일상의 어떤 일은 그날 갑자기 일어나는 해프닝이고, 어떤 것은 몇 년에 걸쳐 진행 중인 대하드라마다.
이 대하드라마를 글로 쓰고 싶다면(써본 적은 없지만) 꽤 오래 고민해서 완벽한 표현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상의 단면을 뚝 떼어낸 가벼운 글을 대하드라마 쓰는 자세로 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맛있는 씨리얼을 찾아냈다거나, 하루 한 끼 샐러드를 먹는 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막걸리를 마시는 즐거움 같은 것을 전쟁 치르는 장수의 자세로 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어째 비유가 다 음식이다. 지금 배고파서 그래)
최근의 내 일상은 이런 자세가 더 필요해졌다. 바빠졌기 때문이다. 나름 나에게는 중대한 일을 하다 보니 다른 글을 쓸 시간이 없어졌다. 어쩔 수 없이 브런치를 방치했다. 하지만 핸드폰 글쓰기는 이 맹점의 멋진 돌파구가 되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루 10분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손에 쥘 수 있으니까.

딱 10분이 필요한 이유
왜 하루 10분일까? 최근 했던 신기한 경험 때문이다. 컴퓨터 앞에서 두 시간을 끙끙대는 것보다 소파에 누워 벽을 멍하니 보니 술술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그 후에는 핸드폰을 켜서 에버노트에 적어내리기만 하면 됐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이다. 어떤 자극도 받지 않고 아이디어가 혼자서 굴러다닐 여유를 가져야 한다. 핸드폰도 보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온전히 벽만 바라보는 시간. 그때 비로소 조각처럼 흩어졌던 생각들이 모여 형태를 갖출 것이다. 내가 놓치고 있던 것. 글로 쓸 만한 것. 기록해 두면 적어도 나중에 다시 읽었을 때 즐겁기라도 할 것. 그것을 재빨리 핸드폰 메모장에 적는 것이다. 어차피 한 번은 퇴고할 테니까. 그 과정에서 반드시 글은 읽을 만하게 다듬어진다.
실용적인 장점도 있다. 핸드폰으로 쓰는 게 키보드로 쓰는 것보다 번거롭고 팔 아프니, 문장의 군더더기가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빠르게 핵심만 쓰게 된다. 단문이 자주 나오니 문장도 단정해진다.
‘가볍게, 짧게 매일 한 페이지’의 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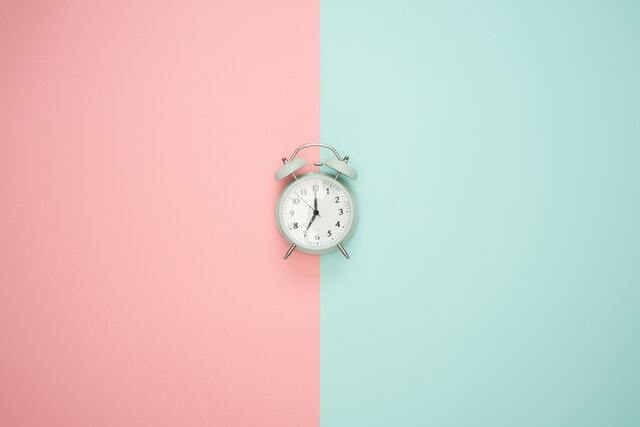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이제는 얼추 알 것 같다. 이제 필요한 건 시간을 어떻게 나눠 쓸지에 대한 균형 감각이다.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 쓰는 일은, 의외로 디바이스 활용법에 따라 많이 나누어진다. 조금 더 가볍게 가는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가까운 글쓰기 도구인 핸드폰, 가장 짧은 시간인 10분. 나에게 10분 핸드폰 글쓰기란 그런 의미이다. 그 자체로 완결을 맺을 필요 없다. 가벼운 글로 끝맺을 수도 있고, 거대한 글의 맹아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쓸모가 있을지는 지금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미래의 내가 그 중요도를 판별해서 써먹을 것이다.
크게 다짐하지 말자. 편안해지자. 한 달에 공들인 열 페이지를 쓰기보다 매일 간단한 한 페이지를 쓰자.
이 필자의 다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