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레드 다이아몬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과 교수가 쓴 『총, 균, 쇠』는 자주 들어 낯익은 제목만으로 몇 번이나 읽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책인데, 사실 책을 집어 읽기 전에는 이름값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었다.
사람이든 책이든 ‘명불허전(名不虛傳)’은 만나기가 쉽지 않다. 사람마다 기대 수준이 제각각인 탓이 크다. 잔뜩 기대하며 집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명허전(名虛傳)’에 가까웠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이 글에서 『총, 균, 쇠』를 ‘명불허전’이라는 한 마디로 평가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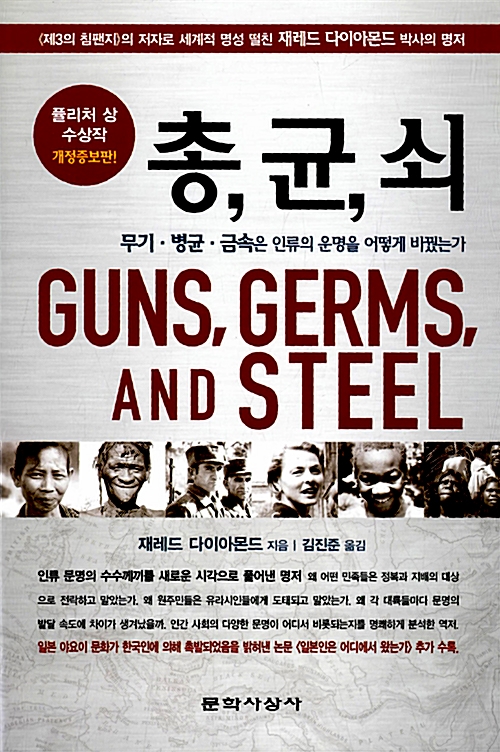
1998년 퓰리처상 수상작인 이 책은 국내에 번역, 소개된 지 22년이 지났다. 1판으로 15쇄를 찍었고(2003년 9월 1일), 2판이 39쇄까지 이어졌다.(2013년 2월 8일) 내가 읽은 책은 2020년 6월 1일이 발행일로 찍혀 있는 3판 42쇄본 중 한 권이다. 판을 거듭하면서 전체 쇄 수가 더 늘어난 형국이다. 인류의 역사와 운명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루었고, 분량이 700쪽을 넘는다. 이런 책이 꾸준히 뜨거운 반응을 얻는다는 게 놀랍다.
이 책은 인류 역사 1만 3천 년을 집약한 ‘빅 히스토리’ 계통의 역사책이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1972년에 처음 싹텄다. 당시 열대 섬 뉴기니에서 조류의 진화를 연구하던 생태학자로 지내던 저자는 어느 날 해변을 걷다가 현지 정치가인 친구 얄리를 만난다. 저자는 얄리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쇠도끼, 성냥, 의약품, 의복, 청량음료, 우산 등)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저자는 얄리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나긴 인류 역사 중 최근 1만 3,000년의 시간을 종횡무진한다.

얄리의 질문 속에는 인간 역사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해석, 논쟁의 문제들이 숨어 있다. 인간 세상의 불균형은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싹이 텄을까. 유라시아권 인종들로 구성된 주요 국가들이 오늘날 전 세계의 부와 힘을 독점하다시피 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이 배타적인 인종주의에 사로잡힌 광범위한 사람들의 관점과 태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한 인종이 아닌가.
얄리의 질문을 대하는 저자의 기본 전제는 단순하다. 지리적 환경과 생태 환경은 인간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결정론으로 부를 만한 이와 같은 입장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역사학자들은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다. 틀렸거나, 단순하거나, 너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들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지리, 생태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역사의 광범위한 경향에 미치는 정도 등을 밝혀 내는 일이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그를 통해 민족들 사이의 운명이 달라진 원인을 찾는 일은 더욱 복잡하고 힘들다.
저자는 그 모든 작업을 단독으로 진행했다. 저자가 섭렵하고 종합한 연구 분야는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태지리학, 행동생태학, 유행병학, 인간유전학, 언어학, 고고학, 기술사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팀을 이뤄 공동으로 작업을 해도 쉽지 않은 일을 홀로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통일된 종합 이론을 개발하”(34쪽)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다. 대학자로서의 열망과 포부가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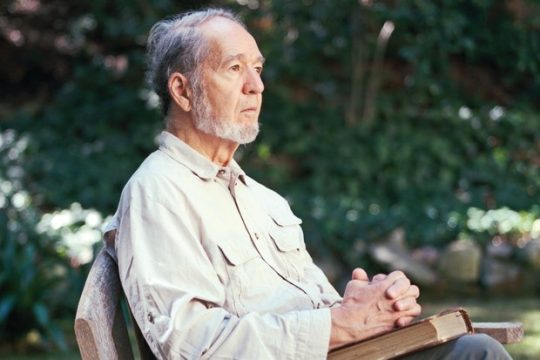
제목에 등장하는 ‘총, 균, 쇠’는, 유라시아 민족과 다른 민족들 간의 운명이 달라지게 만든 직접적 원인을 대표하는 문명의 결과물들이다. 말, 원양 항해용 선박, 정치조직, 문자 들도 이들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
저자가 708쪽에 이르는 대분량을 통해 밝히려고 하는 문제는 이들 직접적 원인의 힘이나 영향이 아니라 역사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다. 가축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수의 적합한 야생 동식물종이 대륙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지형의 동서 축과 남북 축에 따른 종 전파의 용이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제목은 독자로 하여금 저자가 이 책에서 밝히려는 문제의 핵심 논거를 엉뚱한 곳에서 찾게 하는 난점이 있는 것 같다. ‘총, 균, 쇠’라는 문명을 가능하게 한 땅, 야생 동식물 종 같은 것들을 활용해 제목을 지었다면 어땠을까 싶다. (초고에서 ‘알기 쉬운 인류의 1만 3,000년 역사’였다가 초판에서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으로 바뀐 부제가 이러한 난점을 조금 해소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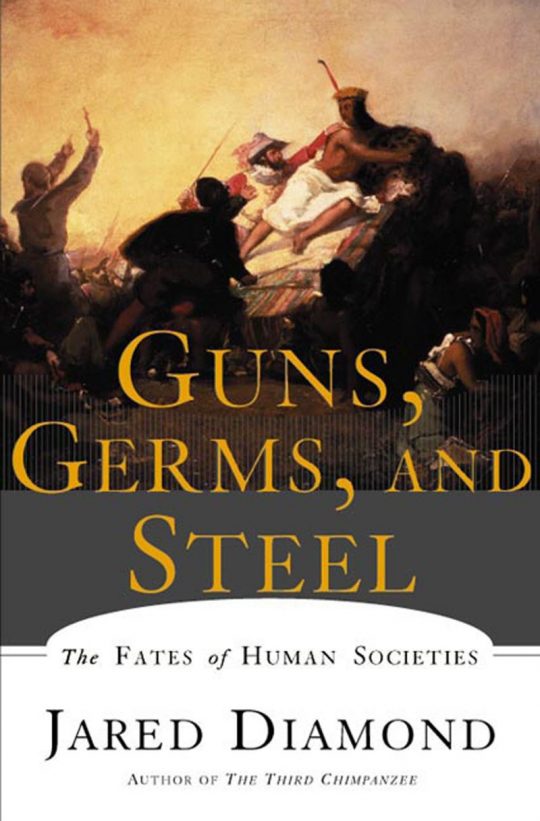
나는 잘못된 인종주의를 단호히 배격하면서 여러 학문 분야의 과학적인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문제의식을 풀어가는 저자의 ‘건강한’ 서술 관점과 방법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역사를 “지겨운 사실들의 나열”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저자가 중시하는 과학적 역사 서술법이 주는 의의가 작지 않을 것 같다.
사람들은 보통 과학을 물리학이나 생물학 같은 자연과학 영역에 국한해 협소하게 받아들인다. 그릇된 태도다. “과학(science)이라는 말은 원래 ‘지식’을 의미하며(‘알다’라는 뜻의 ‘scire’와 ‘지식’이라는 뜻의 ‘scientia’에서 나왔으므로) 지식이란 어떤 방법이든 특정 분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하여 얻는 것”(641쪽)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성급하게 앞세우지 않는다. 앞서 말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먼저 살핀 뒤 그것들을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논리적인 설명 속에서 주장의 논거가 되게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간다. 759쪽짜리 책이 3판 42쇄까지 찍혀 나올 정도로 독자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 이유를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원문: 정은균의 브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