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과 가성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격이란 개념이 제시되는 순간부터 어떠한 상품이건 가성비란 개념을 벗어나기란 불가하다.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대군에서 질적 수준을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갑자기 가성비의 시대가 끝났다며 ‘가심비’란 단어가 등장해서 가성비와 대비되는 다른 단어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참 근본 없는 단어라 생각한다. 일단 가심비라는 단어가 쓰이는 상품군을 봐도, 그 상품에 쓰는 돈을 봐도 가격에 따른 질적 수준을 고려하는 건 똑같기 때문이다. 즉 카테고리를 달리할 뿐이지 결국 가격에 따라 질적 수준을 비교하고 구매를 결정한다는 점은 가성비의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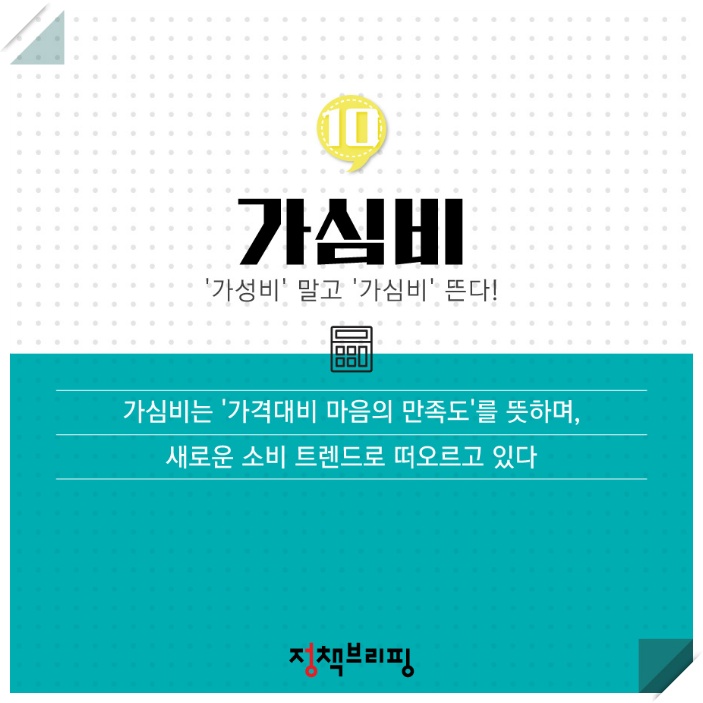
그럼에도 왜 이런 무근본 단어가 탄생했냐 하면 그간 가성비라 부르던 것이 알고 보면 가’양’비였기 때문이다.
물론 양적 만족도 자체도 질적 만족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렇다해서 양을 질과 동일하게 둘 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과 질을 소비자들이 혼동해온 것은, 양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데 반하여 질은 눈으로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질적 차이를 구분하는 데는 경험과 감식안이 필요하고 이를 납득하게 설명하려면 일정 이상의 언어적 능력과 관련 지식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아서 대부분은 ‘좋음 아무튼 좋음’ 정도에 그친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질적 요소의 어필은 시각적인 부분에 집중된다. 양이 많거나 비주얼적으로 특별하거나. 그렇기에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평가할 때 양과 같은 비주얼적인 요소가 실제의 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건 단순히 요식업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판매 서비스업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예를 들어 핸드폰 기기의 차이와 복잡한 요금제의 득실을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장년층 이상의 세대들은 대리점에서 뭐 하나라도 더 얹어주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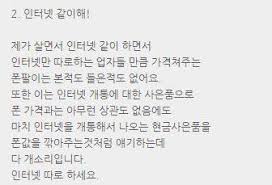
2.
그러면 만약 소비자가 질적 차이를 감식할 감식안과 경험을 갖추었다면 가성비의 구분은 명확해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가성비는 말 그대로 가격을 기준점으로 질적 차이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특정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성비의 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는 상영관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를 낳지 영화 한 편당 상영 가격은 동일하다. 어벤저스라고 한편에 3만 원 받고 B급 영화라고 5천 원 받는 게 아니다. 따라서 동일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에 영화의 질적 수준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기가 쉽다. 그래서 영화는 평점이란 방식이 꽤나 유용하게 먹히는 편이다.

하지만 가격이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비교가 먹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평점 9.5의 7천 원짜리 서비스와 평점 8.5의 3만 원짜리 서비스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이건 비교가 안된다. 가격과 질적 수준은 대체로 비례하기 때문에 7천 원이 좋아봤자 3만 원의 수준을 넘을 순 없다. 만약 7천 원이 3만원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좋다면 두가지다.
- 7천 원의 가격책정이 잘못되어 있다.
- 3만 원짜리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기에 질적 수준의 평가와 비교는 특정 카테고리에서 가격 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때문에 절대적 가격이 고가더라도 가성비가 좋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가성비가 매우 나쁠 수 있다.
3.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격을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평점 시스템이 여기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 사람들은 평점을 통해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데 가격이 제거된 평점은 질적 수준 파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가격대가 다른 상품들이 혼재할 경우 평점은 그야말로 장식으로 추락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점이 질적 수준의 파악 지표로 여기저기 남발된다는 게 함정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질적 측정은 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요구한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가격 구분을 하지 않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잦다.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질적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질적 차이의 구분에 익숙지 못하니 결국 가성비에 대한 평가는 양과 같은 비주얼적 요소나 ‘가격이 더 싼 것’으로 모아진다. 아, 물론 상품 간의 질적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가성비가 그 본래의 뜻과 달리 ‘싸고 양이 많은 것’이란 뜻으로 주로 활용된 이유다. 그러다 보니 가심비란 무근본의 단어까지 출몰한 것이고 말이다. 가심비란 단어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반성해야 된다.

그렇기에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가성비의 시대를 산 적이 없다. 가성비의 시대가 끝날 일도 없다. 어떠한 시대건 우리는 가격을 두고 질적 평가와 비교를 이어나가며 가성비를 평가할 것이다.
원문: 김영준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