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없고, 한때는 안 해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스타크래프트’라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다. 대략 설명하자면, 이 게임은 처음에 ‘일꾼’ 4명으로 시작해서, 자원을 캐고, 그 자원으로 건물을 짓고, 병력을 생산하여 전쟁을 하는 게임이다.

나도 한때 이 게임을 대단히 좋아해서 열심히 하기도 했고, 요즘에도 가끔 생각나면 옛 프로게이머들의 게임을 찾아보곤 한다. 그런데 게임 중계를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 게임에서 핵심은 다른 것보다 ‘시간‘이라는 점이다.
어릴 적에야 무작정 자원을 많이 모아서 병력을 많이 뽑으면 이기는 게임인 줄 알았지만 프로들의 세계에서 이 게임의 승패는 시간 관리가 가른다. 그래서 게임 해설가들도 계속 게이머들이 어떻게 ‘시간을 벌고’ 있는지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뽑아둔 병력을 적진에 보내서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버는 식이다.
나 같은 초보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병사 하나하나를 소중히 모아야 할 것만 같은데, 프로들은 병사들을 자꾸 적진에 보내서 시간을 버는 용도로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 진영은 병사 없이 텅 비어 있는데 상대방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속 방어하느라 급급한 경우가 많다.
그동안 시간을 번 게이머는 더 건물을 많이 짓고, 자원을 많이 모아두어 ‘한방’을 노린다. 그래서 시간을 잘 끌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원을 쌓고, 더 좋은 탱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시키고, 결국 많아진 건물로 병력을 잔뜩 생산한 게이머는 상대를 압도하게 된다.
큰 그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작은 병사들은 계속 소모할 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는 바둑과도 비슷한 데가 있다. 돌 몇 개를 희생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다 보면, 상대는 돌을 몇 개 따먹는 데 신이 나서 정작 전체 판에서는 패하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그래서 이 게임을 아마 ‘전략’ 시뮬레이션이라 부르는 것일 테다.

사실 삶에서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 방식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루하루 눈앞의 것들만 해치우는 데 급급한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꼭 사회적인 성공이나 출세의 방법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다. 어쩌면 삶 자체를 더 나에게 어울리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지금 하는 것 하나하나를 더 큰 그림에 연결할 줄 아는 그 ‘근저의 태도’ 같은 것 말이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저 재미있게 보고 오늘 즐기고 잊어버리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영화 한 편 한 편을 모아서 글을 쓰고 언젠가 영화 비평집을 한 권 내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언젠가 그 시간을 한결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한다. 여행에 가서도 실컷 돈만 쓰고 즐기고 오겠다는 태도보다는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모아서 자기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면, 여행 자체가 더 의미 있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다.
때로는 이런 태도는 어떤 우울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한다. 내가 지금은 초라하고, 이 하루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고, 하루를 견뎌 나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필사적으로 큰 그림을, 더 거대한 시간을 생각해보면 도움이 된다. 이 시간이 이를 더 나은 곳을, 더 거대한 흐름을 생각하고 그 측면에 발을 디디다 보면 이 하루는 조금 더 나은 맥락을 갖게 되고, 그 맥락의 힘이 하루를 견뎌내게 하곤 한다.
물론 너무 큰 그림에만 집착하면 하루하루의 시간이나 순간이 일종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마치 적진에 보내서 희생한 병사들처럼 이 하루하루가 죽어 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이 전쟁과 다른 게 있다면, 이 하루의 소중함을 살리면서도 인생 전체를 살릴 수도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이 하루의 가치를 충분히 사랑하면서도 전체 그림에 대한 감각을 간직할 수 있다. 삶에 필요한 건 늘 하나의 태도만은 아닐 것이다. 몇 가지 감각을 동시에 잘 붙들고 가는 게 삶도, 원하는 것도, 만들고자 하는 것도 더 잘 이끌고 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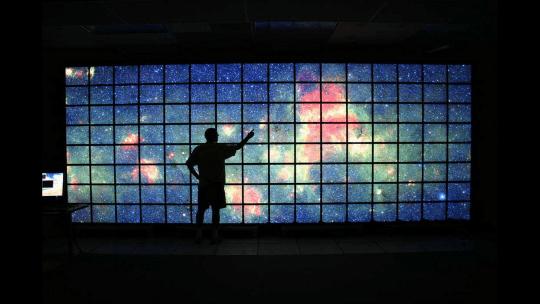
원문: 문화평론가 정지우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