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벨은 두 번 이상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홍보 대행사 인턴으로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가장 처음 들은 말이다. 전화 뭐 그까짓 거 받으면 되지. 인턴 자리로 전화가 얼마나 온다고.
우리 팀 전화가 아니어도 당겨 받으세요.
얼마 후 알게 됐다. 전화를 잘 받으라는 말의 의미가 비단 나에게 오는 전화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단 걸. 모든 선배의 내선 전화벨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 왜 내가 다른 사람 전화를 받아야 하지? 직장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인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는 낯선 상황. 다른 직원의 전화를 받는다는 건 신입에겐 굉장히 당황스럽고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전화벨이 두 번 이상 울리면…

띠리리링~
숨소리조차 시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던 사무실에서 울리던 벨 소리는 인턴인 나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띠리리링~ […] 띠리리링~
첫 벨이 울리고 그다음 벨이 울리기까지 약 1.5초 간의 정적. 그 1.5초는 혼돈의 카오스다. 내가 받아야 하나. 다른 인턴 동기들이 받아주려나. 아무도 안 받아서 벨 소리가 세 번 울리면 어쩌지. 난 온라인 PR 파트인데. PR 파트로 걸려오는 전화를 응대할 자신이 없는데. 내가 잘 모르는 용어에 대한 두려움, 전화를 건 상대가 기자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난 회사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아직 선배들 이름과 우리 회사 클라이언트도 잘 모르는데 내가 받았다가 메모를 제대로 못 하면 어떡하지.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순간.
감사합니다. XXXXXX(회사) XXX(이름)입니다.
누군가(=용자, 배우신 분) 전화를 받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A팀장님이 전화벨 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전화벨이 두 번 이상 울리는 날엔 곧바로 MSN 메신저로 소환됐다. 선배들은 그룹채팅을 열어 전화 잘 받으라는 얘기를 했다. ‘저 선배는 벨 소리 울릴 때마다 우리가 받나 안 받나 확인하는 게 일인가.’라는 내 마음의 소리. 학교마다 인사에 집착하는 언니들이 꼭 있지 않나. 학교 다닐 때 ‘인사’를 안 해서 소환됐다면 회사에선 그 소환의 소재가 주로 ‘전화’였다.
전화벨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아서 더 긴장됐다. 유난히 조용했던 사무실은 나의 목을 더욱 옥죄었다. 그곳에서 약 3개월 간의 인턴 생활을 마치고 다른 PR 에이전시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부장님이 전화벨 울리는 걸 싫어하시니까 두 번 이상 울리지 않게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 회사에서도 입사하자마자 들은 첫 생활 수칙(?)은 전화. 전화벨 소리 싫어하는 건 부장, 팀장 종특인가요? 그럼 전화기를 없애시죠. 물론 이것 또한 그 당시 내 마음의 소리.
내가 전화만 받으면 기적같이 키보드 소리가 멈췄다.

당시 신기했던 경험이 있다. 신입이 전화를 받으면 팀원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조용해지는 것. 그전까지 경쾌하게 울리던 키보드 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모두가 일을 멈추고 통화 내용을 듣는다. 내 실수를 찾아내려는 하이에나들처럼. 전화 받는 나도 당연히 그 분위기를 느낀다.
식은땀이 또르르. 전화 울렁증. 말을 하는 게 무섭다. 통화가 끝나면 메신저가 반짝인다. 통화 종료 후엔 선배들의 조언이 메신저로 쏟아지곤 했다.
“전화를 너무 바로 끊지 않는 게 좋아.” “우리 담당 기자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를 테니 기자 전화번호는 꼭 물어봐 줘.” “자료 언제까지 드려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해.”
선배들이 왜 그렇게 전화를 강조했는지는 일을 하며 몸소 깨닫게 됐다. 전화는 홍보 대행사 AE에겐 숙명과도 같다. 피할 수 없다. 보도자료 배포하고 나면 기자들에게 확인 부탁드린다며 전화해야 하고, 기자간담회라도 있으면 RSVP를 약 3차에 걸쳐 진행한다. 명절 전에는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집 주소를 확인하는 일까지. 내가 전화를 걸지 않더라도 기자/클라이언트 등의 취재 요청과 문의로 인해 회사 전화기와 나의 휴대폰은 늘 울려댔다.
다행히 나는 공포 그 자체였던 전화 업무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많은 통화량, 그리고 내가 통화할 때마다 각별한 신경을 쓰며 조언해준 선배들 덕이었다. 누구와 통화를 해도 곧잘 했다. 언제부턴가 내가 전화를 받아도 팀원들의 키보드 소리는 계속됐다. 통화를 마친 후 메신저도 반짝이지 않았다. 평생 갈 줄 알았던 전화 울렁증이 사라졌다.
전화 업무, 나만 어려웠던 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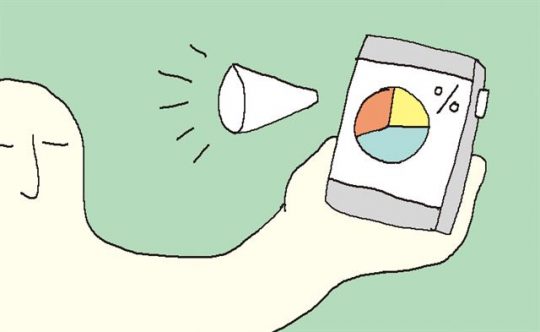
내가 그랬듯, 거의 모든 신입이 전화 업무를 부담스러워했다. 방학 때 우리 팀에서 잠깐 일했던 인턴 직원이 생각난다. 인턴에겐 기자들의 집 주소 확인 업무가 떨어졌다.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인턴은 먼저 메모장에 글을 쓴 후 전화를 걸어 자신의 글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주.소.확.인.을.위.해.전.화.드.렸.습.니.다.
흡사 군인과도 같았던 씩씩한 말투에 사무실 직원 모두가 터져 나오는 웃음을 꽉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본인도 사무실 분위기를 느꼈을 거다.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엄청 어려운 그 업무를, 인턴은 끝까지 해냈다. 그날 퇴근 후 소주를 들이켰을지도 모른다. 수화기만 들면 양이 되던 인턴도 있었다(목소리가 덜덜덜덜). 부장님 자리 전화를 당겨 받으라니까 전화선이 짧아서 안 된다고 하던 신입 직원도 생각난다.
사실 전화 업무가 어려운 건 전화를 걸거나 받는 그 행위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내 목소리를 모두가 듣는 상황. 바로 이거다. 나도, 다른 인턴이나 신입 직원들도… RSVP 룸이 따로 있거나, 회의실 등 개인 공간에서 통화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하지 않았을까? 대부분 신입 직원은 그 낯선 분위기 속에서 생기는 전화 울렁증을 버텨야 한다.
책상 위 내선 전화기가 없어 다른 직원의 전화를 당겨 받거나 꼭 자리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금, 9년 전 그 당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련해지는 나 자신을 보니 ‘아 내가 이제 옛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착잡해진다.
원문: 르미의 브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