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이 5년 새 3번째 우승을 했다. 두산은 내가 처음 야구단에 왔을 때부터 현장과 전력분석 파트의 거리가 가깝던 팀이었다. 그래서 분석에 대한 의견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구단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그 결과가 매일 저녁 덕아웃 바깥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면 공허한 메아리뿐인 것이 된다. 물론 그 꼴을 분석가 당사자가 보면 가슴이 미어지겠지. 하지만 그 결과가 현장에서 쓰이는 것을 본 분석가는 매일 매일이 즐겁(지만은 않겠지 질 땐 기분이 나쁘니까)고 일할 맛이 난다. 그리고 뭘 더 줄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게 트래킹 데이터인지, 세이버메트릭스인지, 투타 vs 스플릿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거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분석가에게 최고의 영광은 내 리포트가 경기장 안에서 읽히고, 현장 지휘자가 내 의견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광경이다. 나는 그 장면을 처음 본 순간 너무 감격에 겨워서 멀찌감치에서 그걸 지켜보며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기쁜 일이다. 그날 이후 며칠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종일 말 그대로 ‘high’였던 것 같다.
김태형 감독의 우승을 ‘감 야구가 데이터 야구에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심지어 ‘데이터가 뭘 할 수 있냐’ 라는 칼럼도 등장했다. 도대체 뭘 어디까지 취재했길래 감히 그런 말을 하는가. 그건 김태형 감독과 두산 구단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결과가 우승인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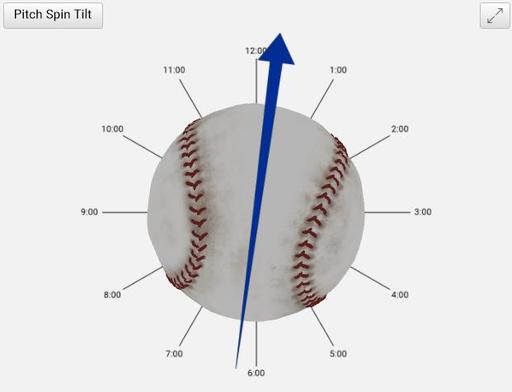
데이터를 좀 더 써 보고자 하는 것은, 감 야구를 밀어내고 뭘 어쩌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게 다 1승이라도 더 해보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이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된다. 그럼 그땐 또 지른다. 100억 내외로 지르니까 아주 좋은 선수들이 오더라. 이것도 학습된 결과다.
‘미국에서 PitchF/x란 걸 가지고 분석해요!’라고 글을 썼던 게 2007년 이맘때쯤이었던 거 같다. 10년 하고도 2년을 더 했다. 야알못 소리 듣고 씹덕후소리 들으며 살다가 이제 겨우 야구판에 들어와 월급 받고 산다.
내가 입사한 이후의 시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야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같은 말 안 듣게 해주고 싶었다. 이제 겨우 첫발도 아니고 일어서서 걸음마 할랑말랑 하다. 밖에서 흔들면 내부도 흔들린다. 그래서 무섭다. ‘우승도 못 하는 그깟 데이터 야구’가 될까 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모두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까 봐… 무섭다.
원문: 송민구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