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에서 일할 때, 에이전시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에이전시는 많은 노력을 한다. 친절함. 빠른 대응. 클라이언트의 말도 안 되는 피드백 반영. 계약에도 없는 업무 서비스. 끝나지 않는 수정과 재수정… 거기에 더해 때로는 불필요한 ‘감정노동’을 견디거나 클라이언트 담당자의 개인적인 업무요청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유지에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클라이언트와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경우를 보면, 클라이언트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에이전시의 결과물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글로벌 브랜드로는 포틀랜드에 본사를 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WIEDEN+KENNEDY와 나이키, 국내 사례로는 동서식품과 제일기획이 있을 것이다. 둘 다 30년 이상 파트너십을 이어간다. 나이키와 W+K가 함께한 프로젝트는 워낙 좋은 결과물이 많아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의 모범사례가 대상이 되곤 한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특히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한 회사들에서는 기존의 통념과 다른 새로운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좋은 관계’가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업계에서는 반대로 “결과가 관계를 만든다”가 더 맞는 말이다. 꼭 에이전시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이 공식은 적용된다.
두 곳의 게임 회사에서 일하면서, 타 부서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히 개발 본부 같은 경우의 도움이 없이는 제작할 수 없는 콘텐츠들이 있었는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쌓으려 노력했다. 좋은 관계를 위해 당연히 공손하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했고, 초반에 아무 일면식도 없었을 때는 그로 인해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수 없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든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서 증명하는 것이었다. 아예 협업할 일이 없는 부서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마치 친구 사이처럼. 사내에서 협업하는 부서 간에는 아무리 태도가 좋아도, 결과가 계속 좋지 않다면 관계는 유지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들과 일할 때도 이 공식은 적용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에이전시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결과물이 별로고, B라는 에이전시는 인간적인 매력따윈 하나도 없으나 같이 일하면 결과물이 만족스럽다. (현실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드물겠지만)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결과물의 퀄리티가 경쟁력인 크리에이티브 업계에서는 당연히 B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인간성과 결과물의 상관관계는 없이 예시만 든 것이고, 인간적이면서 결과물도 좋은 파트너들도 많이 만나왔다. 인간적이지도 않으면서 결과물도 별로인 에이전시는 거의 만나본 적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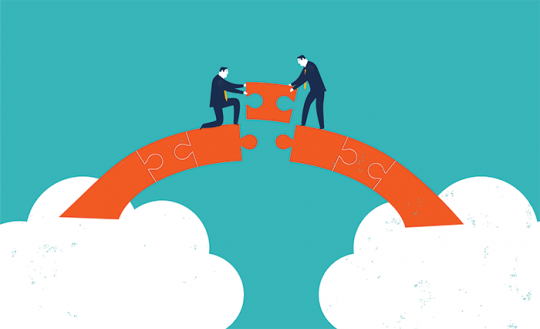
사실 이 공식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다, 10년 정도 전에 한창 열정적이던 신입 카피라이터 시절에 카피라이터 사수 선배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어느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뒤풀이를 하는 자리에서 그 선배가 술에 취해 말했다. 보통 술자리에서의 명언은 다음 날 이불킥을 하기 마련이지만 그 선배가 한 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성하야, 관계는 결과가 만드는 거야.
역시 훌륭한 카피라이터 선배셨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나는 굳이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았다. 광고업계는 에이전시나 프로덕션이나 모두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었고, 정말로 좋은 결과물이 좋은 관계를 만든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결과물이 나와도 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그 또한 문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에이전시에 한 갑질처럼 협업하는 과정이 너무나 괴로운 파트너라면 나오는 결과물에 상관없이 관계에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타이트한 관계가 유지될 때, 대부분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좋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원문: 이성하의 Medi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