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용당하는 느낌을 한 번쯤 받습니다
천 대리가 뻐근한 어깨를 주무르면서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입니다. 정작 일을 부탁한 박 과장은 이미 퇴근한 후입니다. 이 일을 맡게 된 건 아까 점심 먹고 자리에 앉아 한숨 돌릴 때였습니다.
“천 대리, 지금 많이 바빠?”
“좀 바쁘기는 한데….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정말 간단한 것 하나 부탁할게. 최 교수님에게 의뢰한 연구보고서가 방금 왔거든. 그런데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야. 상무님께 드릴 요약본 만들어줄 수 있을까? 주요 내용만 추려서 2페이지 이내로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야. 천 대리라면 2시간도 안 걸릴걸? 좀 부탁할게.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래.”
천 대리는 간단한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에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박 과장이 이미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고맙다며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한숨을 쉬며 200페이지 보고서의 서론을 읽고 있으려니, 팀장이 박 과장에게 다가갑니다.
“박 과장, 최 교수님 연구보고서 받았지? 관련된 분석 보고서 내일 상무님께 보고할 수 있나?”
“제가 지금 금요일 콘퍼런스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천 대리가 대신에 하기로 했습니다. 천 대리. 내일까지 될까?”
“네? 아직 서론 읽고 있는데요.”
“천 대리가 한다고? 그럼 좀 서둘러줘야겠어. 내일 아침에 상무님이 보자고 하셨거든. 간단하게 주요 내용 요약하고, 보완 요청해야 할 내용 정리해서 줘.”
“……”

상대방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건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 하는 순간에 일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분담이 있어도 회색 지대(Grey Area)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남의 일을 하느라 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정작 자기 일은 야근해서 메꾸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면서요.
이런 타입은 부담되더라도 가능한 한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천 대리는 급하게 마감해야 하는 일이 많았을지도 모르지요. 박 과장의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날 야근을 했을 뿐 아니라 정작 밀린 자기 일을 하느라 주말에 출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착한 분들이 곧 한계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상대방이 점점 더 뻔뻔하게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 폭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폭발할 때 상대방이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더 황당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오히려 우리가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몇 번이나 참은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저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물론 알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했다는 사실’ 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굳은 표정을 통해, 또는 ‘일이 많아 보이네요’라는 소심한 항의로, 또는 한숨으로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상대방은 우리의 안색 따위 전혀 눈치채지 못할뿐더러 설사 눈치를 채더라도 저 정도로 소극적인 반응이라면 별문제가 아니라서 밥이나 한 번 사면 충분한 문제라고 생각한답니다.

박 과장의 경우에도 천 대리가 어차피 일도 없는데 업무에 도움 되는 보고서를 공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 업무를 맡아서 내심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가 너무 밀려서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상태인지,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나요?
업무를 하면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물론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 역시 업무가 겹쳐서 몰려올 때 도움을 받을 일이 반드시 오니까요. 그러나 부담스러운 일이라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두운 표정, 싫은 기색, 한숨, 투덜거림 등으로 상대가 눈치채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미안한 기색으로 정중히 거절하면 됩니다. 적어도 그 일이 얼마큼 어려운 일인지는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별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세요. 말한 게 기준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장님, 이 목걸이 얼마예요?”
“손님이 안목이 있으시네. 그거 7만 원이에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세공이 정교하고 보석도 많이 박혀 있는데요? 너무 싸게 파시네요. 제가 15만 원 드릴게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이 7만 원으로 평가했는데, 사는 사람이 15만 원을 주지는 않지요. 설사 속으로는 2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7만 원을 낼 겁니다. 오히려 좀 더 깎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지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 특히 여성들이 아예 말을 안 하거나 낮게 부릅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걸 눈앞에서 놓치곤 합니다. 승진이나 교육 연수, 연봉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요.
예를 들어 한 부서의 승진 대상자 2명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명 모두 자기의 성과가 더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고만고만합니다. 성과의 영역이 다를 뿐이지요. 그런데 한 직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승진에 대한 열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은 조용히 일하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일 년 동안 잘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 있는 승진의 자리를 가져갈까요? 대부분은 열의를 드러낸 직원에게 주게 됩니다. 상사는 조용히 있는 그 직원을 바라보며 ‘승진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혹은 ‘어쩌면 승진하는 걸 부담스러워할지도 몰라.’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서요.
“저도 여러 번 표현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아니,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동기인 최 대리는 벌써 승진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얼마 전에는 제가 입사 몇 년 차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했다고요.”
“음…. 평소 업무 얘기를 해도 조금만 틈을 주면 딴생각하는 주의력 결핍 증후군 상사가 그 얘기의 뉘앙스를 예민하게 알아차렸을까요? 설사 알아차렸어도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표현하세요.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 얘기하세요. 말한다고 반드시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말하지 않으면 영영 모릅니다. 거절당하면 뭐 어때요? 말 안 하면 어차피 안 될 텐데요.
부담스러운 일은 ‘No’라고 얘기해주세요. 한숨, 굳은 표정, 작은 투덜거림이 아니라 정확히 언어로 표현하세요. 거절하는 건 상대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친절히’ 알려주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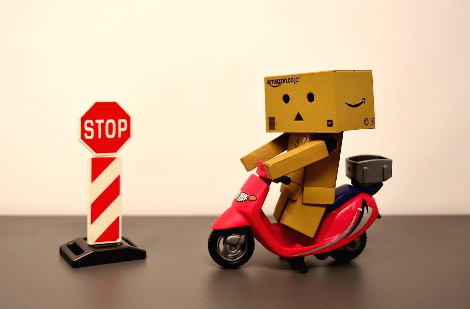
물론 ‘No’라고 얘기해도 꼭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 우리가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상대방을 위해서 ‘감수’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요청이 사소한 부탁인지, 큰 부탁인지 무슨 수로 알겠어요.
어떻게 ‘No’라고 얘기해요?
아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상사에게 ‘No’라고 말합니까?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까 봐 덧붙이자면, ‘No’라고 말하라는 게 정색하며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팀장님, 저는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선배님, 그 일은 선배님 일이니까 해드릴 수 없어요. 저는 못 합니다.”

오호, 위의 문장을 세 번만 사용하면 ‘회사의 관심 사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시게 되겠지요.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정색러가 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팀장님, 제가 팀장님께서 모레까지 완성하라고 하신 마케팅 일정이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와 같이 추진하면 아무래도 펑크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이 경우에는 일을 맡게 되더라도 스케줄과 양의 조절이 있습니다.
선배, 저 이거 해드리면 이틀 야근해야 하는 거 아시죠? 안 그래도 저 지난주도 내내 야근이었는데. 아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라서 안 해드릴 수도 없고. 대신 진짜 맛있는 것 사주셔야 해요. 저 정말 몸도 힘들단 말이에요.
적어도 선배는 나에게 빚진 감정은 확실히 인지하게 됩니다. 한숨, 살짝 굳은 표정보다는 적어도 10배는 효과적이라고 장담합니다.
원문: 박소연의 브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