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평등적 언어가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든다
군대가 남성들의 전유물인 시절이 있었다. 군대는 남성성이 가장 극렬하게 표출되는 조직이었고, ‘약한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강한 남성’의 집단이었다. ‘남자답다’는 표현과 ‘힘’은 동일시되었고 동시에 상찬되었다.
여군(女軍)이 등장함으로써 군 조직 자체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사관학교에 여생도가 입학하게 되고 수석 졸업생도 배출됐다. 부사관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조직의 구성과 성격이 변화하면 인식의 전환도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군대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옛 군 조직이 갖고 있던 관성 때문인지 여성성에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듯하다. 이는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라 할만하다.
수년 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일부 훈련병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조교와 교관들은 “너희들이 그러고도 남자야?”라는 말로 꾸짖곤 했다. 기합을 받을 때 누군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계집애 같다”는 핀잔을 줬다. 우리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수많은 여(女)부사관 후보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계집애’ 운운하는 것은 분명 부박한 언행이었다.
‘계집애’라는 속된 말로 표상되는 여성성은 분명 이들(‘계집애’ 운운하는 일부 남자 군인)에게 남성성의 대척점에 위치한 모종의 열등한 속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했다. ‘계집애’나 ‘여자’라는 주어 뒤에 긍정적 술어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훈련병을 질타할 때 여성을 뜻하는 이런 못된 어휘들이 빈번히 동원되곤 했다.
‘계집애’와 같은 멸칭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언어적 둔감함을 차치하더라도,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상관인 여성 장교 앞에서도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실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기지 구보를 할 때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와 같은 뜨거운 말을 외치며 달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군대 내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일련의 저열한 언동은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고결한 외침까지 실천적으로 배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군가(軍歌) 역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다. 가사를 보노라면, 남자만을 국방의 주역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 터져라 수없이 불렀던 노래인 〈멋진 사나이〉. 그냥 〈멋진 군인〉이면 안 되는가? ‘사나이’만 군인으로 인정되었던 수십 년 전 상황에서 왜 이리 전진하지 못하는가.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지적했던 ‘아비투스(habitus)’, 즉 습속(習俗)에서 가장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은 아마도 군대일 것이다.
또 군가 가사 중에는 유독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다. 귀하디귀한 ‘딸’들도 요즘 얼마나 많이 국방의 임무에 매진하는가. 군가도 달라진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남자’, ‘사나이’, ‘아들’만을 군대의 구성원으로 인식했던 구시대적 습속을 하루빨리 떨쳐내야 마땅하다.
군인으로서 용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나 나약한 태도를 드러냈을 때 상관에게 훈계를 듣는 것은 당연지사다. 한데 “너희들이 그러고도 남자야?”라고 쏘아붙이는 건 현재 상황에서 분명 틀린 어법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설파한 바 있는 ‘문법적 착각’에 다름 아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군인이야?”라고 말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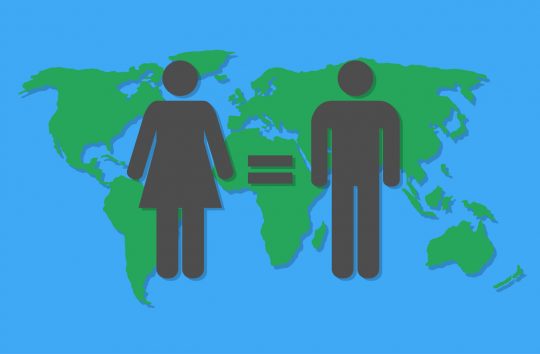
특정 성(性)만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강조하게 되면 하나의 성만 주체가 되고, 또 다른 성은 객체로 전락해버린다. 국방의 의무는 양성(兩性)이 힘을 모아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평소의 언행은 물론이고 군가의 가사, 각종 공문서에서도 가치 중립적이고 양성 평등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혹여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반문하는 이가 있다면, 좀 더 신중하고 섬세하게 언어를 구사하자고 다시 역설하겠다. ‘남자다움’이 아닌 ‘군인다움’이 강조될 때 훨씬 더 강하고 튼튼한 군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직도 군내에서 ‘계집애’ 운운하는 몽매한 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묻고 싶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군인이야?
원문: 석혜탁 칼럼니스트의 브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