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뭔가 새로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항상 주의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구현’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용 컴퓨터(PC)라는 기계는 1975년에 처음 등장한 ‘개념(A)’에 해당한다. 그 전까지, 컴퓨터라는 기계는 정부나 대학 같은 단체에서나 가질 수 있는 것이었고, 개인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질 수 있는 컴퓨터는 없었다.
하지만 이 ‘개념’ 에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구현’ 들이 있을 수 있다. 1975년 나온 알테어 8800도 PC(a)고, 1981년 나온 IBM 5150도 PC(a’)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랩탑도 PC(a”)다. A = { a, a’, a” … } 인 것이다. 당연히 이 구현들 또한 서로 다르다. 최초의 PC인 알테어 8800(a)과 IBM 호환 기종의 시조가 된 IBM 5150(a’)은 흡사 침팬지와 호모 하빌리스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IBM 5150(a’)과 내 랩탑(a”)도 마찬가지. 두 기계 사이에는 30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같은 IBM 호환 기종이긴 하지만, 둘은 호모 하빌리스와 현생 인류만큼이나 다르다.
2.
간단해 보이지만, 기존에 보지 못하던 무언가가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75년까지만 해도 PC라는 개념을 구현한 기계는 알테어 8800 하나밖에 없었다. A = { a } 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헷갈리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보자: PC라는 기계는 과연 가정과 사무실의 모습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인가? PC의 의미를 A로 해석한다면, 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맞는 말이 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말이다. 하지만 PC라는 단어를 a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건 틀린 말이 된다.
알테어 8800은 ‘최초의 PC’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조잡하고 짜증나는 기계였기 때문이다. 이 물건은 혁명의 서막이라기보다, 덕후 잡지를 받아보던 컴퓨터 덕후들이 부품을 사다 하나하나 조립해서 돌려야 하는 잉여력의 극한에 불과했다.
운영체제 같은 ‘당연한’ 것도 없고, 간단한 사칙연산 하나 하는 데도 기계어를 일일이 때려넣어서 동작시켜야 하는 한심한 잡동사니가 이 기계의 정체였다.

오늘날의 우리가 보기엔, 대체 누가 a와 A를 헷갈릴까 싶다. 웬만해선 PC라는 단어에서 a를 떠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1975년의 시점에서 이 멍청한 물건은 유일한 PC였고 곧 PC의 동의어였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PC인 알테어 8800와 IBM 최초의 PC인 IBM 5150까지 6년이나 되는 시차가 존재하는 건 놀랄 일이 못 된다.
“PC라는 것은 비즈니스 가치가 없는 조잡하고 한심한 물건이다. 이런 물건에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있나?” 결국 IBM이 PC 산업에 뛰어들게 되는 것은 Apple 2의 대성공(1977)으로 사업적 가치가 증명된 이후의 일이 된다. 이렇게 새로운 ‘개념’ 과 그 ‘구현’을 구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3.
‘개념’ 과 ‘구현’ 을 구분하지 못할 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흔한 실수는, 새로운 ‘구현’ 의 한계와 새로운 ‘개념’ 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가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한계에만 집착하면 시대의 흐름을 못 보게 되고, 가능성만 보게 되면 현실감각 없이 날뛰는 힙스터가 된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현재 지상전의 왕자로 통하는 전차(B)는 처음 등장했을 때 트랙터에 보일러 철판을 붙여 놓은 한심한 물건(b)이었다. 이 기계는 원래 서부전선의 끔찍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정작 목표를 실현시킨 것은 전차가 아니라 전쟁 당사자인 독일 제국의 경제 붕괴였다. 도저히 못 써먹을 물건이었다는 점에서 알테어 8800(a)하고 동급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차(B)는 강력한 화력, 빠른 돌파력, 든든한 방어력 등 기존의 무기체계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장점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고, 수십 년에 걸친 개선과 발전(b’, b”, b”’, …)은 마침내 이 ‘가능성’ 을 현실로 만들었다. 모든 새로운 발명과 기술적 혁신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꿔 나간다.
PC도 마찬가지였다. 알테어 8800가 처음 나왔을 때 이 한심한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직 언어를 개발한 작은 벤처 기업이 있었다. 많아야 수천 명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불과했지만, PC의 새로운 구현들이 연달아 쏟아지고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벤처기업의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후 이 기업은 IBM 호환 기종의 운영 체제(MS-DOS)를 만들고, 오피스를 만들고, 윈도우를 만들면서 모두가 아는 전설의 주인공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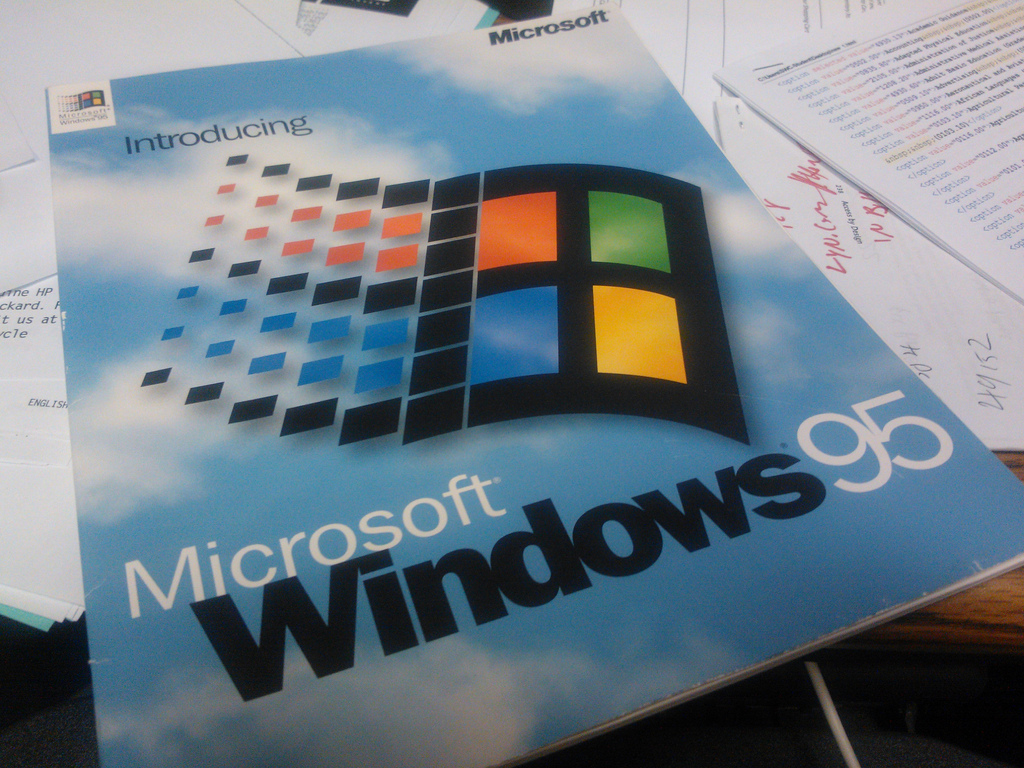
4.
- 거래소 기술 결함으로 비트코인 가격 급락 (월스트리트 저널, 2014.02.11)
- 출금 중단한 비트코인 거래소, 파산인가 해킹인가? (월스트리트 저널, 2014.02.18)
- 다시 한번 ‘마운트곡스’ 논란에 불 지핀 블로거 (월스트리트 저널, 2014.02.28)
연일 비트코인이 화제에 오르내리면서 주변 지인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그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중국에서는 종이를 화폐로 쓴다는 마르코 폴로의 말을 들은 당대인들은 대체 어떻게 종이가 금화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들 하죠. 종이도 교환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전자(bit)라고 못 쓰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비트코인 에반젤리스트라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나는 비트코인 계좌도 없고, 앞으로 만들 생각도 없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고? 전혀. 나는 틀림없이 전자 형태의 화폐(C, 혹은 결제 도구)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c)이라는 ‘구현’ 으로 스타트를 끊은 바로 그 ‘개념’말이다.(신용카드 온라인 거래도 있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스타트를 끊었다.’ 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결정적인 차이점은 중앙 집중된 서버 없이 동작한다는 비트코인(그리고 암호 화폐)의 특징에 있다.)
사실, 굳이 ‘비트코인’ 에 대해 물어봤는데 ‘전자화폐’의 가능성에 대해 대답하는 건 내가 이 ‘개념’ 의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탓도 있지만, 현재 존재하는 ‘구현’의 수준이 알테어 8800 못지않게 심히 골때리는 물건이라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탓이 더 크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전자 화폐나 지폐(D)나 교환의 도구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부른 것으로 악명 높은 프랑스 혁명기의 불태환지폐 ‘아시냐‘ 나, 19세기 미국의 오만 잡다한 은행권 같은 물건들(d) 말이다.
나는 지폐(D)가 대단히 편리한 물건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지만, 저 시기로 돌아가라면 아마 지폐(d)는 가능하면 안 쓸 것 같다. 비트코인(c)도 마찬가지다.
5.
정리하자. 나는 틀림없이 전자화폐의 가능성을 믿는다. 구리 덩어리나 금화보다 지폐가 편리하듯이, 지폐보다는 순전히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화폐가 더 편리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폐는 다른 기술 제품들에 비해 훨씬 더 안정성이 중요하고,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우리는 자주 까먹지만, 인간의 화폐 제도가 금에서 한 발자국이나마 빠져나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온갖 문제점들이 속출하는 중이다. 1971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 달러화는 “달러당 1/35 온스의 금으로 바꿔 주는 교환증” 비슷한 물건이었다는 걸 상기했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전자 화폐가 일반화되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요컨대, 전자화폐의 ‘개념’은 믿지만 현재의 ‘구현’은 안 믿는다는 얘기다.
wandtatoosThe Mardi Gras Of Floo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