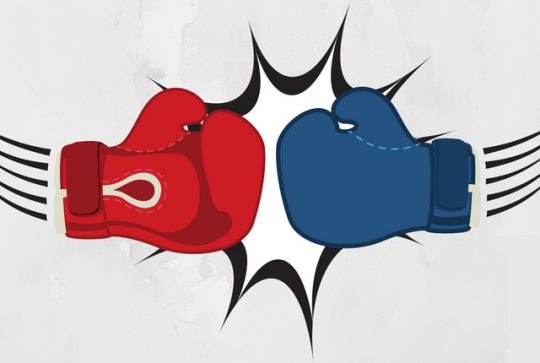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싸워야 할 것이 있다고 믿는다. 주로 그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상대 집단인 경우가 많다. 그런 종류의 투쟁은 분명 사회에 필요한 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 맞서 싸워야만 한다고 느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어느 집단에 속한 누군가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편견이 아닌가 한다.
물론 편견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없을 수 없는 우리의 일부다. 편견 없이 세상 모든 상황을 그때마다, 모든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모든 사물을 매번 새롭게 받아들인다면 아마 우리 뇌는 과부하에 걸리거나 우리는 그 파편적인 인상의 바다에 빠져 미쳐버릴 것이다.
편견은 어느 정도 우리 삶을 정돈해주고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매번 정해진 틀에 따라 인식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감각의 부담을 줄여준다. 편견은 확실히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효율적이고 편안한 생존을 위해 고안된 편견은 동시에 언제나 무언가에 대한 폭력을 품었다.
손쉽게 어떤 사람들을 분류하고 어떤 상황과 사건의 의미를 미리 정해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타인이나 상황, 혹은 사물의 구체적인 세부, 차이를 배제하는 폭력 위에 자리 잡는다. 타인이나 외부 사물 등 ‘타자’에 대한 폭력일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일 때가 더 잦다. 나에 대한, 나의 경험과 감각에 대한, 나의 영혼과 삶에 대한 폭력을 스스로 용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본디 더 부드럽고 열린 존재로 태어났다. 우리에게 도래한 사건을 손쉽게 이해하고 ‘별 것 아닌’ 것으로, ‘뻔한’ 것으로 치부하여 정리해버리기 전에,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들이마시며, 그 사건과 융화되고, 매번 새로운 존재로 조금씩 뒤틀려 나아가는 상태로 탄생했다. 자기 앞의 존재를 흉내 내고, 그들을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되어가면서,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편견은 우리를 박제한다. 우리가 타인의 세부에 귀 기울일 기회를 박탈하고 내 삶이 조심스레 내게 요구하는 다양한 감각을 제거한다. 우리 삶을 바꿀 온갖 기회를 미리 차단하며 나를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고정관념 속에 가둬두고자 한다. 그렇기에 살아 있다는 것은 박제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자 편견과의 싸움이고, 자신을 사로잡는 관념에 저항하며 계속 새로운 상황과 타자의 세부를 이해해가는 것이다. 편견의 노예는 어떤 의미에서 죽은 존재와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평생 편견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편견은 다른 하나의 관념에 의해 전복된다. 그러나 그 새로운 관념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우리를 옥죄는 또 하나의 편견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편견과 싸우는 일을 평생 반복해야 한다. 관념 혹은 편견을 만들지 않을 도리도 없고, 그렇다고 그에 완전히 복종할 수도 없다.
계속 만들고 부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고, 이내 바람에 흩어 사라져버리지만, 다시 그림을 그리는 샌드 페인팅처럼 말이다. 또한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처럼 말이다. 삶이란 그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다르지 않다.

그 에너지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을 때, 틀어막혀 박제되기 시작할 때, 터져 나오지 못한 채 고여 썩어갈 때 삶은 끝난다. 그는 살아 있더라도 더 이상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에 편견에 저항하는 일은 곧 살아 있는 일과 다르지 않다. 나는 살아있기 위해 오늘도 내 안의 편견과 싸우고자 한다.
원문: 정지우 문화평론가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