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은 사람이 많겠다. 이 말은 옛 어머니… 도 아니고 할머니 세대의 시집살이 애환을 상징하는 말이다. 시집살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어서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말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 시대착오적이지만 실제로 이런 교육을 받고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내신 많은 어머니와 할머니가 존재한다. 고로 안쓰러움과 존경을 표한다.

이 말은 어쩐지 직장생활에도 여전히 어울린다. 갓 입사한 그때를 돌아보면 그렇다.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잘 (알아) 듣지도 못하고, 보는 시야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일부러 그런 것보다는 경험의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시집살이를 직접 해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힘들고 억울한 일이라는 선상에서 보면 나(우리)는 분명 그것에 준하는 고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은 흘러 요즘이 되었다. 요즘엔 그렇게 억울한 시간이 길진 않다. 바로 요즘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할 말은 하고 비합리적인 것은 바꾸려고 노력하는. 물론 나도 내 선배들에겐 요즘 친구였을 것이다. 지금의 요즘 친구들은 앞으로 맞이할 또 다른 요즘 친구들을 보며 그 차이를 한탄하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반복됐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 어찌 되었건 직장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이고, 그 안에서 일을 잘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직장살이’를 해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건 바로 귀는 열고, 입은 닫고, 마음은 반만 열라는 것.
1. 귀는 열고

듣는 것은 실력이다. ‘경청’으로도 잘 알려진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회자되는 덕목.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일컫는 이 말은 직장 생활에 있어 필수 요소다. 이 경청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경우.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도 잘 숙지해야 한다. 잘 숙지하기 위해 잘 들어야 한다는 표현이 맞겠다. 잘 듣는 척은 하는데,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못하면 진실성에 의심받을 수 있다. 잘 들어주는 태도, 그리고 들은 이야기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 중의 기본이다.
둘째, 상사나 동료 또는 후배가 내뱉는 말.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상사가 전화를 하고 있다. 나는 책상에서 내 일을 보고 있다. 그래도 귀는 열어 놓아야 한다. 상사가 누구와 이야기하며 회의 시간을 잡는다. 상사의 전화가 끝난 후, 바로 상사에게 다가가 “오후 3시에 B 회의실 잡아 놓을까요?”라고 말해보자. 상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을 새로운 눈으로 볼 것이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먼저 챙겨주는 든든한 팀원으로.
더불어 동료나 후배 등이 혼자 내뱉는 말에 귀 기울여 보자. 갑자기 옆 동료가 “아이씨” 읊조리면 “왜 그래? 무슨 일이야?”라고 반응한다. 그러면 그 동료는 “아니, 갑자기 PC가 꺼져서 이메일 써 놓은 게 날아갔어.”라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대놓고 말은 안 하겠지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은연중 자신에게 관심 가져 준다는 고마운 마음이 생길 확률도 높다. 혼잣말을 내뱉었는데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머쓱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셋째, 정보는 힘이다.
정보는 권력이다. 한 조각 한 조각 정보를 주워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누가 어디로 배치받고, 상사가 어디로 이동하며, 이번 회의에서 크게 깨진 이슈는 무엇이다… 등 어떤 정보라도 귀를 쫑긋 세워야 한다. 경험이 쌓이면 그런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어 붙여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꼬치꼬치 캐물을 필욘 없다. 그랬다간 호사가로 소문날 수도 있다. 그저 조금만 귀를 더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2. 입은 닫고

사람의 입은 하나고 귀가 둘인 것은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만큼 말하는 것을 줄이라는 말이다. 직장엔 호사가들이 참 많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정보의 출처로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려 경쟁자를 해하기도 한다.
특히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동조를 구하며 자신의 편에 서라는 암묵적 강요를 하곤 한다. 참 애매한 순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맞장구를 안 치자니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갈 것 같다. 그럴 땐, 차라리 웃으며 애매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 괜히 맞장구를 치거나, 편들겠다고 더 입을 열어서 좋을 게 없다.
호사가는 호사가일 것 같은 사람을 경계한다. ‘내 앞에서 저렇게 맞장구쳐주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또 내 이야기 하겠지’라며. 입을 열어야 하는 순간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논리와 근거로 이야기할 때다. 무조건 벙어리처럼 3년 있으란 말이 아니다.
3. 마음은 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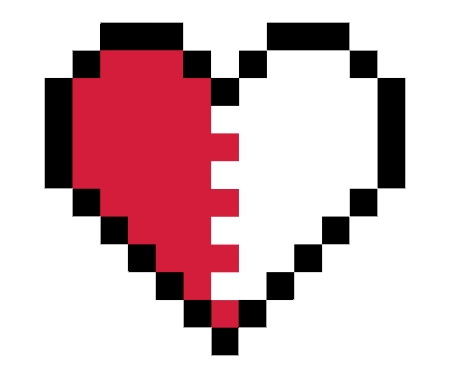
회사 체질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곳,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회사다. 이런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하나의 즐거움이다. 원수 같은 사람 만나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맘 맞는 사람들끼리 일하는 건 힘든 직장생활에서의 활력소다. 그래서 「직장 인연」이란 글도 남긴 적이 있다.
때론 형, 누나,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친한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부르면 왠지 안 풀릴 것 같은 일도 풀릴 것 같다. 하지만 회사는 엄연히 프로페셔널의 세계다. 일하기 위해 만난 곳이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 조직문화를 유연하고 즐겁게 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일이 돌아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그래서 직장에서 서로의 마음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딱 중간 정도가 좋다. 그렇게 마음은 반만 열어야 한다. 물론,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더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회사 내에서, 그리고 업무 중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퇴근 후엔 마음을 다 열더라도, 회사 내에선 반만 열어도 된다. 그게 좋다. 서로를 위해.
시집살이와 직장살이
눈칫밥을 먹는다는 점에서 시집살이와 직장생활은 공통점이 있다. 억울하고 서러운 순간이 많다는 것도 함께. 시집살이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말로 안 듣고, 말하지 않고, 보지 않아야 살 수 있을지도. 요즘엔 그렇게 살 사람 없겠지만.
직장 생활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귀는 열고, 입은 닫고, 마음은 반만 열면 말이다. 하루하루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많은 걸 깨닫는다. 더불어 예전에 미리 그러하지 못했던 나를 보며 미소 짓기도 한다. 그 미소는 여유에서 비롯된다. 아마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일 테다.
지금 잠깐, 1년 전 또는 좀 더 이전의 나를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 지금 얼마나 자랐나. 귀는 열고 입은 닫고 마음은 반만 열되, 자기반성과 성찰엔 특별한 제한을 두진 않으면서!
원문: 스테르담의 브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