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되면서 느낀 불행
이제 막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디딘 그때를 돌아보면 암울 그 자체였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담당 시장, 직무, 사람 그리고 조직문화까지. 선배들의 허드렛일을 챙기고 술 취한 선배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였던 기억. 그런 것이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였다. 무엇보다 이제 막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며 느꼈던 괴리감. 점심시간이면 흰색 와이셔츠에 목 끝까지 올린 넥타이 부대가 김치찌개를 먹으러 나갈 때, 그 속에 섞여 있던 나를 발견하며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다.
다달이 쥐어지는 월급이라는 ‘생존 마약’에 의지하는 모습과 이미 누군가 굴리는 쳇바퀴에 같이 올라탔다는 압박감과 자괴감은 거액의 빚을 독촉하러 온 채무자 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다. 하루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이 끔찍한 루프에 영원히 갇힐 것만 같았다. 같은 고민을 하던 동기 중 누군가는 퇴사하거나 이직했다. 결국 잠시 쉬었다 다른 쳇바퀴에 올라타는 걸 반복할 거면서. 죽을 걸 알면서도 불 속으로 날아드는 불나방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니 그때 나는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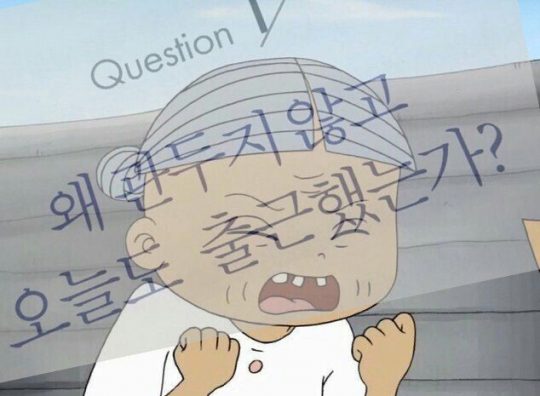
직장인이 되어 느끼는 행복
십수 년이 흐른 지금은 (직장인으로서, 직장인이어도, 나 자체로) 행복하다. 매일이 그렇다면 거짓말이지만, 하나하나 깨닫고 의미를 찾아가니 그렇다. 직장엔 ‘배움’이 도처에 널려있다.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또는 ‘저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지’란 것도 모두 배움이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글도 쓰고,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글 기고도 한다. 많은 사람이 내게 묻는다.
아니, 직장 다니면서 바쁠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세요?
내가 하는 대답은 두 가지.
- “월급을 받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즉 먹고사니즘이 해결되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게 된다.
-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제 본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나를 더 성장시킨다. 해외 영업/ 마케팅에 대한 강의, 주재원으로 일하며 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책. 취업 준비생과 주니어 현직자를 위한 코칭. 직장인과 심리학을 접목한 책 출간 준비 등. 모두가 연결된 것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성장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내 돈으로는, 내 상황에서는 하지 못했을 것들을 접하고 경험한다. 그러니 매일이 새롭다. 직장이 있는 덕분에 사랑스러운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직장에선 투덜댈지 모르지만 결국 나는 회사에 일정의 기여를 하고 회사는 그 기여도에 ‘미치’거나 ‘못 미치’는 보상을 해준다. 그것을 알뜰살뜰 운용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든 먹고살 수는 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 일하며 배우는 많은 것들. 사람들을 만나며 겪는 모든 에피소드가 나에겐 글의 소재가 되는 상황. 회사에 기여하고, 나도 회사를 활용해 얻어내는 성장의 기회들.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글을 쓰고, 책을 내고 강연을 하는 시간들. 언젠가 회사를 벗어나 스스로 먹고살아야 할 때 요긴한 회사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도 하나하나 소중하다.
출근 시간 통근버스에 콩나물시루처럼 실려 가고, 퇴근 시간 전철에서 우르르 이동하는 나를 보며 어떤 사람들은 직장인이라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내 얼굴에 만연하게 번진 미소는 보지 못한 채. 어찌 되었건,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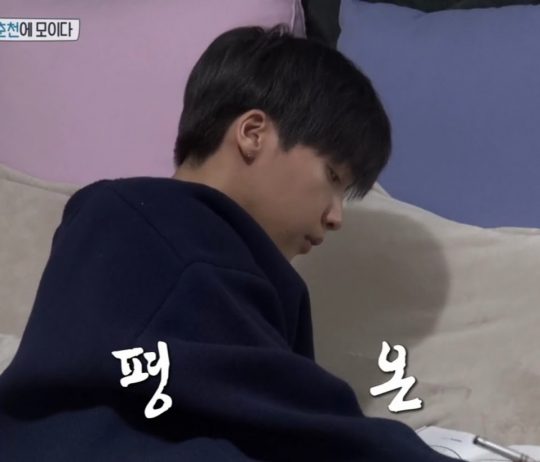
왜 우리는 직장인이 불행하다 규정할까?
“보람은 되었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처럼 직장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과 책이 거침없이 유행한 적이 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직장인에겐 작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뿐이다. 잠시 통쾌할 뿐 직장인으로서의 고민은 계속된다. 찌든 직장 생활을 잠시 뒤로 하고, 여행을 다녀와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직장인은 불행의 아이콘이다. 특히 한국에선 더 그렇다. 쥐꼬리만 한 월급에 의지해 자존심은 출근할 때 냉장실에, 간과 쓸개는 냉동실에 넣고 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그렇다. 직장 생활은 ‘생존’이 목적이고, ‘생존’을 위해선 못 할 짓이 없다. 원하지 않는 일도 수두룩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 ‘행복’을 느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분 나쁜 것’과 ‘불행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직장인은 불행하다’란 명제를 무의식 속에서부터 간직해 조금만 기분 나빠도 ‘직장인이니까 불행하다’란 대답을 자동적으로 내놓는다. 반대로 우리가 직장에서 항상 인정받고, 기분이 좋다면 어떨까?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 ‘행복’을 보증하진 않는다.
‘새장에 갇힌 새’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 등 직장인 하면 떠오르는 이러한 이미지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새장’이나 ‘쳇바퀴’는 없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이미지나 말 자체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지 모른다. 직장생활이 싫어서 때려치우고 내 사업이나 해보자 하는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못 봤다. 잘 된 사람들은 회사 업무도 스마트하게 잘 처리하고 회사에서 배울 거 쏙 빼먹고 계획을 잘 세워 준비하고 퇴사한 사람들이다.
어차피 내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해야 한다. 즉 다른 ‘직장인’을 데리고 일하는 것이다. 나는 ‘새장’에 갇혀 있다고 불행해 하면서, 내 사업을 시작할 때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직원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새장’을 만들어 줄 것인지? 애초부터 ‘새장’이라 규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폄하하지 말고 내 행복을 찾자
고민이 많았던 대리 시절, 내 가까운 비전인 팀장이나 담당을 봤을 때 그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너무나도 오만한 생각이란 걸 깨닫는다. 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느꼈을지 모르는 보람과 성취감, 또는 하나하나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진정한 느낌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내가 뭐라고, 그들의 행복을 폄하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하지 못할 거면 불행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특히나 더 그렇다. ‘행복’에 대한 가치를 아직 잘 모르는데, ‘불행한 것’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더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남보다’ 덜 불행하면 다행이라 여기는 것에 익숙하다.
내가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기여할 건 기여하고 배울 건 배우는 자세.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가 다른 생활 속에서 찾아내는 ‘의미’는 나의 행복감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직장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보인다.
그러면 주변도 다시 둘러보게 된다. ‘직장인’으로서 이제 막 입사해 CEO를 꿈꾸는 초심 충만한 사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설레하는 대리, 과도한 업무에 지쳤다고는 말하지만 그 안에서 성취감을 맛보는 과장과 차장, 임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장. 그리고 명예와 부를 거머쥐고 여유 있게 큰 그림을 보는 임원 등.
직장인이라도 행복한 사람은 많다. 다만 우리는 그들을 보거나 인정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뿐. 매일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람’과 ‘직장인’의 운명이지만, 그것을 찰나라도 느꼈을 때 극대화해 오롯이 즐길 줄 아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끝’이 아닌 ‘과정’이라 생각하면 한결 마음도 가벼워진다. 직장인으로서 행복은, 결국 나 자신의 행복인 것이다.

원문: 스테르담의 브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