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정보 활용이 적은 기업의 두 가지 경우
- 워낙 회사 자체가 작아 대표 등 몇몇 개인의 네트워크로 업계 소식을 모으는 경우
- 철학이 시장 동향보다는 내부 기술/품질에 극도의 비중을 두는 경우
대부분 두 경우 모두 전략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개인의 정보는 깊이 있는 시장의 단면을 읽을 수는 있으나 편향된 프레임에 갇힐 확률이 높고, 회사 철학이 내부 기술이나 품질에만 몰두하는 경우에는 동떨어진 제품/서비스로 새로운 침투자에게 시장 우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두 유형의 기업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어디서 뭘 어떻게 보고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모른다는 게 더 클 것입니다. 아예 조직 외부를 향한 안테나가 없고 그럴 역량이 향후에도 없는 상태, 그것이 시장 속에서 지금은 아이디어로 버틸 수 있지만 곧 다음이 없는 모습, 그리고 몇몇의 직관. 그게 대부분의 내부 지향적 기업의 일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실무진은 외부 정보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당장 연구개발을 할 때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자 할 때 근거로 삼을 자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타사의 친구는 유료 서비스를 통해 리서치 리포트를 부족하지 않게 받아보는 데 반해 우리 회사는 본인 스스로도 회의 석상에서도 서로의 경험과 직관만 우기기 바쁘기 때문이죠.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걸 알기에 작은 외부 정보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물론 스스로 그것이 체화될 정도로 외부 정보를 알아보지는 않죠. 그 사수도 그 위의 관리자도 그렇게 일하진 않았으니 시간이 없을 때는 굳이 그 일을 실무자도 하지 않죠.
그러므로 원래 그 정보를 찾아 일하는 것에 써먹어야 할 직원은 정보를 획득할 능력과 습관은 없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료를 구글링이나 업계자나 지인의 말을 근거로, 혹은 조직 내부에서 간헐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서 그 해석을 자의적으로 합니다. 없는 정보만큼 무서운 편향된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리서치 자료에서 ‘나’를 빼놓고 활용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폐단은 리서치 부서의 권력 유지에 힘을 실어 준 결과이기도 하고, 이전에 다룬 조직을 망치는 경영 뇌피셜론자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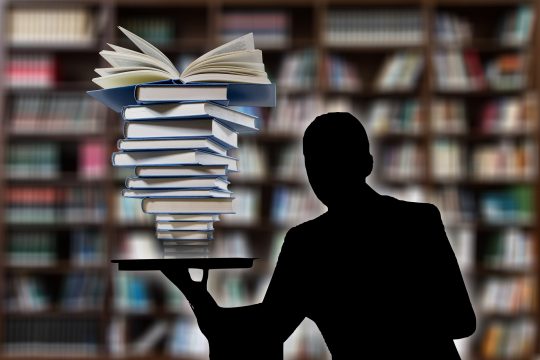
시장의 방향이나 트렌드의 단기적 흐름에 대해 어디서 자료를 얻었다고 해 봅시다. 유로모니터든 갤럽이든 닐슨이든 컨설팅 펌에서 영업하려고 내놓는 정기 보고서든 구글링이든, 아니면 사내 시장 모니터링을 가끔 하는 기획자이든 이 자료는 분명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조직이 잠수함이면 사실상 유일한 잠망경이니까요. 잠수함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잠망경이 정확한 항로를 알게 해 주는 것도 못지않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 상황을 안다고 우리가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는 것도,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모를 때 생기는 비극
예를 들어봅시다.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속옷 브랜드를 국내에 론칭했다고 생각해보죠. 라이선스 조건이 바잉(buying) 할 수 있는 상품의 디자인이나 품목이 느슨한 상태라면 처음에 국내에 들여온 경영진은 해외에서 반응이 좋았던 해당 라이선스의 주력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영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큰 맘먹고 높은 비용으로 주요 쇼핑몰 몇 군데 계약을 따내고 쇼핑몰에 임대 수익 보조까지 해가면서 고객을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죠. 하지만 이렇게 해도 매출 증가 폭이 작다면요? 분명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도, 너무 흔한데 특징이 없는 것일 수도,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일 수도 있죠. 그럼 거기서 뭔가 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게 올바른 경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비싼 돈을 정기적으로 들여서 받아보는 업계 정보에 따르면 속옷 시장의 새로운 흐름이 라운지웨어로의 확산이나 새로운 고기능 상품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영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경영 뇌피셜론자들이나 외부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데 하나 잡히면 그게 자신의 이론인 듯 말하는 사람을 통해 필터 없이 이 정보가 사업의 전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황한 페이지에 도식화가 깔끔한 자료 자체를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시장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나’ 필터가 없는 리서치 활용이 낳는 결과는 오히려 ‘무전략’을 낳게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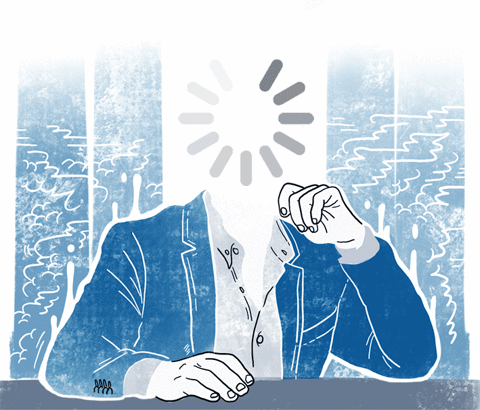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략의 뜻과 배치됩니다. 현대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인 ‘역량’이라는 관점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고전적인 포지셔닝이 아니더라도 이 회사가 하려는 것이 할 수 있는지, 또 고객을 설득할 필요 없이 새로운 방향의 상품이 고객에게 먹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예시의 속옷 기업은 라운지웨어를 대대적으로 매장에 들여놓고 라운지웨어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기능에 투자하는 브랜드가 내놓은 고기능 제품의 비슷한 버전의 기능을 넣은 제품도 늦은 타이밍에 매장에 들일 것이고요. 하지만 기존 고객이 이 기업의 특징 없는 디자인과 노후화된 라이선스에 구매 흥미를 잃어버렸다는 정확한 ‘나’에 대한 진단이 결여된 것은 이 기업은 모를 것입니다. 고객과 경쟁사는 알 텐데 말이죠.
리서치 내용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당장 업계의 선두같이 모든 것을 다할 필요도, 당장 업계 선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대대적인 자본을 투하하는 대기업도 시장의 빈틈, 보통은 첨단을 통해 그 틈을 비집고 파이를 키웁니다. 이전에 국가 전체가 토목 하던 시절처럼 인프라 깔고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절대 수요가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비극의 뿌리는 외부 정보 활용에 대한 경험 부족과 활용을 실제 하는 것, 활용을 통한 결과에 대한 경영 진단이 바르게 이뤄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시도한 것에 대해 사후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걸 활용하는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결과만을 피드백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라운지웨어 말고 다른 거 해야 생존을 할 테니까요. 하지만 다음에도 리서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누군가가 숟가락 얹고 사라지는 관행을 뿌리 뽑는 게 경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방법입니다.
대부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죠. 리서치를 의뢰하거나 직접 리서치하는 부서가 이것에 대한 평가와 사후 활용 방안까지 모두 결정할 테니까요. 기업이 작으면 경영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공정한 기획부서가 경영진단을 이런 부분까지 해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원문: Peter의 브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