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late의 「Neural Nostalgia: Why do we love the music we heard as teenagers?」를 번역한 글입니다.
20대를 보내면서 저는 흥미로운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10대 때 좋아했던 음악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노래는 무의미한 소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루다크리스의 “Rollout”이 케이티 페리의 “Roar”보다 예술적으로 우월한 노래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잘 알아도, 제 귀에는 전자가 훨씬 아름답게 들리니까요.
2013년의 히트곡 열 곡을 연달아 들으면 머리가 아픈데, 2003년의 히트곡 열 곡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른이 되어서 들은 그 어떤 명곡보다 10대 시절 좋아했던 노래들이 더 좋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상이 음악 평론가로서 저의 자질 부족 때문만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최근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10대 때 들은 노래는 성인이 되어 들은 그 어떤 노래보다도 강렬하게 뇌리에 박히고,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즉, 이른바 “음악적 향수”는 문화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신경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 아무리 세련된 취향을 갖게 되더라도 우리가 사춘기 때 집착했던 노래들은 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에 애착을 갖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뇌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노래를 들으면, 노래는 청각 피질(auditory cortex)을 자극하고 우리는 리듬과 멜로디, 하모니를 하나의 긴밀하게 연결된 덩어리로 변환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노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해당 노래와 맺는 상호관계에 달려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면 전운동 피질(premotor cortex)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는 동작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부위죠. 머릿속에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 신경세포가 음악의 비트와 싱크를 맞추게 됩니다. 가사나 악기 구성에 주의를 기울이면 다양한 자극에 대한 관심을 조정하고 유지하는 두정엽 피질(parietal cortex)이 활성화됩니다. 사적인 기억을 자극하는 노래를 들으면 사적인 삶과 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감정 없는 기억은 무의미하죠. 사랑과 마약을 빼면, 음악만큼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뇌의 쾌락 회로를 자극하고,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화학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면 할수록, 신경화학 물질 세례를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음악은 모든 사람의 신경계에서 같은 반응을 끌어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반응은 강렬하죠. 작은 불꽃이 튀는 정도가 아니라 불꽃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12세에서 22세 사이, 인간의 뇌는 급속한 신경 발달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듣는 음악은 영원히 머릿속에 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뇌가 특정 노래와 신경으로 연결되면 이는 고양된 감정과의 강력한 기억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춘기의 성장 호르몬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합니다. 성장호르몬은 우리 뇌에 “모든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10대 시절의 꿈과 창피한 순간들의 배경음악이 된 노래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신경계통의 작용만으로도 특정 노래들이 강렬하게 뇌리에 남는 현상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학교 댄스파티에서 들었던 음악이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음악과 뇌: 집착의 과학(This Is Your Brain on Music: The Science of a Human Obsession)』의 저자 대니얼 레비틴은 우리가 10대 때 듣던 음악이 우리의 사회적인 삶과 얽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내가 음악을 골라서 듣게 되는 시기죠. 친구를 통해서 노래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너와 내가 같은 집단에 속해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친구가 듣는 노래를 듣기도 하죠. 그런 경험 때문에 특정 노래가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UC데이비스의 심리학자 피터 자네타도 이 같은 사회성 이론에 동의합니다. 10대 시절 듣던 노래는 인격이 형성되던 시기에 특히나 감정적이었던 기억들과 단단히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네타는 더불어 “회고 절정(reminiscence bump)”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청소년기의 기억이 그 어느 시절의 기억보다 강렬한 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형성된 “인생 각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각본 속에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기억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기억이죠. 그 시절의 기억은 왜 그리도 생생하고 또 오래 지속되는 것일까요?
리즈대학교 연구진이 2008년에 제시한 이론은 이렇습니다. “회고 절정” 시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아”의 등장 시기와 겹친다는 것입니다. 즉 12-22세 시기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절의 기억이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의 기억은 자아 형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자아 그 자체,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음악은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째, 그때 들었던 노래는 기억 그 자체가 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 노래를 처음 들었던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둘째, 그때 노래들은 당시에 우리가 느꼈던 모든 것의 배경음악입니다. 첫 키스, 첫 졸업파티,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피워봤던 순간의 배경음악이죠. 돌이켜보면 졸업파티라는 게 그다지 대단한 경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배경음악과 엮인 감정은 옅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아무리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10대 때 들은 음악만큼 강렬한 음악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는 좀 슬프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취향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성숙한 미적 감각과 지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취향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나이를 먹고 성숙해져도, 음악은 일종의 도피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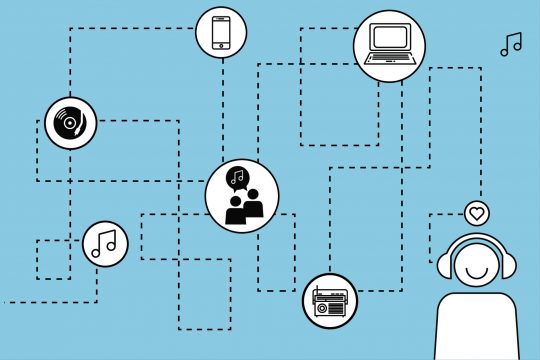
우리가 끊임없이 청소년 시절 좋아했던 음악으로 돌아가는 건 단순한 향수병이 아닙니다. 나를 나 자신으로 만든 음악이 주는 기쁨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는 웜홀이 뇌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사랑했던 노래를 들으면 그때 그 노래가 주었던 기쁨을 잠시나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원문: 뉴스페퍼민트
